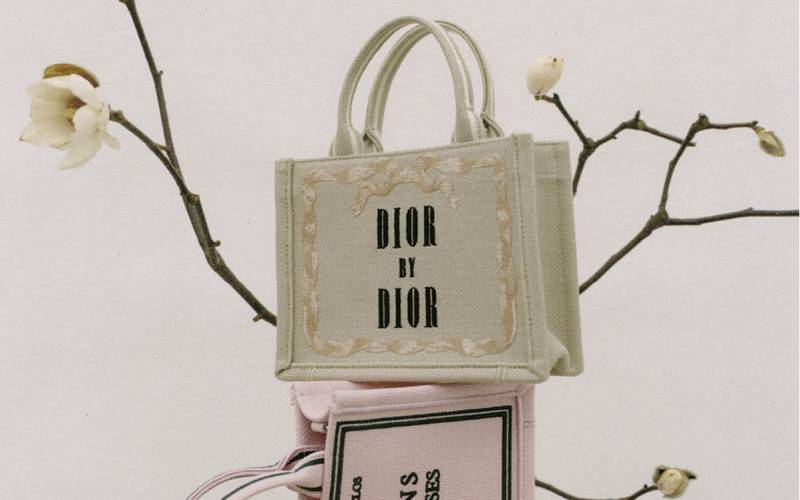시대의 흐름에 잡아먹힌 '얼굴'들
독특한 설정과 비판적 메시지로 빚어낸 '연니버스'의 초심, 영화 '얼굴'.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문명을 손에 넣은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다. 결국 자연 앞에 무력하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가리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연을 만들었다. 구조라는 정교한 '인공 자연'이다. 개념이나 사상 같은 또 다른 인간의 발명품이 이를 제어했다. 하지만 인공 자연 역시 자연이었다. 생동하는 시스템이 인간을 포식한다는 사실을 다시 은폐하기 위해, 인간은 '극복'을 신화화했다. 이제 인간은 자연이나 구조가 아닌 인간과 다툰다. 강한 자는 잡아 먹고, 약한 자는 잡아 먹힌다.

구조는 종종 스스로 빠르게 '고도화'하기를 원한다. 그 움직임은 거대한 파도다. 극복하면 파도를 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된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선 1970년대가 그런 시기다. 식민 지배와 대리 전쟁 시기를 지난 당시의 한국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던 속도로 달렸다. 고속 성장의 야만성이 노출되며 반대 급부로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꿈틀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떤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태어난 적 없다는 듯 잊혔다.
영화 <얼굴>은 이 역사의 파도를 한 가족의 삶과 거기 얽힌 미스터리를 통해 미시적으로 은유한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딛고 도장을 파다가 끝내 국내 최고의 전각 장인이 된 임영규(권해효/박정민)는 실존하는 '극복의 기적'이다. 아내 정영희가 40년 전 돌연 사라진 탓에 아들 임동환을 갓난아기 때부터 홀로 키운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런 둘 앞에 정영희(신현빈)가 백골 사체가 된 채로 나타난다. 가족이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임동환(박정민)은 그 뒤편의 미스터리에 속절 없이 이끌린다.

임영규를 취재하던 중 우연히 정영희의 존재를 알게 된 다큐멘터리 PD 김수진(한지현)은 임동환의 호기심을 이용한다. 사진 한 장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정영희의 이야기는 훌륭한 흥밋거리다. 정영희를 만났던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괴물처럼 못생겼'고, 있던 곳에서 모두가 달갑지 않아 할 진실을 폭로해 미움받았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정영희는 귀찮고 더럽고 못생긴 존재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정영희가 실제로 추한 외모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다.

정영희를 일상적으로 착취한 건 그를 괴롭혀 얻을 것이라곤 잠깐의 즐거움 뿐인 약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모두가 애써 외면하려는 강자의 폭력에 홀로 목소리를 낸 건 정영희가 잊히지 않고 기억되는 이유일 터다. 그는 아버지의 성추문을 끄집어내고, 일하던 피복공장 사장이 재봉사를 강간했다고 폭로한다. 하지만 막상 방관자, 심지어 피해자까지도 정영희의 편에 서기 보다는 그 작은 구조의 정점에 선 강자들을 비호하기를 택한다. 정영희는 소외로부터도 소외됐고, 배제에서조차 배제됐다. 다섯 번의 인터뷰를 거쳐 진실을 마주한 임영규와 임동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철저히 타자화된 정영희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장단점을 모두 뚜렷하게 비춘다. 임영규와 임동환 부자가 아내이자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설정, 이에 따라 모두의 회상 속에서도 정영희의 얼굴은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한 연출은 이야기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전각 장인이 된다는 건 눈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그 솜씨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구조 속에서 미(美)와 추(醜)는 강자 혹은 다수가 결정한다. 실제로 보지 못한 아름다움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임영규는 자신의 전각을 아름답다고 봐 주는 구조에 기생했고, 살아남았다. 연상호 감독은 임영규는 비겁이 아닌 기적이, 정영희는 희생자가 아닌 도태자가 됐다는 점을 뚝심있게 꼬집는다. 독특한 설정이 메시지와 일관적으로 접촉해 또 다른 '연니버스' 세계관을 훌륭히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릭터의 조성 방식은 여전히 거칠다. '연니버스' 특유의 극명한 선악 대비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노련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쉽다. 정영희의 존재를 잊지 못하고 미움으로 기억하는 모든 인터뷰이들은 철저한 악인으로 그려진다. 각 인물로부터 느껴야 할 불쾌감이 노골적 대사로 설계된 탓이다. 극 중 외적으로 가장 심경의 변화를 겪는 인물은 다큐멘터리 PD 김수진인데, 이미 확립된 세계관 속에서 감정이 널을 뛰다 보니 몰입이 쉽지 않다. 더불어 시대 속의 강약을 남자와 여자, 그 사이의 성적 추행이나 폭행이라는 일차원적 구도로 표현한 대목은 설정과 메시지에 비해 서사가 약하다는 '연니버스'의 고질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6 봄 필수템은 이겁니다
옷 얇아지기 전 미리 준비하세요, 패션·뷰티 힌트는 엘르에서.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