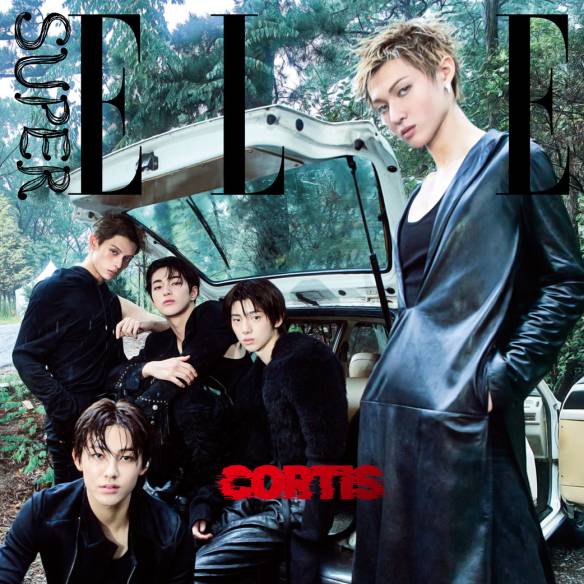SOCIETY
[엘르 보이스] 서프라이즈는 필요해
자주 신는 운동화 한쪽 앞창이 벌어진 건 한창 바쁘던 9월 초였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주 신는 운동화 한쪽 앞창이 벌어진 건 한창 바쁘던 9월 초였다. 정확히 말하면 덜컥 대학원에 등록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신없는 스케줄에 휘말린 학기 초였다. 일주일에 수업이 있는 날은 단 이틀, 하지만 매주 쏟아지는 읽을거리와 과제, 평생 가까이할 일 없을 거라 믿었던 철학적 개념어의 폭풍 속에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다 읽지도 못할 책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종종거리며 학교에 가려면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돌아간 캠퍼스는 낯설 뿐 아니라 너무 넓었다.
‘운동화 수선’으로 검색해 보니 몇몇 지역 업체의 정보가 나왔지만 찾아가자니 번거로웠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였다. 돈은 없어도 시간만은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던 사람이, 매주 알지도 못하는 이론의 바다에 던져져 숨 쉬는 것부터 새로 배우면서 뭔가 건져내려니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포기하고,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포기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행사 참석도 포기했다. 그냥 한 켤레 새로 살까? 그러나 10월 말 중간고사 전에는 쇼핑할 시간도 기력도 없었다.
운동화를 계속 신을수록 앞창은 점점 더 벌어졌다. 걸을 때마다 오른발을 바닥에서 뗐다가 앞창이 펄럭일 틈을 주지 않고 얼른 다시 내디뎌야 했다. 걷는 꼴이 조금 이상한 것보다 더한 문제는 빗길이었다. 흙탕물에 흠뻑 젖은 운동화에 신문지를 채워 넣으며 결심했다. 이렇게 더러운 채로 수선을 맡길 수는 없으니 일단 말려서 세탁한 다음 수선집에 가자! 어차피 몰랐던 걸 몇 시간 더 들여다본다고 알게 되지는 않겠지!
운동화 세탁소는 30년 된 동네 상가의 2층 후미진 곳에 있었다. 복도는 건너편 중국집에서 내놓은 양파 자루와 춘장 박스 때문에 비좁았고, 중국집 강아지인 듯한 말티즈가 낯선 손님을 경계하듯 깡총거리며 짖었다. 불투명 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여니 작은 책상 앞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의 벽은 신발장과 비닐봉지에 담긴 운동화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덜덜덜 세탁기가 돌아갔다. 남자는 내가 내민 운동화를 받고 공책에 동호수를 기입했다. 컴퓨터는 커녕 카드조회기는 물론 금전등록기도 없었다. 모든 일은 그의 손과 머리로 이뤄졌다. 1만 원을 내고 1천원짜리 여섯 장을 돌려받은 뒤 집에 돌아왔다.
며칠 뒤, 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하교하던 길에 운동화를 찾으러 갔다. 여전히 작은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던 남자는 별다른 확인 질문도 없이 신발장의 까만 비닐봉지 사이에서 하나를 찾아 내밀었다. 귀찮아 죽겠지만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수선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꺼내다가 깜짝 놀랐다. 깨끗해진 운동화의 앞창은 양쪽 다 단단히 붙어 있었다. 오른쪽 운동화에 약간의 접착제 얼룩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앞창이 떨어진 사실조차 의심할 만큼 감쪽같았다. 게다가 그는 단 한마디 생색조차 내지 않았다. 말이 없고 무료해 보이던 남자는 흙이 말라붙은 운동화를 세탁한 다음 앞창이 덜렁이는 채로 돌려주길 원치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바쁜 일상에서 마음이 바늘 끝처럼 곤두서고 매사에 심드렁해질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한다. 내가 지불한 4천원 어치의 노동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호의, 수고, 배려, 책임감…. 뭐라고 부르든, 기대하지 않은 타인에 의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삶이 가끔 주는 서프라이즈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하며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비롯해 세 권의 책을 펴냈다.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 뉴스레터 ‘없는 생활’ 운영 중.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김희진
2025 가을 필수템 총정리
점점 짧아지는 가을, 아쉬움 없이 누리려면 체크하세요.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