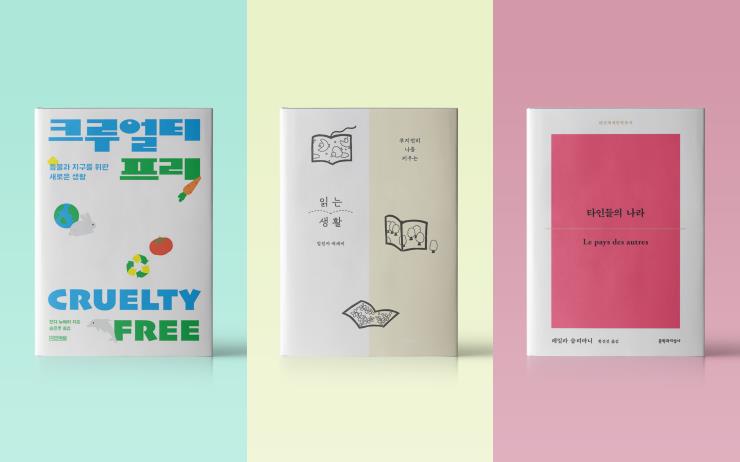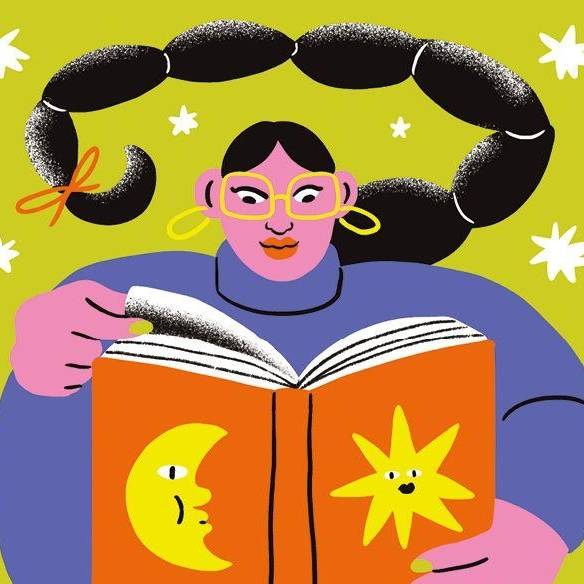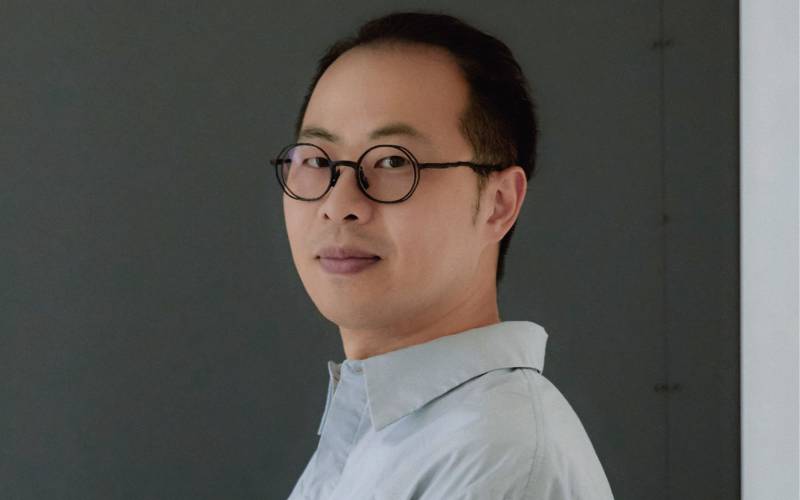CULTURE
외국인과의 연애 vs. 한국인과의 연애_라파엘의 한국살이 #25
많은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연애를 꿈꾸는 현실적인 이유. 하지만 실제 외국인과 연애했을 때 펼쳐지는 현실은 당신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파엘. 소개팅시켜줘!”
“어떤 사람?”
“외국인 친구.”
 한국 친구들로부터 이런 소개팅 요청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학교, 동아리,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등 콕 짚어 외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차고 넘쳤다. 물론 영국에서도 소개팅은 흔한 일이다. 싱글 남녀들은 서로의 친구를 서로에게 소개해준다. 하지만 한국처럼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들은 말했다. “난 한국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조건이 반복될수록 궁금해졌다.(물론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과 만나고 싶어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유독 많았다) 도대체 왜 ‘외국인’이어야만 할까?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이유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친구들로부터 이런 소개팅 요청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학교, 동아리,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등 콕 짚어 외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차고 넘쳤다. 물론 영국에서도 소개팅은 흔한 일이다. 싱글 남녀들은 서로의 친구를 서로에게 소개해준다. 하지만 한국처럼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들은 말했다. “난 한국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조건이 반복될수록 궁금해졌다.(물론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과 만나고 싶어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유독 많았다) 도대체 왜 ‘외국인’이어야만 할까?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이유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소유욕
소유욕
한국의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소유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성 친구를 두는 것 자체가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이성 친구 많은 남녀는 만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식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성 친구와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금기다. 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 횟수를 줄여야 한다. 자주 어울리면 “넌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나 봐” 같은 말을 듣기 십상이다. 전화 통화와 문자의 빈도는 사랑의 척도다. (역시 인터넷엔 ‘얼마나 바쁘길래 문자 하나를 못 보내나요? 애정이 식은 걸까요?’ 라던지 ‘애인이 회식 중인데 두 시간째 답이 없어요’ 같은 고민 상담이 넘쳐난다) 주말 데이트는 의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라지고 개인성은 옅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건 약보다는 독이 된다.
 불신과 통제
불신과 통제
“한국 남자/여자는 믿을 수 없어!” 같은 종류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소유욕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기회가 있으면 상대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불안 때문인지 애인이 내가 아닌 타인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종종 질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고자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마치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 역할과 성 평등
성 역할과 성 평등
한국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가부장적이며, 상대적으로 성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특히 결혼을 생각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여자는 요리와 청소를 잘해야 하고 외모가 예뻐야 하고 남자는 훌륭한 스펙과 능력이 큰 미덕이 된다(링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족의 압박
가족의 압박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서로의 가족과 부모가 그 관계의 한 부분이 된다. 그동안 학비를 부담하고 과할 정도로 자녀들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들의 관심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부모가 살인적인 집값과 결혼비용을 부담하게 될 테니, 그들은 자녀의 이성 관계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결혼 이후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8살 이후엔 독립해서 생활하는 영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아, 그리고 다른 ‘신체’에 대한 호기심 정도…? (피부색, 머리색, 털이나 근육이 좀 더 많다거나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외국인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 가족의 압박은 확실히 덜할 것이고 보다 개인 시간을 존중받는 연애를 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글쎄, 자기주장이 강한 만큼 때로는 무례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 문화나 언어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로컬 음식 또한 입에 대지 않는 편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무척 게으르다.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꿈을 꾼다면, 거주 비자 신청부터 낯선 문화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연애의 진리는 이거 단 하나뿐이라는 거다. ‘사람 by 사람’!
 *한국 살이 9년 차, 영국에서 온 남자 라파엘 라시드가 쓰는 한국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한국 살이 9년 차, 영국에서 온 남자 라파엘 라시드가 쓰는 한국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어떤 사람?”
“외국인 친구.”

영화 <노트북>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중

영화 <질투는 나의 힘> 중
한국의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소유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성 친구를 두는 것 자체가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이성 친구 많은 남녀는 만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식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성 친구와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금기다. 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 횟수를 줄여야 한다. 자주 어울리면 “넌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나 봐” 같은 말을 듣기 십상이다. 전화 통화와 문자의 빈도는 사랑의 척도다. (역시 인터넷엔 ‘얼마나 바쁘길래 문자 하나를 못 보내나요? 애정이 식은 걸까요?’ 라던지 ‘애인이 회식 중인데 두 시간째 답이 없어요’ 같은 고민 상담이 넘쳐난다) 주말 데이트는 의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라지고 개인성은 옅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건 약보다는 독이 된다.

영화 <연애의 온도> 중
“한국 남자/여자는 믿을 수 없어!” 같은 종류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소유욕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기회가 있으면 상대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불안 때문인지 애인이 내가 아닌 타인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종종 질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고자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마치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
한국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가부장적이며, 상대적으로 성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특히 결혼을 생각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여자는 요리와 청소를 잘해야 하고 외모가 예뻐야 하고 남자는 훌륭한 스펙과 능력이 큰 미덕이 된다(링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 중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서로의 가족과 부모가 그 관계의 한 부분이 된다. 그동안 학비를 부담하고 과할 정도로 자녀들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들의 관심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부모가 살인적인 집값과 결혼비용을 부담하게 될 테니, 그들은 자녀의 이성 관계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결혼 이후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8살 이후엔 독립해서 생활하는 영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아, 그리고 다른 ‘신체’에 대한 호기심 정도…? (피부색, 머리색, 털이나 근육이 좀 더 많다거나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영화 <달링은 외국인> 중
외국인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 가족의 압박은 확실히 덜할 것이고 보다 개인 시간을 존중받는 연애를 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글쎄, 자기주장이 강한 만큼 때로는 무례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 문화나 언어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로컬 음식 또한 입에 대지 않는 편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무척 게으르다.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꿈을 꾼다면, 거주 비자 신청부터 낯선 문화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연애의 진리는 이거 단 하나뿐이라는 거다. ‘사람 by 사람’!

Credit
- 글 라파엘 라시드
- 사진 영화 스틸
- 번역 허원민
2025 가을 필수템 총정리
점점 짧아지는 가을, 아쉬움 없이 누리려면 체크하세요.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