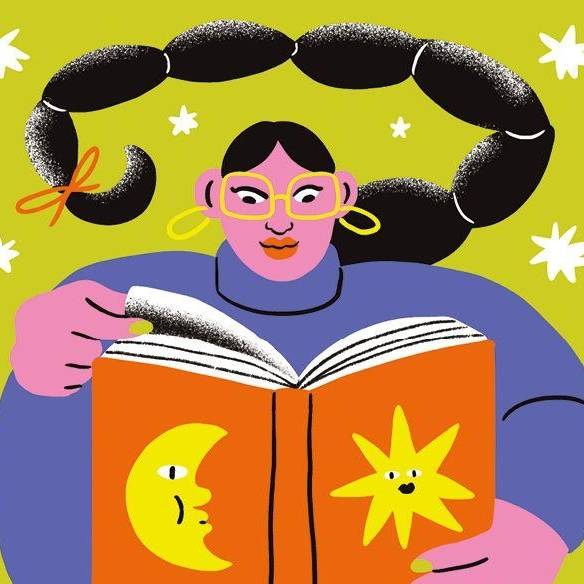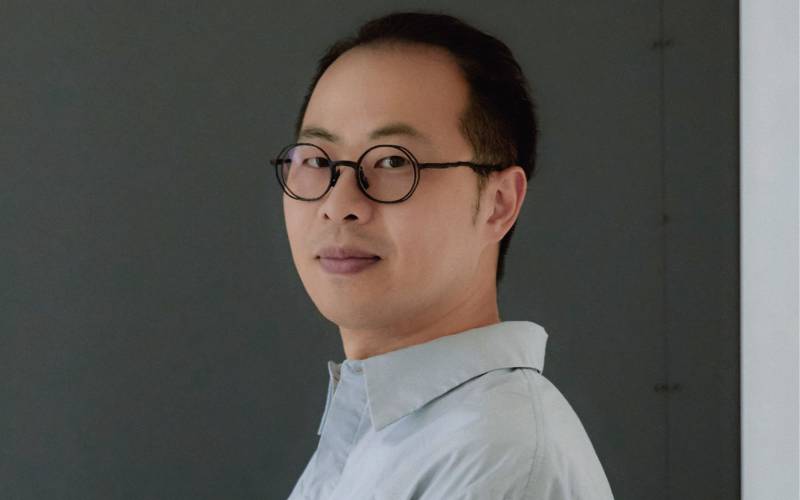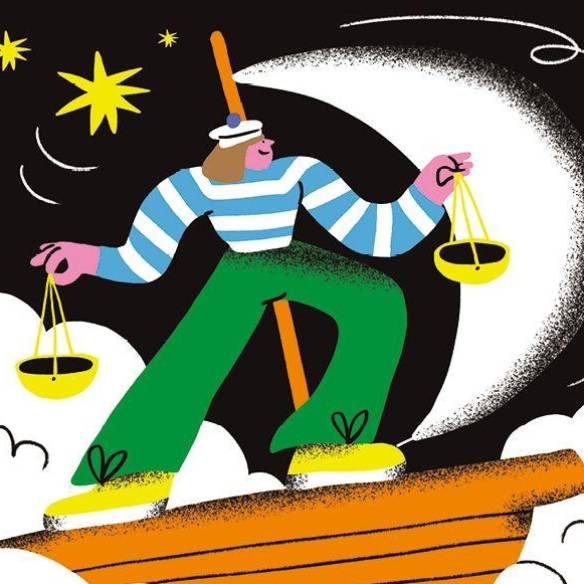세바스치앙 살가두. 남부 수단. 2006
해마다 세계보도사진전이 열린다. 이 사진전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구촌의 현실을 고발한다. 항상 가뭄, 재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시체들이 꼭 자리를 차지한다. 이 주검 앞에 우리는 공포와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현실을 포착하는 사진들은 격렬하고 즉물적으로 ‘아픔’을 호소한다. 이른바 우리가 포토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사진들이다. 정치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진을 목격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유유히 전시장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런 행태들이 도착적 소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슬라보예 지젝처럼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 동정심을 향유한다. 즉 희생자의 고통을 통해 얻는 ‘외설적 쾌락’이다. 영화에서 아이들을 등장시켜 잔혹한 죽음을 선사하는 것만큼 상업적인 것도 없다. 관객은 슬픔은 곧 돈(자본)으로 환원된다. 당신이 세상의 폭력에 분노하는 순간, 혹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이것 역시 자본주의의 배를 채우는 메커니즘에 봉사한다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인가!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다룬 사진전에 간다는 것은 보다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수전 손택이 <타인의 고통>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상황을 스펙터클로 소비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녀처럼 고통을 추상화하거나 미학화하는 이미지들을 기꺼이 거부해야 한다.
해마다 도쿄에 가면 습관처럼 들리는 곳이 있다. 에비스 역에 위치한 도쿄도 사진미술관이다. 작년에는 이곳에서 놀라운 사진을 보았다. 1994년 자이레의 고아를 찍은 사진이었다. 난민 캠프 병원에서 포대기를 덥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고통도 슬픔도 지워버린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포토저널리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바로 세바스치앙 살가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제 살가두의 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살가두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흔히 ‘파토스’로 칭송된다. 결정적 순간을 노래했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처럼 흑백 영상과 자연과 조화를 이룬 구조에 천착했지만, 그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이모션’이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노동자 Workers>를 테마로 한 연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걸프 전쟁 직후, 검은 연기를 피우며 타들어가는 쿠웨이트의 유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촬영했다. ‘석유 묵시록’이라 불릴 정도로 참담하면서 숭고했다. 그의 사진 역시 고통의 현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살가두의 사진은 늘 고결하게 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이 된 아프리카인들이나 엄마의 쭈그러진 가슴을 물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는다. 불행이나 고통만이 목격되진 않는다. 살가두의 사진에는 슬픔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그의 아이들은 놀랍게도 표정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나 기쁨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없다. 마른 사막처럼 갈라진 피부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직 눈망울만이 존재한다. 살가두의 카메라는 아프리카에서 휴머니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무 것도 신화화할 의도가 없다. 어떤 것도 설명하려 들지 않으면서 문제의 본질과 마주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는 아프리카의 세 가지 얼굴을 보여준다. 가뭄과 기아를 겪은 1970년대, 광란처럼 인종 학살이 휩쓸고 간 1990년대, 그리고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2000년대 사진이다. 제네시스 사진들은 아프리카의 아픔을 애도한 이전 작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파가라우 목장 캠프나 물을 마시는 얼룩말들을 보면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주는 신비로움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문명을 넘어서 원시적인 상태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푸는 열쇠는 아프리카에 있다”는 그의 신념을 카메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 인간 우위에서 자연과의 조화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하는 인간을 보여준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멀리 판도라 행성에서 찾았던 교훈을 살가두는 비싼 아바타 없이 제시한다. 소똥을 태워 만든 재를 얼굴과 몸에 바르는 딩카족은 참으로 투박하지만 투명하다. 이것이 미래를 품은 인간의 얼굴이다. 2월 28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 자세한 내용은 엘라서울 본지 2월호를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