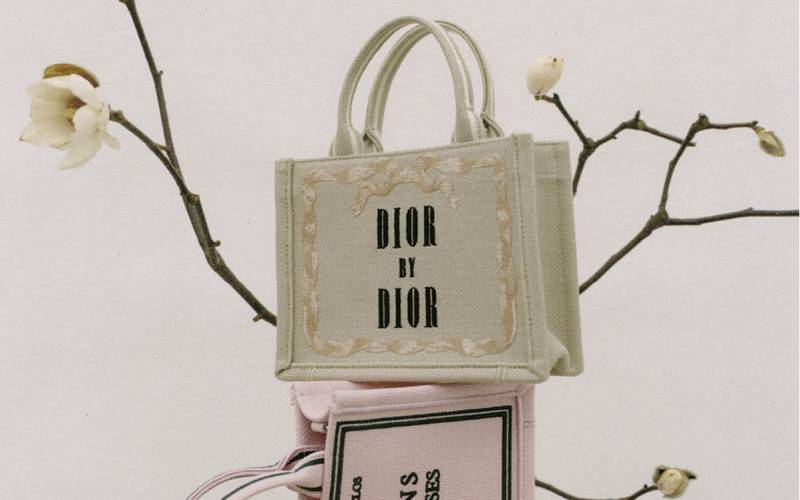SOCIETY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영화 '콜 제인'이 전하는 메시지_요주의여성 #82
한 걸음 더, 우리 함께.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영화 <콜 제인> 스틸
1960년대 미국, 변호사의 아내로 안정된 삶을 꾸려가던 주인공 조이는 둘째 임신 중 심근병증 진단을 받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임신을 중지하는 것뿐.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 위원회가 열리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 수술을 승인했던 그곳에는 담배 문 중년 남성들만 가득합니다. 절박한 조이의 눈에 “임신으로 불안하다면, 제인에게 전화하세요”라는 작은 벽보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콜 제인>은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시절,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왔던 단체 ‘제인스(The Jane Collective)’의 실화를 모티프로 했습니다. 영화 <캐롤>의 각본가 필리스 나지의 첫 연출작이기도 하지요.
‘낙태’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뤘음에도 영화는 무겁지 않게 따듯한 톤으로 흘러갑니다(수술 장면도 딱 견딜 만한 수위로 길지 않게 나옵니다). 영화는 치열한 투쟁을 전면에 그리기보다, 평범한 주부 조이(엘리자베스 뱅크스)의 상황과 변화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조이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남편의 변론을 대신 써줄 만큼 똑똑하지만 ‘가정주부’ 역할에 갇혀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남자이긴 하지만 아내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제인스’를 통해 비밀리에 안전한 시술을 받게 된 조이는 이들의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을 은신처에 데려다주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나 ‘더 많은 여성을 돕기 위해’ 점차 대담하고 열성적으로 나서게 되지요. 덕분에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남편은 냉동식품을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조이가 말합니다. “난 사람들과 교류가 필요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야.”

영화 <콜 제인> 스틸

영화 <콜 제인> 스틸
제인스 멤버들이 맞잡은 손을 올려 환호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는 그야말로 ‘해피엔딩’,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이 영화를 만든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중지 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권 논쟁이 재점화되었지요. 과거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시위를 했던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된 모습으로 다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 결정 내렸으나, 그 후 4년이 다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고 의료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관련 내용은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찾아보길 권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받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요란하게 언급될 뿐 정작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진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 걸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한탄과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세계 여성의 날에 <콜 제인>을 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품어 봅니다. 함께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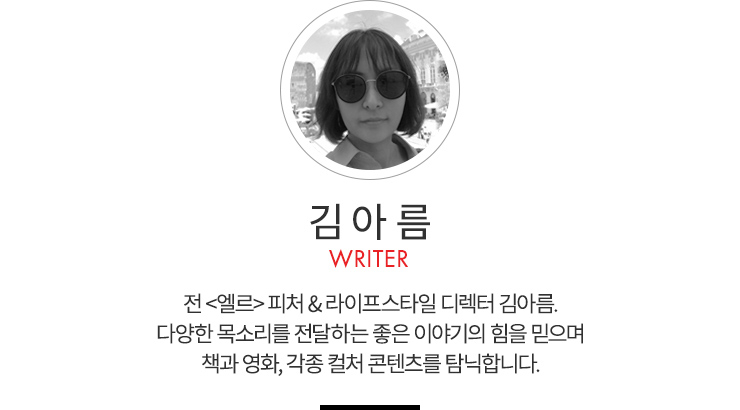
Credit
- 글 김아름
- 사진 영화 <콜 제인> 스틸
2026 봄 필수템은 이겁니다
옷 얇아지기 전 미리 준비하세요, 패션·뷰티 힌트는 엘르에서.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