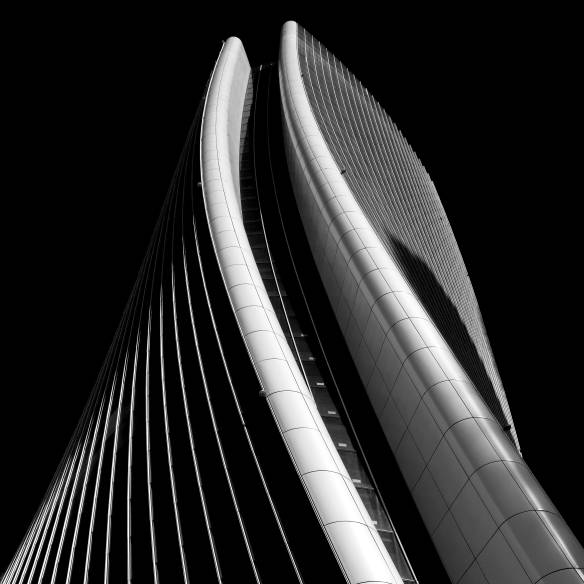SOCIETY
왜 손절 못하고 망설이는가_돈쓸신잡 #43
어떤 주식을 팔아야 할까.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unsplash
그런데, 머리로는 위와 같은 논리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론 이걸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고치려는 노력이 대부분 헛된 노력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절해야 할 사람을 손절하지 못한다. 계속 부정적인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그럴까? 지금이라도 멀어져야 할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이유는 이 사람과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 용어로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한다.
「
'매몰 비용의 오류' 케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한 기업에서 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산 100억을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예산 가운데 80억을 이미 지출했고 프로젝트 완성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큰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젝트 자체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해야 할 정도다. 매몰 비용의 오류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업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투자한 80억이 아까워서라도 나머지 20억을 투입해 일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당연히 아니다. 80억을 지출했을 때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나머지 20억이라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20억마저 활활 태우는 것이다.
「
콩고드 비행기
」
GettyImages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라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했다. 그렇게 콩고드는 1976년 처음으로 상업 비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적자가 막대하게 쌓였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콩고드는 2003년 운행을 중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어떤 주식을 팔아야 할까
」
unsplash
1년 만에 주가가 2배로 올랐다는 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주가가 반 토막 난 기업은 그 기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좋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좋은 주식을 팔고, 문제가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다.
「
손절해야 할 사람을 손절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털어야 할 주식을 털지 못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해 행위다.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본전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면 더더욱 큰 손실로 이어진다. 어떤 손절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익절이다. 손절이 익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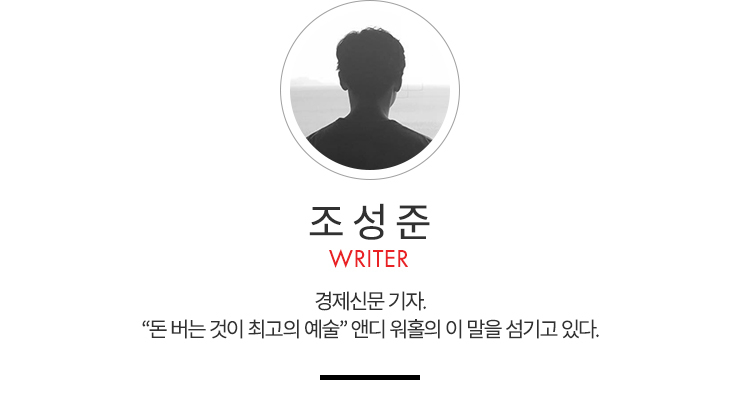
.
Credit
- 글 조성준
- 에디터 김초혜
엘르 비디오
엘르와 만난 스타들의 더 많은 이야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