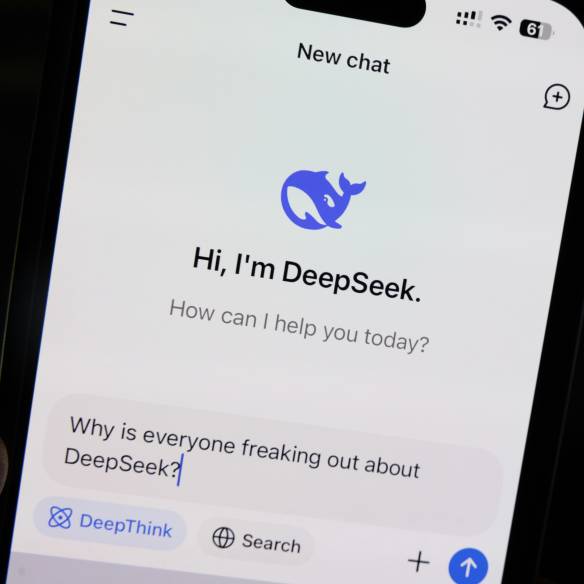SOCIETY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란? 그게 뭐야?_라파엘의 한국 살이 #14
한국 사회에서 사생활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나와 상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던지는 걸까?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애인 있어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OOO의 라파엘 라시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다. 영국에서는 누군가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기소개는 뭐랄까, 좀 더 구체적이다. 높은 확률로 이름 앞에 다니는 직장, 학교, <엘르> 코리아에 기고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등 직업란에 쓸 법한 무엇이 붙기 때문이다. 이건 뭐, 거의 명함을 읊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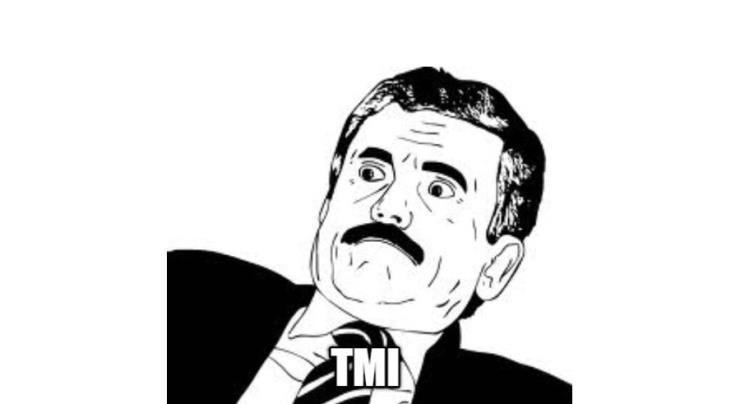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중
“월급이 얼마예요?”
처음 한국의 택시기사로부터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겉으로는 차마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례한 거 아냐?’라고 기함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다. 부모님도 묻지 않는 내 월급 내역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궁금해한다니…. 내가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금전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황 #3
“언제 결혼할 거야?” “사귀는 사람 있어?” “잘 생겼어?” “예뻐?” “나이는?” “집안은?” “뭐 하는 사람이야?” “취직했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일단 질문의 개수는 차치하고, 이런 사적인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분명한 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하고, 생각해서는 아니라는 거다.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사이인데, 어떻게 저 질문 폭격 속에서 진심 같은 걸 찾을 수 있겠나? 그 이유가 뭐든 지나친 관심은 자제 부탁!
아마 여러분 역시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경험했을 거다. 이는 흔하디흔한 일상 속 사생활 침해 사례 중 지극히 적고 보편적인 예일 뿐이다. 한국에서 프라이빗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갖는다는 건 정말이지, 힘든 일이다.
도대체 왜? 왜 (일반화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을까? 애초에 그런 사적인 질문을 스스럼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근거는 뭘까? 동네 토박이 부동산 아저씨가 몇몇은 노크도 없이,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서 어슬렁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지? (실제로 여러 번 겪은 일이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한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개인’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다. 개인을 우선에 두는 순간, ‘나’는 단체에서 이기주의자가 되기 십상이다.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대신 퇴근을 선택한다고 상상해보자) 사회생활을잘한다는 건 단체생활을 잘한다는 것의 동의어다. 결국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무난하게 하려면 그룹에 종속되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어떤 단체의 암묵적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사회 부적응자로 고립된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아이러니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는데 ‘개인’보다는 ‘우리’ ‘그룹’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에 익숙한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의 서양 국가를 생각해 보시라) 물론 한국의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두고 “아니, 00번째 확진자는 그 시간에 거기서 뭘 한 거야?” 같은 쓸데없고 의미 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겠지만.

Credit
- 글/ 라파엘 라시드
- 사진/언스플래시 각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 번역/ 허원민
엘르 비디오
엘르와 만난 스타들의 더 많은 이야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