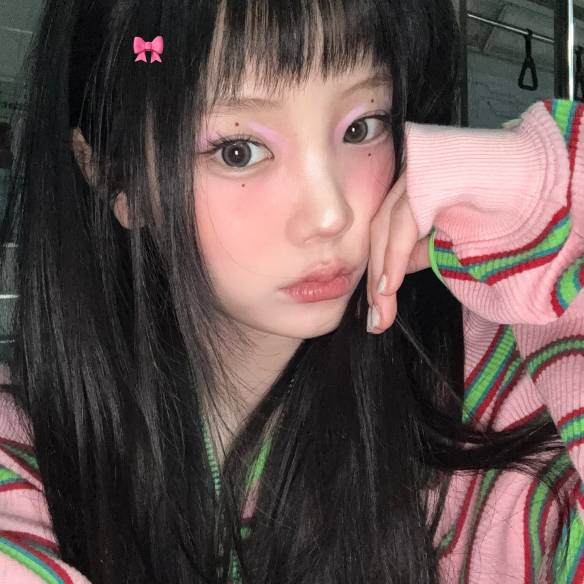SOCIETY
느슨한 동거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마당. 작가 한민경과 고양이들의 작은 땅 위에서 펼쳐지는 아주 느슨하고 미스터리한 동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내 삶에 고양이가 뛰어들었다. 게스트하우스 마당 덕이었다. 지금의 푸릇푸릇한 잔디 마당은 처음 집을 지은 당시엔 나무 덱과 시멘트로 꾸려진 공간이었는데, 그곳으로 고양이들이 한두마리씩 찾아왔다. 배가 고픈지 밖에 둔 쓰레기봉투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걸 막으려고 사료를 구입해 나르다 보니 녀석들은 점점 마당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봤던 재빠르고 날렵한 고양이들과 달리 제주도 고양이들은 태연했고, 조금 뻔뻔하기도 했다. 집 근처 풀숲이나 옆집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다가도 내 차 소리나 인기척 소리가 나면 모두 뛰어나왔다.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고, 이름을 붙이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양이가 여덟 마리로 늘어나 있었다. 이들이 종일 마당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 큰 부담은 없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숙소, 마당의 고양이.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양이들을 챙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기 시작했다. 수컷들은 짝짓기를 위해 싸우느라 상처투성이가 돼 돌아오고, 암컷들은 짧은 주기로 자주 임신한다는 것을. 새끼 고양이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이렇게 늘어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중성화 사업(TNR)을 알게 됐다. 밥을 주며 친해진 고양이들부터 한 마리씩 잡아 중성화를 시켰다. 중성화 후 수컷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암컷들은 반복되는 임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양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짝짓기를 위해 혹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목숨 걸며 싸울 일은 없으니 자연스럽게 ‘마을 냥’에서 ‘마당 냥’이 되는 고양이가 생겼다. 지금이야 어디 가서 “고양이 좀 압니다” 하지만, 나는 두 마리의 개 호이 · 호삼이와 제주 생활을 담은 <호호브로 탐라생활>을 책으로 쓰면서 앞으로도 개랑만 살 ‘개파’ 임을 선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참을 ‘고알못’(고양이를 알지 못하는 자)이라는 단어에 숨어 지내기도 했었다. 적어도 다리를 절며 우리 집으로 오던 아기 고양이 나무나무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무는 눈이 유독 커다란 새끼 고양이였다. 어미를 잃은 듯 길에서 한참 우두커니 혼자 있길래 마당으로 데려와 냥들에게 이모와 삼촌이 돼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래도 무리였는지 다시 혼자가 됐다. 그렇게 3일을 떠돌다 다시 마주쳤는데, 그때는 다리도 절고 상태가 나빠 보여 뭔가에 홀린 듯 안고 집으로 들어와버렸다. 호기롭게 입양을 보내겠다는 내 큰소리와 달리 이상할 만큼 큰 나무의 눈은 질병의 전조 증상이었고, 몇 차례 발작 후 MRI를 찍어본 결과 뇌수두증을 진단받았다. 아픈 고양이를 입양 보낼 수는 없어 긴 고민 끝에 우리 집 막둥이로 맞이해 버렸다.
얼떨결에 개만 살던 집에 들어온 고양이는 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푹신한 곳을 골라 자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즐기는 나무를 보며 마당 냥이들도 집에서 산다면 나무와 다를 바 없을 텐데 하는 마음에 마당 냥이의 밥자리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됐고, 이름과 캐릭터를 부여한 그들의 귀여운 사진을 SNS에 자주 올려 사람들에게 입양을 권유했다. 이 따뜻한 털 뭉치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잊지 않고 수시로 이야기했다. 그 결과 내 SNS에는 ‘개가 있는 집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 사진이 넘쳐났다. 그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서일까? 몇몇 고양이는 숙소를 찾았던 게스트들의 집으로 입양 가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고, 마당 냥이들은 랜선 이모로 통칭되는 ‘인친’들에게 사료나 간식 조공을 받으며 길냥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행운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니 우리 마당에 7년째 찾아오는 장수 멤버인 뉴규뉴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다.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라 한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영역 이동을 하기도 해서 정들 만하면 멤버 교체가 이뤄진다. K팝 아이돌을 데뷔 시점에 따라 세대로 나누듯 우리 마당 고양이들 또한 세대가 나뉜다. 2세대쯤 되는 뉴규는 일명 턱시도 냥이었다. 뉴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1세대 고양이들을 내쫓고 괴롭히며 영역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름도 대충 지었다. 1세대에서 턱시도를 담당한 꺼므꺼므와 헷갈려 하는 게스트들이 “사장님, 쟤가 꺼므죠?!” 하고 물어보면 나는 “아뇨, 쟤는 꺼므가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누구예요?”라고 되묻는 게 너무 잦아 미운 맘에 뉴규라고 지어버렸다. 밥만 먹고 빨리 가길 바라던 맘과는 달리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 1년, 5년… 뉴규는 그렇게 7년을 머물렀다.
그사이 내 마음도 열렸다. 뉴규는 시커먼 외모와 다르게 자기 밑으로 들어온 고양이들에게 다정했고, 게스트들의 마음을 녹이는 재주도 있었다.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은 놓치지 않고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궁디 팡팡’을 얻기 위해 곁에 붙어 있기 일쑤였다. 귀여움에는 장사가 없는 법, 어느새 뉴규는 슬로우트립의 터줏대감이자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됐다. 밖에서 살지만 비굴하지 않고 늘 당당했으며, 고양이들의 대부를 자처했다. 그런 뉴규가 언젠가부터 꼬질꼬질해지기 시작했다. 길냥이들이 걸리면 답도 없는, 이빨이 녹아 없어지는 치아흡수병변과 구내염이 그 이유였다. 밥 먹기도 고통스럽고 그루밍을 할 수도 없게 된 뉴규의 뽀송했던 턱시도는 떡지고 더러워졌으며, 엉덩이를 치켜들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삐쩍 말라갔다. 길냥이에 관한 내 역할은 어디까지일지 고민이 많았다. 뉴규에게 항생제를 타다 먹이고, 습식 사료를 떠먹이는 일 말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규를 응원해 주던 인친들이 치료하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마침 내가 운영하는 동물 팟캐스트 <니 새끼 나도 귀엽다>에 출연한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님께서 길냥이라도 여건이 되면 꼭 발치 수술을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나도 용기를 내 뉴규의 구내염 치료와 발치를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뉴규를 돕던 게스트 중 한 명이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호소에 있는 성묘 입양도 힘들 때 7년을 밖에서 지낸 고양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뉴규에게는 천운 같은 기회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뉴규를 마당 냥에서 은퇴시켰다.
게스트하우스의 일부처럼 있던 뉴규였기에 그의 부재가 내게도 크게 다가왔지만, 입양 간 곳에서 ‘오뉴규’라는 멋진 성을 부여받고, SNS로 소식을 들으면 되기에 ‘이제 두 마리 남은 마당 냥만 잘 돌보며 살아야지’ 했다. 그러나 남겨진 고양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뉴규의 휘하 아래 있던 치즈 두 마리, 치베치베와 또치또치는 뉴규가 떠난 영역을 지킬 힘이 없었다. 4세대 고양이인 치베와 또치는 평화주의자였고, 목소리가 작았다. 싸움하는 법을 모르니 길 건너 친구네 집 마당에서 살던 턱시도 고양이 수잔이와 금동이, 노랭이가 슬금슬금 넘어왔다. 턱시도 암컷 한 마리도 뒤늦게 합류해 총 네 마리가 무리 지어 우리 마당으로 왔다. 치베와 또치만 돌보면 된다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다. 개체가 늘면 사료값도 늘고, 이들과 친해져 원활하게 TNR도 해야 하고, 원조 냥이를 쫓을까 봐 감시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친구네 집에서 TNR을 마친 고양이들이라 밥만 챙겨주면 된다는 것. 게다가 수잔의 무리들은 사료와 간식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으니 밥값을 하는 친구들이었다. 나는 그저 원조냥인 치베와 또치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하면 됐다. 식사는 먼저 온 순서대로 주는데, 수잔의 무리가 비슷하게 도착한 ‘원조파’에게 앙칼지게 대하면 중간에 개입해 우리 마당 냥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도 상처받은 게 느껴지면 간식을 주며 소소하지만 ‘원조파’와 ‘철새파’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주고 있다. 이런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서일까? 다행히 이들은 마당을 적당히 공유하며 지내는 중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 집 안에서 나무가 지켜보고 있다. 집이 지어지지 않고 공사가 멈춘 97평 땅이 덩그러니 있던 시간을 기억한다. 그 땅에 꿈을 담은 집이 지어지고 마당이 생기니 고양이들이 찾아와 망중한을 즐기고, 새와 곤충이 드나든다. 그렇게 우리는 느슨한 동거를 한다. 아주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동거를.
Credit
- 에디터 전혜진
- 글 한민경
- 일러스트레이터 KAY MCDONAGH
- 아트 디자이너 민홍주
- 디지털 디자이너 오주영
2025 가을 필수템 총정리
점점 짧아지는 가을, 아쉬움 없이 누리려면 체크하세요.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