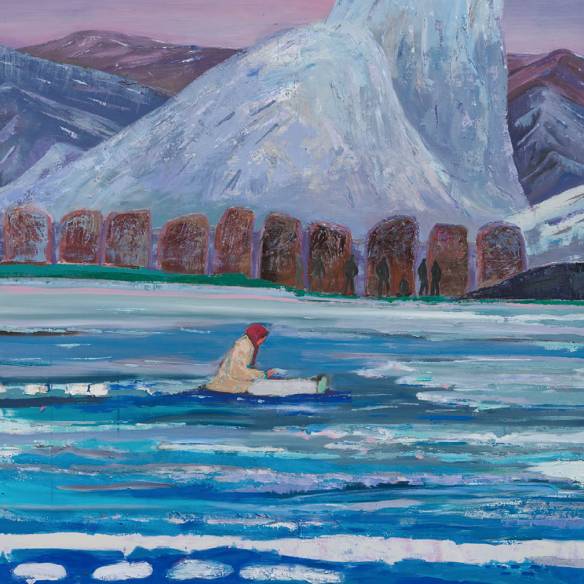요리를 사랑하는 울리히 피들러가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이닝 공간. 1928년 요셉 뮐러(Josef Müller) 공방에서 만들어진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체어와 테이블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초록 카펫은 체코 디자이너 안토닌 키발(Antonin Kybal)이 1930년에 디자인한 것.
갤러리 울리히 피들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 그의 디스플레이는 늘 간결하고 미학적이다. 1923년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가 만든 어린이 체어와 마리안네 브란트(Marianne Brandt)의 티 세트를 찍은 루치아 모홀리(Lucia Moholy)의 빈티지 사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의 ‘갤러리 울리히 피들러(Galerie Ulrich Fiedler)’를 방문하려면 건물 밖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야 한다. 화려한 대리석 계단을 밟아 2층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고 그가 반갑게 맞아준다. ‘by Appointment’에는 늘 작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 내밀한 시퀀스를 통과한 만큼 밀도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누군가의 취향을 들여다보며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서로의 시간이 연대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의 디자인 가구 전문 갤러리를 위해 울리히 피들러가 이 아파트먼트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내 컬렉션을 삶의 일부로 보여주는 방식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여기에 머물기도 해요. 일반적인 쇼윈도가 아닌, 우리만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죠.”
(왼쪽) 1934년 헤릿 릿펠트(Gerrit Rietveld)가 디자인한 지그재그 체어. (오른쪽) 1930년대 네덜란드 빌럼 헨드릭 히스펀(W. H. Gispen)이 제작한 서랍장과 1965년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가 만든 거울이 시대를 뛰어넘어 멋스럽게 공존한다.
(왼쪽) 스위스 아티스트 베아트 초더러(Beat Zoderer)의 전위적인 조각. (오른쪽) 1932년에 생산된 베르너 막스 모저(Werner Max Moser)의 메탈 네스팅 테이블 위에 1925년 바우하우스 공방에서 제작한 마리안네 브란트의 메탈 볼이 놓여 있다.
갤러리에서는 <1923 바우하우스 전람회 100주년>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바우하우스가 자신들의 활약상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1923년 바이마르에서 열렸던 전람회를 100년 만에 다시 떠올린 기획이다. 그리고 당시 전람회에 출품된 마르셀 브로이어의 어린이 의자, 마리안네 브란트의 메탈 제품들, 빌헬름 바겐펠트의 조명과 전시 엽서들이 이를 기념하듯 새롭게 병치돼 있었다. “1923년 전시 엽서의 모든 버전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죠. 심지어 과거에 판매했던 걸 다시 구매한 것도 있어요. 벼룩시장이나 일반 딜러를 통해 좋은 피스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탐정처럼 원하는 물건들을 추적해야 하는 거죠.” 그는 갤러리를 운영하지만 자신의 컬렉션을 지키는 역할에도 충실하다. 그리고 이 희귀한 아이템을 갤러리 안쪽에 딸린 아파트먼트에서 자신과 아내 카타리나의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갤러리라는 공적 공간에서 피들러 부부의 프라이빗한 아파트로 들어서는 관문은 수천 권의 아트 · 디자인 관련 책이 쌓여 있는 복도형 책장이다. 40여 년에 걸친 부부의 미적 감각과 지식을 만들어준 결정체는 바로 책이다.
거실공간의 핵심은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소파는 카펠리니(Cappellini)를 위해 재스퍼 모리슨이 디자인한 것으로, 벽에 걸린 독일 작가 하이디 슈페커(Heidi Specker)의 사진과 조화롭게 어울린다.
거실의 책꽂이와 조명은 모두 재스퍼 모리슨. 벽에 걸린 히로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 헤수스 라파엘 소토(Jesús Rafael Soto)의 작품이 공간에 초월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노란 테이블이 펼쳐진 주방을 지나 복도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부부의 공간이 시작된다. 미니멀한 갤러리에 비해 가구와 작품이 밀도 있게 배치된 거실에는 진솔하게 그들의 취향이 묻어난다. “거실의 주인공은 재스퍼 모리슨이에요. 1990년대에 우리 갤러리에서 그의 전시가 열렸죠. 재스퍼가 막 디자인을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전시가 끝나고 남겨진 제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우리가 소장했죠. 쓰고 있는 소파와 책장, 조명 모두 그때 선보였던 피스들이에요.” 부부의 촉수를 사로잡은 히로시 스기모토, 요셉 보이스, 토마스 그륀펠트(Thomas Grünfeld)의 작품은 물론이고 근래에 보는 책들, 겨울을 책임질 여러 개의 블랭킷과 조명이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듯하다. 욕실의 새하얀 욕조마저 미학적으로 보였고, 패션을 사랑하는 카타리나의 유리 옷장에는 준야 와타나베와 꼼 데 가르송의 조각 같은 드레스들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KPM의 오래된 잔에 차를 따르며 그가 말했다. “컬렉션조차 우리 일상의 일부예요. 박물관처럼 장갑을 끼고 다루지는 않아요. 특별히 보존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사용하죠. 삶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토마스 그륀펠트(Thomas Grünfeld)의 위트 있는 작업.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화이트 소파는 뉴욕 시그램 빌딩을 위해 디자인한 것. 도널드 저드의 에칭 작품이 나란히 걸린 벽. 가구를 강조한 이들의 공간 중 유일하게 아트 컬렉션을 위해 할애한 공간은 거실의 한쪽 벽. 울리히 피들러는 마르셀 브로이어의 1932년 데스크와 임스의 소프트 체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데스크 램프는 크리스티앙 델(Christian Dell).
울리히 피들러는 20~30년대에 만들어진 실험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가구들을 추적하고 모으는 일에 40여 년을 헌신해 왔다. 1986년 쾰른에 갤러리를 오픈하고 2008년 베를린으로 건너와 또 다른 챕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 여정의 처음은 언제였을까? “학생시절에 우연히 쓰레기 수거통에서 낡은 의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오리지널 피스였어요.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리에디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죠. 함께 살던 룸메이트와 함께 벨기에와 프랑스를 돌며 중고가구 거래를 시작했고, 아르데코나 곡목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했죠.”
바우하우스 스페셜리스트답게 요셉 알베르스(Josef Albers)의 ‘사각형에 대한 경의’를 소장하고 있다.
패션마저 감각적인 울리히 피들러(Ulrich Fiedler)와 카타리나 에베르스(Katharina Evers) 부부.
디자인의 원형을 만들어낸 시대, 그 가치를 자신의 삶과 소명으로 직조해 온 40여 년의 시간. 시작은 쓰레기 수거통에 버려진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의자를 되살린 순간부터였다. 누가 가죽이 너덜너덜해진 미스의 의자, 빛바래 회색이 돼가는 브로이어의 프로토타입을 자신의 삶에 기꺼이 들일 수 있을까. “내 고객들은 아파트를 꾸미기 위해 가구를 사지는 않아요. 디자인 히스토리 안에서 그 오브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자신의 컬렉션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가구의 기능이나 쓸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역사적 가치는 늘 장식과 기능을 능가하니까요.” 그가 세상에 펼쳐내는 것들과 이야기를 되새기다 보면 내 안에도 약간의 ‘열정’이라는 것이 씨앗처럼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