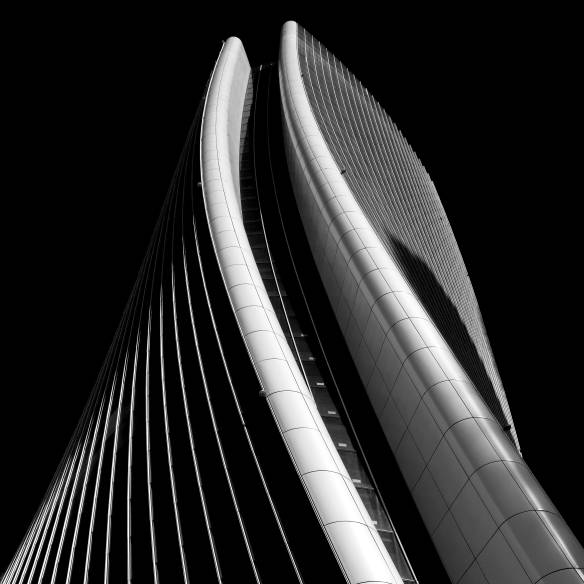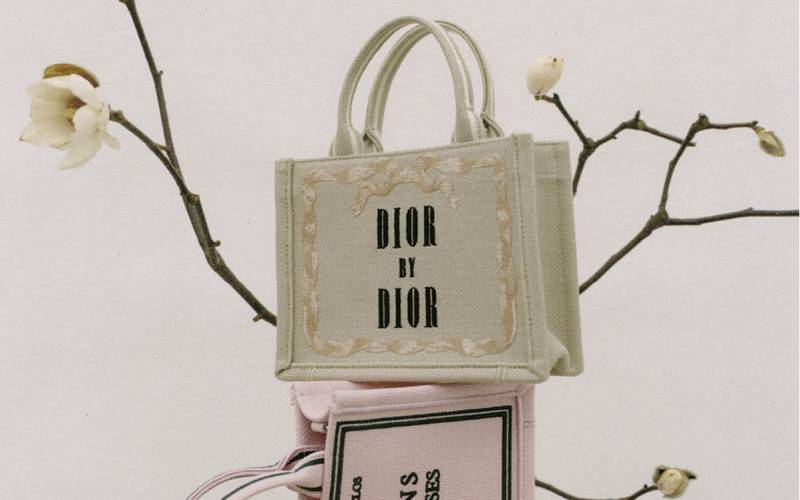SOCIETY
평생 빚만 갚다 죽는다? 50년 만기대출, 받아도 되는 걸까_돈쓸신잡 #113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화제다. 이 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집을 살 때 받는 담보대출의 만기는 30년이었다. 만기가 더 짧은 상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다수가 30년 만기 상품을 선택했다. 50년 만기 상품까지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했다.
정부는 갑자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이 상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은 50년 만기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거론된다.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중장년층이 50년 동안 빚을 갚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기존의 30년 만기 대출은 어떤가. 30년은 짧은가? 물론 50년보다는 짧지만 30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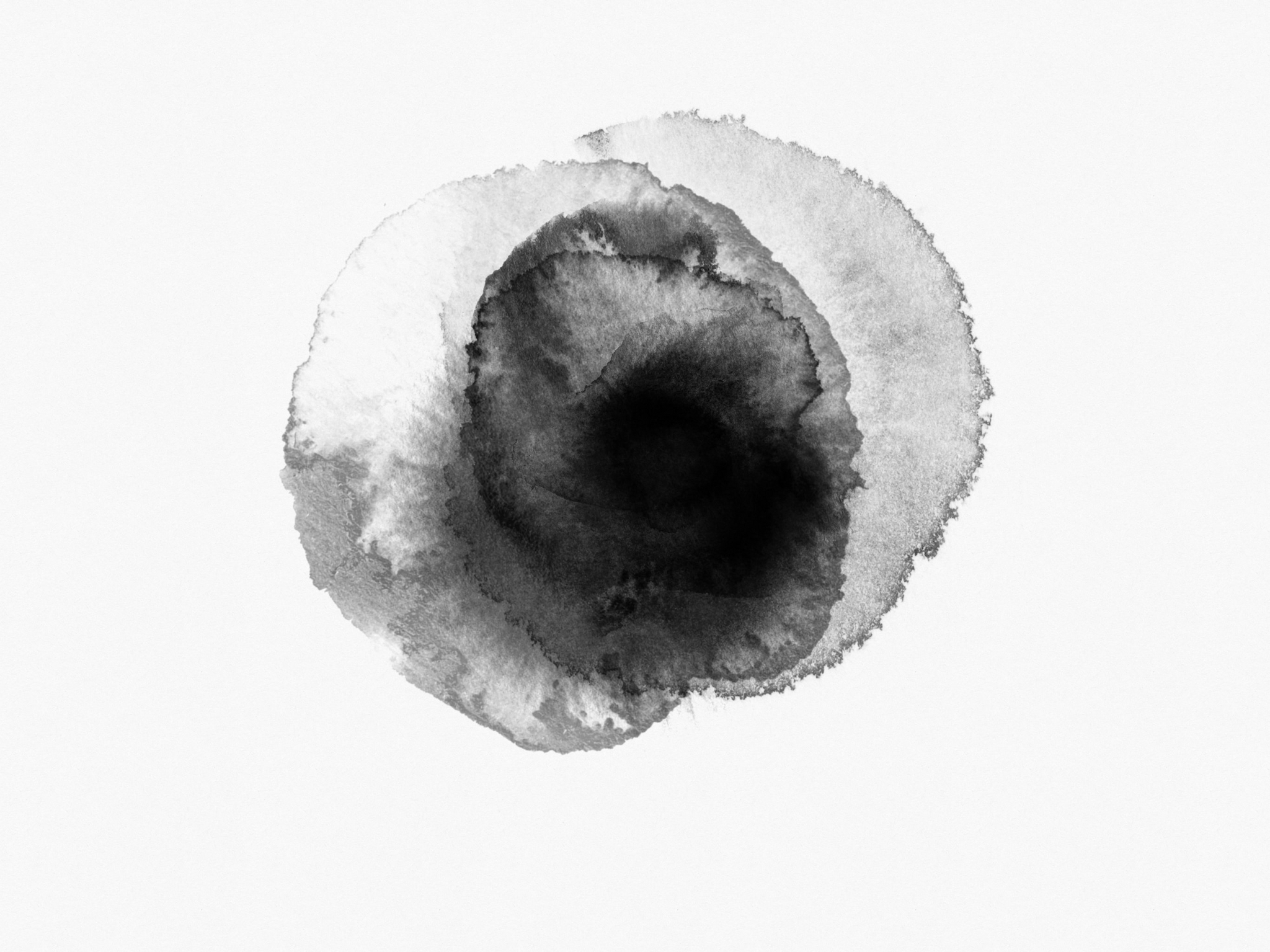 50년 만기 대출 이슈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이 많다.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가"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란 말인가" "빚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50년 만기 대출 이슈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이 많다.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가"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란 말인가" "빚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이 상품을 두고 진짜로 50년 내내 빚을 갚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물론 50년 내내 빚에 시달리는 것을 상상하면 유쾌하진 않다. 하지만 실제론 주택담보대출은 30년 혹은 50년 내내 갚는 상품이 아니다.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건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3억 원을 빌린다고 치면 1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돈은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금리가 5%라고 가정하면 10년 만기일 땐 매달 320만원, 30년 만기일 땐 160만원, 50년 만기일 땐 130만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매달 내야 하는 돈의 액수는 적어진다. 바로 이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을 확 줄이면 그만큼 잉여 자금이 남는다. 그 자금을 다시 다른 자산에 투자하며 굴리는 것이다.
 또한 한 아파트에서만 30년, 50년 내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성실하게 빚을 차근차근 갚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사를 한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땐 기존에 있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이란 30년, 50년 내내 갚는 것이 아니라 집을 처분할 때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다.
또한 한 아파트에서만 30년, 50년 내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성실하게 빚을 차근차근 갚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사를 한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땐 기존에 있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이란 30년, 50년 내내 갚는 것이 아니라 집을 처분할 때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라면 은퇴 이후에 퇴직금을 활용해 빚의 상당수를 한 번에 상환할 수도 있고, 혹은 노후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활용해 빚을 갚을 수도 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꼭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꼭 어려운 회계 개념을 꺼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20억 원 짜리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부동산 자산은 20억 원이다. 이 20억 원 중에선 자본도 있고 부채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산을 키우기 위해선 자본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수다. 자기 자본이 7억 원이 있는 사람이 7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조금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10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 투자 측면에선 유리하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꼭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꼭 어려운 회계 개념을 꺼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20억 원 짜리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부동산 자산은 20억 원이다. 이 20억 원 중에선 자본도 있고 부채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산을 키우기 위해선 자본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수다. 자기 자본이 7억 원이 있는 사람이 7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조금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10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 투자 측면에선 유리하다.
대학교로 예를 들어보자. 같은 수능성적을 받은 A와 B가 있다고 치자. A는 어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반면 B는 A가 들어간 대학보다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에 예비합격으로 간신히 입학했다. 누가 더 입시 전략에 성공한 것인가? 당연히 B다.
자산을 불릴 때 대출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본인의 역량을 한참 벗어난 '영끌' 수준의 대출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출받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빚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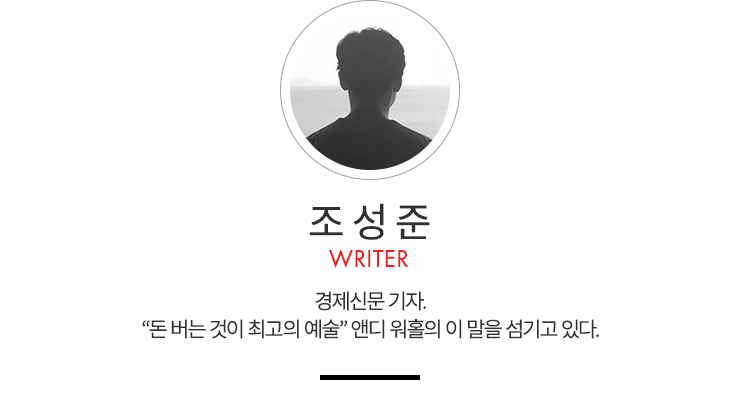
정부는 갑자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이 상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은 50년 만기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거론된다.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중장년층이 50년 동안 빚을 갚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기존의 30년 만기 대출은 어떤가. 30년은 짧은가? 물론 50년보다는 짧지만 30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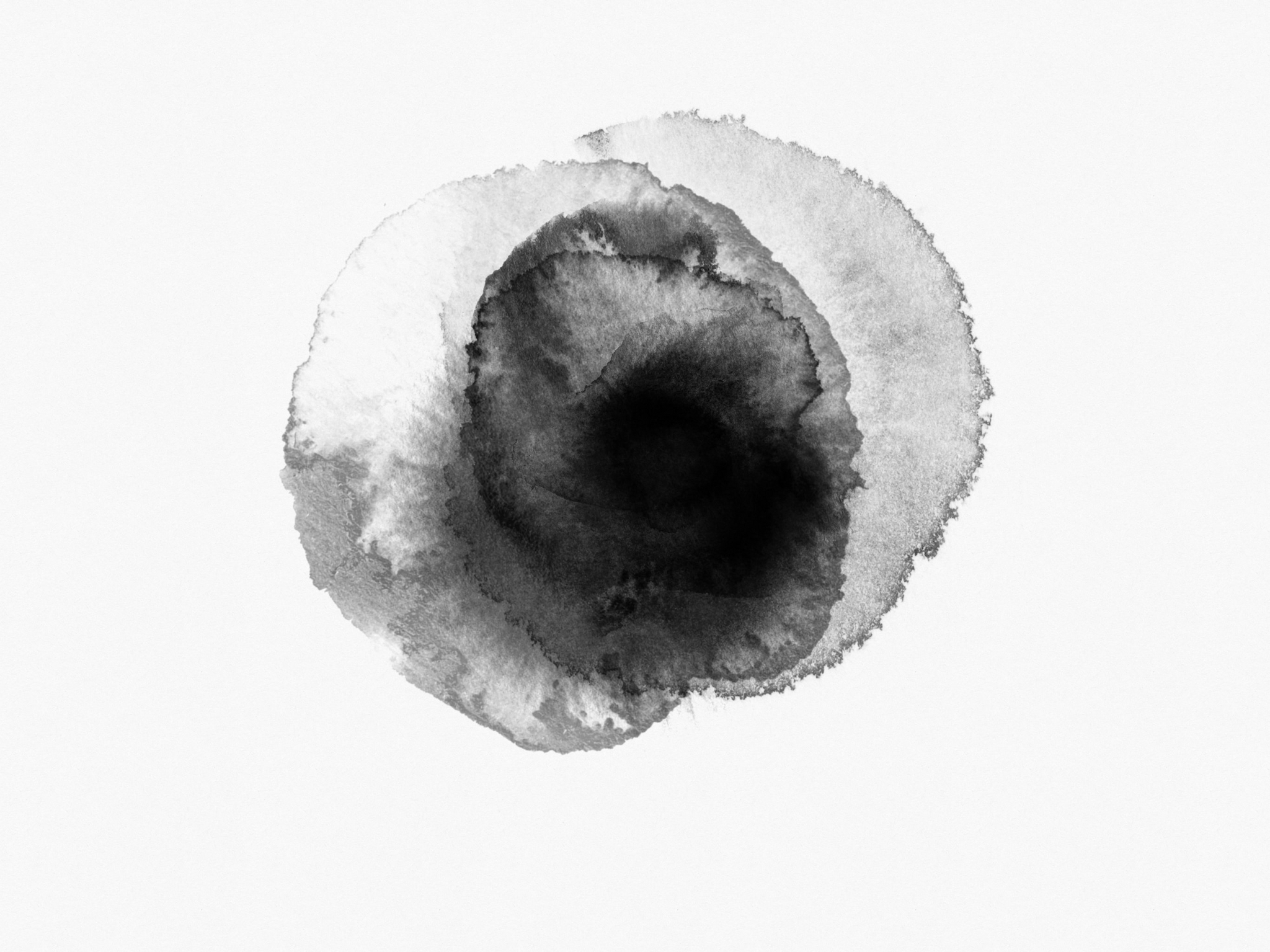
Unsplash
즉, 많은 사람들은 이 상품을 두고 진짜로 50년 내내 빚을 갚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물론 50년 내내 빚에 시달리는 것을 상상하면 유쾌하진 않다. 하지만 실제론 주택담보대출은 30년 혹은 50년 내내 갚는 상품이 아니다.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건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3억 원을 빌린다고 치면 1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돈은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금리가 5%라고 가정하면 10년 만기일 땐 매달 320만원, 30년 만기일 땐 160만원, 50년 만기일 땐 130만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매달 내야 하는 돈의 액수는 적어진다. 바로 이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을 확 줄이면 그만큼 잉여 자금이 남는다. 그 자금을 다시 다른 자산에 투자하며 굴리는 것이다.
「
30년, 50년 동안 빚 갚는 사람은 별로 없다
」
Unsplash
물론,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라면 은퇴 이후에 퇴직금을 활용해 빚의 상당수를 한 번에 상환할 수도 있고, 혹은 노후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활용해 빚을 갚을 수도 있다.
「
자산=자본+부채
」
Unsplash
대학교로 예를 들어보자. 같은 수능성적을 받은 A와 B가 있다고 치자. A는 어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반면 B는 A가 들어간 대학보다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에 예비합격으로 간신히 입학했다. 누가 더 입시 전략에 성공한 것인가? 당연히 B다.
자산을 불릴 때 대출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본인의 역량을 한참 벗어난 '영끌' 수준의 대출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출받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빚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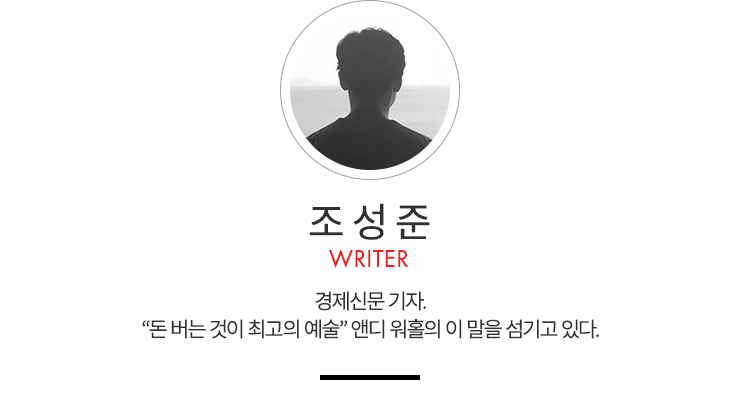
Credit
- 글 조성준
- 사진 Unsplash
2026 봄 필수템은 이겁니다
옷 얇아지기 전 미리 준비하세요, 패션·뷰티 힌트는 엘르에서.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