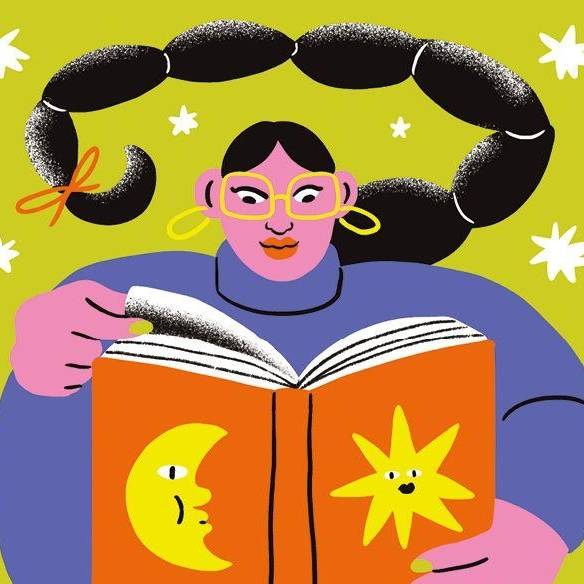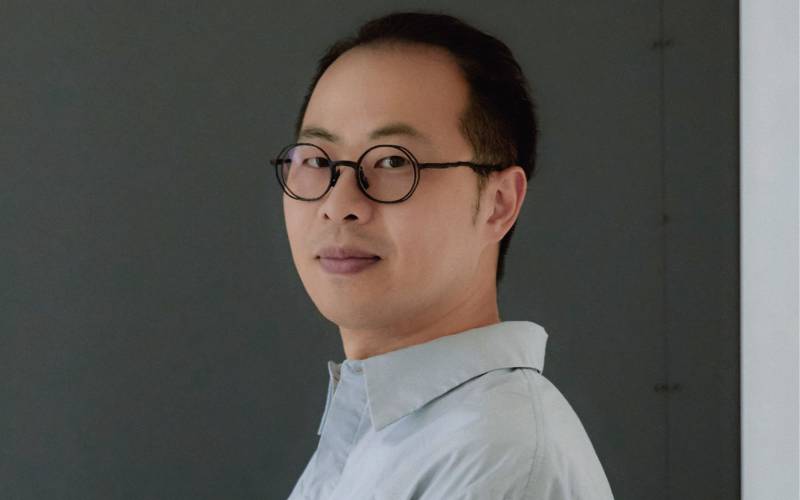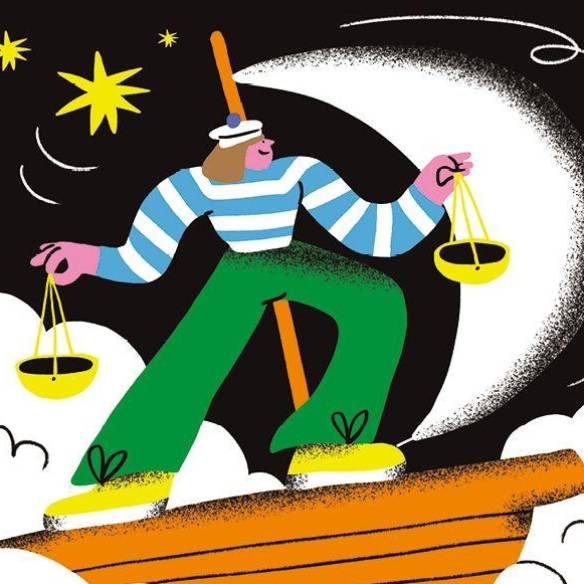CULTURE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아웃오브서울
책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의 저자. 평일에는 리빙 MD로 주말에는 작가이자 주말 농부로 사는 김미리의 진솔한 오도이촌 이야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나의 집 연대기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됐다. 주방과 거실, 침실이 한 공간에 있는 방이었다. 다섯 평 정도의 작은 방은 머리맡에 옷걸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어느 밤에는 얼굴 위로 쓰러진 묵직한 옷 더미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다. 몇 년 후엔 주방과 분리된 1.5룸으로 이사를 갔다. 옷에 냄새가 밸까 봐 주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나는 그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욕조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간 후에는 다양한 욕실 용품을 사는 취미도 생겼다. 삶의 방식은 어떤 곳에 사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었다. 막막했던 마음이 공간을 따라 성장했다. 오랜 시간 도시 삶을 이어오던 내가 어느 날 돌연 시골에 집을 사게 된 건 지독한 번아웃 때문이었다. 직장생활한 지 10년 차 되던 해, 치열한 회사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매일같이 ‘퇴사’ ‘휴직’ ‘한 달 살기’를 검색하다 우연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처음엔 시골의 집 매물을 검색해 봤고, 나중에는 지방 곳곳의 집을 보러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러 집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세 가지. 옆집과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큰 마을에 속한 집이 아닐 것. 툇마루가 있는 한옥 형태면서 기본 골조가 튼튼한 집일 것. 서울에서 차로 두세 시간 내의 거리일 것. 막연하게 집을 다 고치고 난 뒤에는 영영 서울을 떠나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물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시골생활에서 큰 위안을 얻었기 때문일 거다.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작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 역시 그렇다. 모두의 행복이 서울에 있거나 시골에 있지는 않을거다. 스스로를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 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앞으로도 쭉 오도이촌 삶을 유지할 거냐고 물을 때면 아직도 나는 늘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지금처럼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게 될지, 언젠가는 아예 시골에 자리 잡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시골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과 삶의 균형을 실감하고 있다. 집 앞 냇가에 풍덩 뛰어들어 다슬기를 잡으며, 직접 키운 무와 배추를 수확해 김치를 담그며,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자연을 생생하게 감각하며.
김미리 책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의 저자. 평일에는 리빙 MD로, 주말에는 작가이자 주말 농부로 산다.
Credit
- 에디터 김초혜
- 사진 표기식
- 아트 디자이너 박한준
- 디자인 김희진
이 기사엔 이런 키워드!
2025 가을 필수템 총정리
점점 짧아지는 가을, 아쉬움 없이 누리려면 체크하세요.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