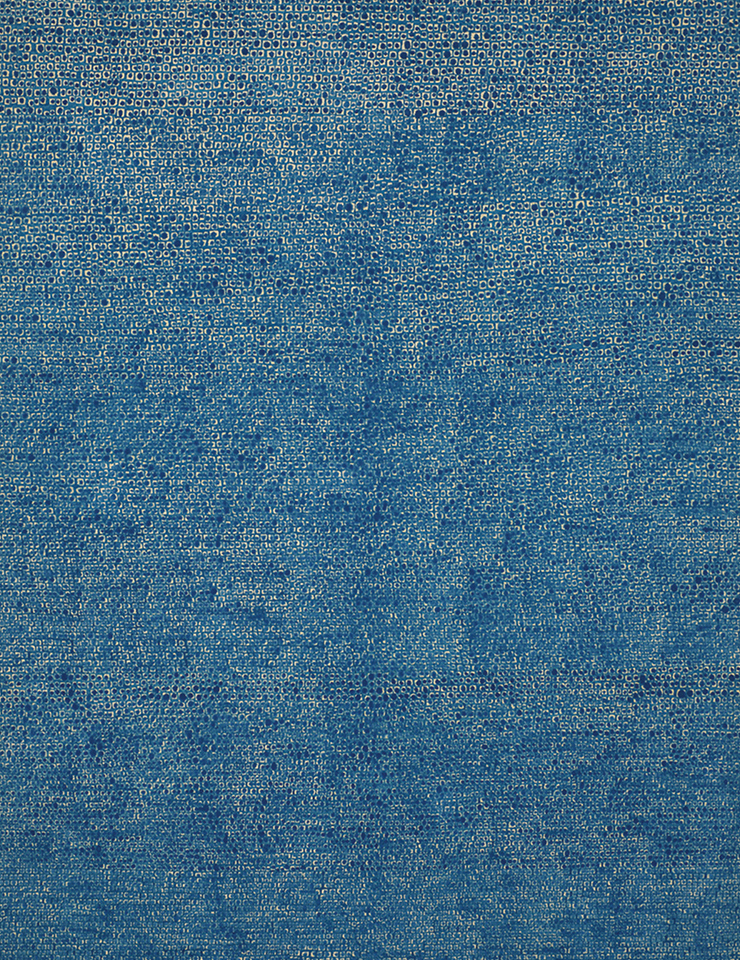‘돔 펜스터(Dom Fenster)’는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손된 쾰른 대성당 남쪽 측랑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디자인 작업을 요청받아 진행한 작품이다. 중세시대 창문에 쓰던 72가지 색채로 제작된 1만1500장의 수공예 유리면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접한 리히터의 4900가지 색채 모티프가 된 원작이기도 한 돔 펜스터를 실제로 마주한 그날은 비가 오는 흐린 날씨였다. 작품 앞에 머무른 길지 않은 시간 중 잠시 해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찰나, 다채로운 유리면 너머의 자연광이 맞은편 벽에 그려낸 색채 조합은 가히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로운 경지였다. 우리 삶처럼 우연한 만남으로 점철된 다양한 색채 조합에서 그 어떤 위계질서도 없는 색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됐다.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교육받은 리히터는 한 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사진과 회화, 추상과 구상, 채색과 단색의 경계를 넘나들며 방대한 작업을 선보여왔음에도 이 작품의 색상을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배열했다. 여섯 개의 구획으로 나뉜 유리창에 배열된 색채는 데칼코마니와 같다. 우연과 통제가 결합해 빚어낸 정돈된 색채의 카오스 속에 풍요로움을 담고 있다. 리히터가 추구한 평등한 색채 언어를 감상하다 보면 색상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72가지 다양한 색상이 뒤섞였으나 결코 색채의 소음은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작품을 앞에 두고 너무도 다른 우리 모두가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좋은 방법 역시 존재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보았다.
미술 애호가 황다나 DOM FENSTER’(2007), GERHARD RICHTER
직업상 수많은 작품을 본다. 어떤 작품은 지적으로 사유하게 하고, 어떤 작품은 체험으로 감각을 확장시킨다. 가끔은 현재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작품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는데 이 작품이 그랬다. ‘더프리뷰 성수’를 준비하던 중 참가 갤러리가 제출한 이미지로 처음 접했다. 보자마자 강렬함에 휩싸여 곧바로 구매했다. ‘15×15cm’의 작은 그림. 그럼에도 캔버스 가득 흘러넘치는 감정의 기류. 반짝이며 쏟아지는 눈물은 어둠과 대비되어 강렬함을, 작품을 뒤덮은 듯한 미끈한 끈적임도 남긴다. 오롯이 전해지는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고,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아이러니한 감정.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란 메시지도 좋다. 눈물을 참으려 눈을 치켜뜬 경험이 있다면, 울면서 주먹을 불끈 쥔 경험이 있다면 공감할 테다. 비극에도 희망이 존재하고, 넘치는 슬픔에도 반짝이는 순간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트미츠라이프 공동대표 이미림 TWINKLE THINGS_#4’(2020), ZELDA KIN
줄곧 윤형근의 작품세계와 삶에서 많은 영감과 위로를 받고 있다. 윤형근의 그림을 10년 단위로 나누면 70년대는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78년 작 4호 소품을 본 순간 작은 화폭에 응축된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다. 작가 스스로 ‘천지문’이라고 밝힌 작품의 특성이 형태적으로나 색감적으로 잘 드러나 두 개의 기둥 사이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최근 PKM갤러리에서 펴낸 <윤형근의 기록>은 그의 간단한 일기나 메모 등을 묶어 발행한 책인데, 삶을 향한 윤형근만의 태도가 담백하게 녹아 있다. 작품에서 느껴진 기품 있는 에너지와 책을 통해 알게 된 삶의 면면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사실에서도 압도적 감동을 느꼈다. 윤형근은 말년이 된 2000년대에 도널드 저드를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후의 작품들은 더욱 미니멀하게 변화했다고 한다. 작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미 완성형이 된 후기 작업세계에서 한없이 열린 태도로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은 예술가의 존재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포토그래퍼 목정욱 UMBER-BLUE’(1978), YUN HYONG KEUN
김환기 화백이 얼마나 거장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 전무했던 때. 환기미술관을 천천히 거닐다 덜컥, 이 작품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2m가 훌쩍 넘는 작품의 크기를 가늠하며, 작가가 어떻게 이 그림을 완성했을지 상상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연작인 이 작품은 김환기 화백이 1970년대에 뉴욕에서 머물며 완성한 것. 고국에 그리움과 애틋함을 그린 작품이다. 당시 그는 선과 면, 점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갔는데,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점 형태를 그리고 채우는 방식으로 그렸다. 파란 배경에 찍힌 검은 점을 하나씩 들여다보는데 묘하게 슬픈 감정이 휘몰아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슬프면서도 작품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다. 제목은 절친했던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을 따왔다. 그가 점 하나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채웠을지 헤아려보니 그림 앞에서 느낀 슬픈 감정의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만든 것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 글이나 말이 아니어도 그림을 통해 만든 이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체감한 순간.
브랜드 아트 디렉터 박선아 10-Ⅷ-70 #185’(1970), WHAN KI KIM
‘아트 러버’라면 누구든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는 도시. 2019년 남편과 떠난 첫 뉴욕 여행 중 현대미술관 ‘스컬프처 센터’에서 작품과 조우했다. 멀리서 볼 땐 그저 나무를 알록달록하게 그린 건가 싶었는데, 가까이서 본 작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사진을 기반으로 아크릴판과 정사각형으로 색인화된 숫자가 격자 무늬를 그리는 독특한 형식. 친숙하고 편안한 존재인 나무의 실루엣을 도면화하고, 그 위에 개체를 쌓아 올림으로써 존재를 해체하고 새로운 객체로 구현한다. 나무를 통해 현실과 표현의 경계를 드러낸 작품은 세상과 사물의 민낯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일깨운다. 예술인문학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극. 여전히 내게 꽤 어려운 현대미술. 그럼에도 이 여정을 탐구해 나가는 일은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에이트 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 정다희 NUMBERS AND TREES: CENTRAL PARK SERIES II: TREE #7 LAUREL’(2016), CHARLES GAINES
스스로 정의하는 집의 의미는 쉼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다. 정신없는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 소파에 앉은 채 이 작품과 마주하면 극도의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닫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평소 자주 들르는 가구점 원오디너리맨션에서 작가의 전시 <A Bit of Me-Time> 소식을 듣고 운명처럼 만났다. 어느 한적한 스튜디오를 떠올리게 만드는 너른 여백과 녹음이 우거진 배경이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의자나 소파처럼 작은 가구들은 물론, 그보다 더 작은 사람과 동물이 키치하게 얽힌 모습은 ‘풋’ 하고 웃음을 유도하기도. 이지은 작가의 그림은 늘 관람자를 아름다운 고요 속으로 초대한다. 빌딩들로 가득한 도시에서의 해방이다. 내가 소장한 그림은 대부분 추상화지만, 처음으로 구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단숨에 휩싸일 만큼 매력적인 파동. 이 고요한 파동은 어느새 내면까지 잠식했나 보다. 그림을 소장한 이후로 의상 디자인 곳곳에 파스텔적 영감들을 투영하기 시작했다.
파인드폼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예슬 THE STUDIO OF LIFE’(2022), LEE JI EUN
미술계 최전선에서 물어온 박씨를 쓱싹쓱싹 잘라 매달 책을 만든다. 미술로 밥을 빌어먹고 살다 보면 작품 앞에서 혓바닥만 길어진다. 이동훈의 조각 역시 이론적으로 뜯어볼 여지가 많지만, 다 제쳐두고 끌리게 된 구석을 말하자면 단지 ‘예쁘니까!’ 결국 혓바닥보다 눈이 즐거우면 장땡이란 소리다. 보자마자 당장 집으로 업어가고 싶은 작품이었다. 사실 나는 ‘회화파’다. 이제껏 좋아한 작품은 모두 회화였고, 조각을 보면서는 미술사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유할 뿐 예쁘다는 ‘감각’을 느낀 적은 없다. 이동훈의 작품은 나조차 몰랐던 내면의 두 가지 감각을 일깨웠다. 조각도 내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꽃을 꽤 좋아한다는 것. <화병>은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은 자태만으로도 마음을 뒤흔들지만, 나는 조각칼이 나무 위에서 울퉁불퉁 춤춘 흔적을 따라가는 일이 더 짜릿하다. 여기에는 <화병>을 완성하기까지 작가가 오랜 시간 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고 단단한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낸 섬세함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작고 약한 꽃을 얼마나 아껴 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애썼을지 눈으로 따라가면 덩달아 뭉클해진다.
<아트인컬처> 수석기자 이현 ‘화병’(2020), RHEE DONG 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