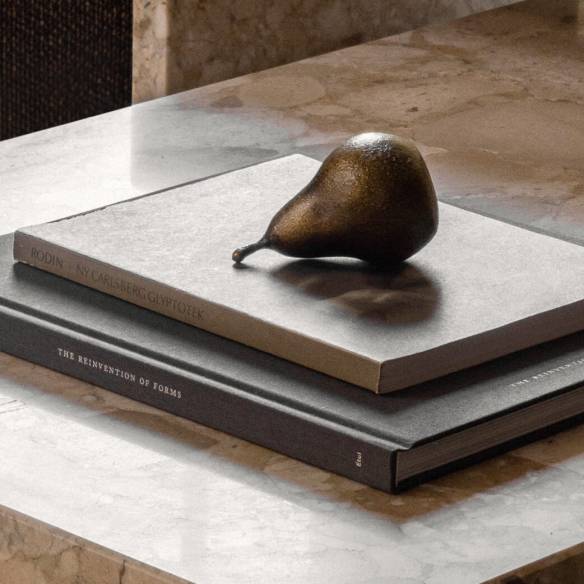단 하나의 조명을 택하라면 바로 이것
작가 윤광준의 취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오브제.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밤은 캄캄하다. 하지만 캄캄한 밤을 겪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은 서둘러 불 밝혀 낮과 밤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온전한 어둠을 맞이하기 위해선 특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다. 밤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을 날아본 적 있다. 바다에 점점이 박혀 있는 섬조차 밝은 빛을 내는 전구를 켜놓은 듯했다. 당연한 어둠을 기대했던 나는 당혹스러웠다. 과잉의 시대가 보여주는 어둠의 역설을 우리는 매일 겪으며 산다. 집 안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일부러 조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실내 공간은 밝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박힌 전등의 개수와 크기 탓이다. 난 어둡게 살기로 작정했다. 조명이란 주변을 밝히는 게 아니라 주위보다 밝은 상태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다. 어둠 속에 켜진 촛불을 어둡게 느끼지 못하듯.

아물레또 조명
가구를 바꾸기보다 좋은 조명을 두는 것이 공간 분위기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부분 조명’이 내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다. 최소한의 필요 광량으로 작업대나 테이블, 벽을 비추는 조명 기구가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도구는 사용하는 시간보다 그냥 놓여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크기와 형태, 재질과 색깔 등으로 나름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그에 걸맞은 물건을 찾아내는 건 어렵다. 크기는 적당한데 재질감이 영 아닌 것도 많고, 굵고 어지럽게 늘어진 전선이 눈에 거슬리기도 한다. 멋진 디자인의 조명은 많지만, 마음을 흔들 만큼 강렬한 물건은 흔치 않다. 조명 기구는 실제 써봐야만 알게 되는 것이 꽤 많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형태와 성능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 빛을 일상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르다. 모닥불에서 가스와 양초로, 다시 전구에서 LED로 조명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주류인 LED를 써야 하는 현재의 조명 디자인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비슷해졌다. 광원이 디자인을 결정하게 된 까닭이다. 납작하거나, 길게 이어진 형태이거나, 기존 반사갓에 LED만 교체한 것이 많다.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아물레또(Amuleto)’를 처음 본 순간의 놀라움을 잊지 않고 있다. 디자인 잡지 <도무스 Domus> 편집장을 두 번이나 지낸 백전노장 멘디니는 만년에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디자이너로서 역량이 돋보이는 걸작 와인 따개 ‘안나G’를 만들기도 했다. 라문(Ramun)이라는 회사를 차려 만든 첫 조명이 아물레또다. 머리와 관절, 받침대까지 세 개의 원 구조로 만들어진 아물레또는 지금까지의 조명 디자인과는 달랐다. LED라는 새로운 광원의 활용법을 극대화한 듯했다. 낮은 전압으로 구동되는 특성은 전선을 파이프 안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조명의 관절 구조를 원형으로 바꿔버렸다. 묵직한 받침대 내부엔 정교한 컨트롤러가 내장돼 단계 없이 자유롭게 밝기를 조절한다. 튀어나온 부분 없이 매끈한 몸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눈과 태양 그리고 달을 상징하는 원, 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뿐이다.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막상 구현하기 어려운, 형태와 기능의 균형 잡힌 동거가 아름답다. 빛을 내는 헤드와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인다. 빛의 방향이 마음대로 조절되는 건 물론이다. 아물레또의 좋은 점은 서른여섯 개의 LED 모듈이 원형으로 고르게 분산돼 빛이 부드럽게 퍼진다는 것이다. 의료용 수준의 광질을 갖춰 눈의 피로감이 적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조명 밑에서 일하다가 아물레또의 불빛을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아물레또가 슬그머니 내 작업 테이블에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연 대표적 디자이너다. 색채마저 지운 기능주의 디자인이 모더니즘의 특성이라면, 멘디니는 ‘장식이 왜 나빠?’를 주장하는 모더니스트였다. 과거를 부정하는 대신 ‘화해와 공존의 리디자인’을 펼친 그의 행보를 보면 쉽게 수긍이 된다. 그가 지은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미술관이나 현란한 색채의 거대한 프루스트 의자를 보고 모더니즘 이후 그의 방향과 선택을 읽었다. 멘디니 특유의 건축 언어에서 비롯된 듯한 반듯함과 따뜻한 인간성의 표출인 색채의 결합이 바로 아물레또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지만 정제된 조형미를 지닌 일상의 사물이다. 나의 선택은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들어간 ‘트리니티(Trinity)’다. 원과 색채의 상징이 세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조명은 기능이 아닌 감정이라서 불을 켠다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멘디니의 말에 따르면 조명을 켜는 건 감정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매일 켜고 끄는 아물레또가 점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10년째 쓰고 있는 조명은 전혀 낡은 느낌이 없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디자인이라면 나만의 클래식으로 충분하다. 책상 위에 놓인 아물레또 트리니티는 이제 내 취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오브제가 됐다.
윤광준
작가.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 <심미안 수업> <정원의 황홀>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Credit
- 에디터 윤정훈
- 글 윤광준
- 아트 디자이너 김강아
- 디지털 디자이너 오주영
엘르 비디오
엘르와 만난 스타들의 더 많은 이야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