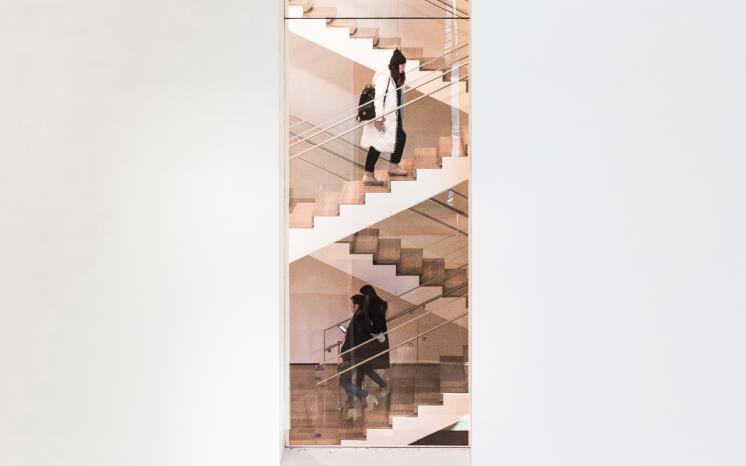SOCIETY
파이어족,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_돈쓸신잡 #22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unsplash
파이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90년대 미국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파이어족이 주목받은 건2008년부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다. 이 위기를 목격한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세상이 무너질 수 있음을 무섭게 체감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야겠다고 다짐했다.
파이어 트렌드는 대한민국에도 상륙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재테크에 눈을 뜬 MZ세대는 월급만 받아서는 답이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회사가 세상의 전부는 아냐’라는 생각은 코로나 이전부터 했겠지만, 이젠 회사 바깥 삶에 대해 진지하게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물론 파이어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험난한 길이다.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은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한 번쯤 냉정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꼭 파이어라는 꿈이 없어도 중요하다. 정년까지 꽉꽉 채워 수십 년을 일했는데도, 막상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렇기에 조기 은퇴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파이어족의 경제관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절약은 기본
」
unsplash
누군가는 이런 절약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티끌 모아 티끌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 하루에 커피를 2잔 마시는 사람이 1잔만 줄여도 하루에 4000원은 아낀다. 요즘엔 저가 커피도 많이 나왔으니 3000원이라고 치자. 한 달이면 반올림해서 10만원이다.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다. 물론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에이, 그래도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아?’ 물론, 괜찮다. 커피 한잔 마신다고 가세가 기울진 않는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파이어족이다. 남들보다 20년 이상 빠르게 은퇴하는 사람들은 매우 희소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희소한 노력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정도는 써도 돼, 괜찮아’라고 말하는 지출을 그들은 괜찮지 않게 여긴다.
「
문제는 절약은 단지 기본이라는 거다. 기본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소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다. 노동소득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다.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대표적인 노동소득이다. 부업을 통한 소득도 내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했기에 노동소득으로 봐야 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
」물론 노동소득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이 소득은 언젠간 0이 되기 때문이다. 연봉을 5천만원을 받든 1억원을 받은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노동소득은 0이 된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어떤가. 이 소득에는 정년이 없다. 대표적인 자본소득은 부동산과 주식이다. 이 자본을 들고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와 배당금이 들어온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파이어족이 되려면 내가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절약 해서 이 돈을 꾸준히 자본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자본들은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계속 일을 한다. 마치 손오공이 자신을 대신해서 적과 싸워줄 분신들을 만들어내듯, 파이어족 역시 본인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해줄 자본을 수집한다. 주식 한 주를 사더라도 ‘자본을 모은다’라는 마음을 갖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부화뇌동하지 않고 오래 투자 한다.
「
시간을 산다는 감각
」
unsplash
파이어족은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상위에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기를 쓰고 남들보다 일찍 은퇴하려는 이유도 결국 시간 때문이다.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고 조율하면서 살기 위해선 시간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소득이 필요하다.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을 지탱해줄 자본이 있어야만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물론, 파이어족 트렌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은 “사람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이지만, 일로 얻을 수 있는 건 돈 외에도 더 있다. 성취감, 자아실현, 문제해결 능력 향상, 타인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 등등.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일을 안 할까? 아니다. 일은 직장 바깥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파이어에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저는 이제 그냥 마음 놓고 놀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회사에서 나오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꽤 열심히 한다. 그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직장 다닐 때의 수입을 추월한 사람도 많다. 물론, 이미 자본소득을 갖춰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하진 않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느긋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파이어족이 꿈꾸는 미래다.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상
」누구나 파이어가 될 필요는 없고, 될 수도 없다. 개인의 선택이다. 여러 형태의 삶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꼭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본소득의 중요함과 회사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 어차피 조기 은퇴를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우리는 언젠간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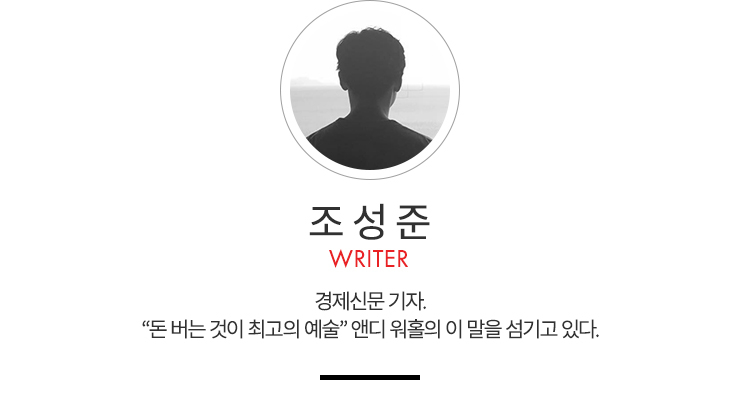
Credit
- 글 조성준
- 에디터 김초혜
엘르 비디오
엘르와 만난 스타들의 더 많은 이야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