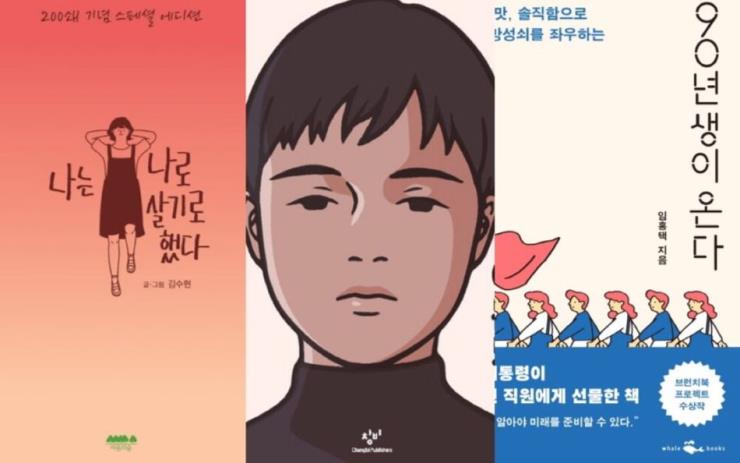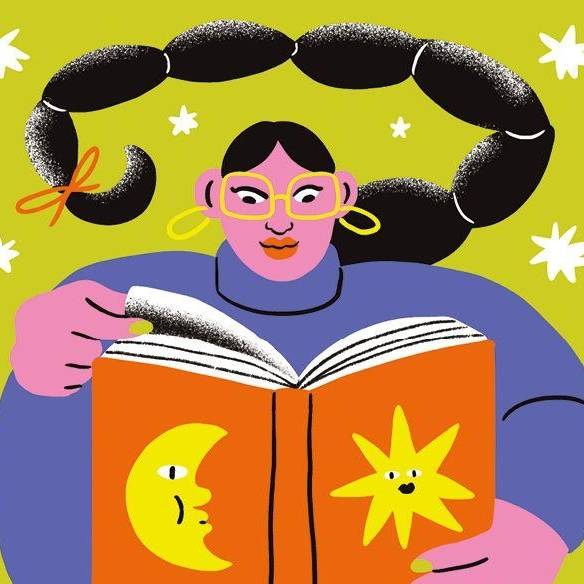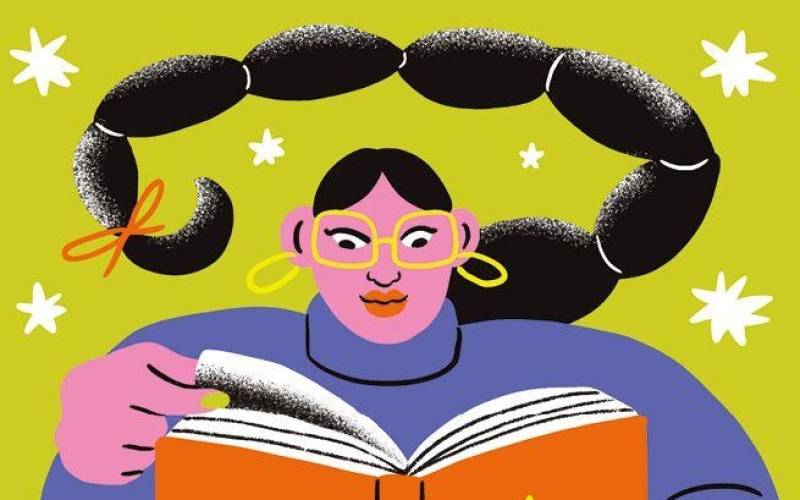CULTURE
90년생 조각가 현남이 보여주는 조각의 NEXT LEVEL!
아틀리에 에르메스에 펼쳐진 뒤얽힌 색채의 조각. 조각가 현남이 감각한 오늘의 세계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앞에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연상하게 됐다. 가장 흥미로운 실마리는 조각을 전공하지 않은 조각가가 ‘핑크 비즈니스’라는 밴드로 앰비언트와 노이즈 음악을 했다는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밴드를 했다. 록 음악 위주였는데 점차 그런 연주들이 지겨워지면서 음악보다 기타 이펙터나 앰프 같은 전자 장비들과 소리에 관심이 갔다. 전기 신호와 소리 자체를 물질로 다루는 감각이 재미있었달까. 회로를 고장 내거나 볼륨을 키워 왜곡하는 등 그때 소리를 다뤘던 감각을 바탕으로 조각 재료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왔다.
폴리스티렌, 에폭시, 시멘트 등 조각에 사용한 재료 모두 건축 자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물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재료를 조각에 담은 이유는
모두 보편적이고 편하고 값싸기에 현대에는 물성에 대한 탐구 없이, 고민하지 않고 쓰여왔다. 그러나 이 재료들 역시 녹거나 끓거나 서로 붙들거나 부서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성질에 따른 재료들의 고유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현대적이고 화학적이고 인스턴트한 재료라는 성질 역시 오늘의 세계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하얀 기둥 위에 올린 조각들이 눈에 띈다. 수석이나 분재 등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수집 문화에서 사용하던 ‘축경’이라는 개념에 착안해 조각으로 풍경을 보여주려 했다고
돌덩어리 하나를 좌대 위에 올리고 그 돌 속에서 산이나 강, 구름이나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수석 아닌가. 자연 속에서 풍화되고 침식되는 물질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사물이 신기하게도 그것이 속한 산이나 강, 바다의 형태를 담아내니까. 지금의 세계를 축경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덩어리에 굴 같은 구멍을 파고 폴리스티렌 등 유동성을 가진 재료를 부어 넣어 굳힌 뒤 틀을 제거해 완성한 조각이다. 작가의 의도대로 완성할 수 없고, 우연성에 상당 부분 기댄 작업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굴을 파서 작업하게 된 계기 자체는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 이슈가 터졌을 때,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설명을 읽어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그 정체를 이미지적으로 계속 상상하면서 채굴 방식으로 조각 작업을 시작한 거다. 비트코인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비밀스러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개념들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채굴 방식으로 작업할 때, 나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다.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를 자유롭게 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다.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멍만 보고 있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
관객이 이곳에서 무엇을 목격했으면 좋겠는가
시대와 상호작용하고 현재에 반응하는 조각. 업데이트된, 새로운 형태의 조각이 보이길 바란다.
Credit
- 에디터 이경진
- 사진 이우정
- 디자인 민현지
엘르 비디오
엘르와 만난 스타들의 더 많은 이야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엘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