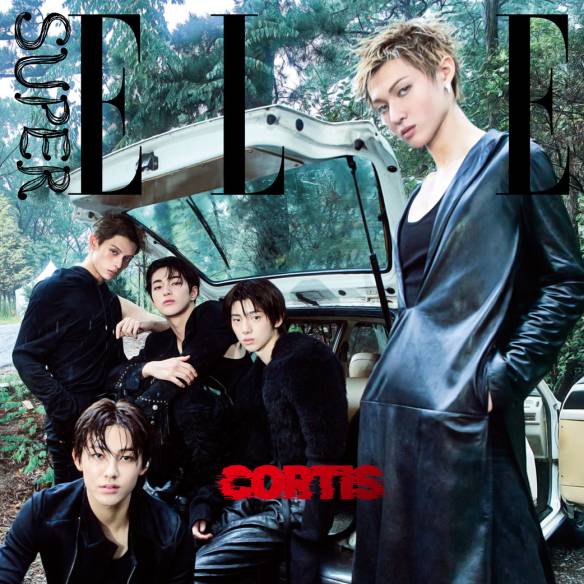몇 년전 잡지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가 기억난다. 이름은 ‘거꾸로 해도 이현이’. 직선적이고 탄탄한 몸, 뷰티 모델로도 손색 없는 매끄러운 피부. 쌍꺼풀 없이 유난히 긴 눈과 두드러진 광대뼈는 동양적이면서도 샤프한 턱선과 오똑한 코,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구적이랄까. 그 오묘한 조합 때문인지, 독특했다.
트레이닝복, 후드티와 점퍼 차림으로 서울 컬렉션 백스테이지를 돌아다니던 ‘뭣 모르던’ 신인 시절이 까마득해졌다. 쌓아온 것도 생겼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다. 2005년 수퍼모델 대회로 데뷔해 벌써 7년 차. ‘한번에 확 뜨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국내 패션지와 광고계를 섭렵해온 케이스다. 3년 전부터는 베이비 팻을 시작으로 드리스 반 노튼, 안나 수이, 모스키노, 에르메스, 샤넬 등의 쇼에서 뉴욕과 밀라노, 파리의 런웨이를 누볐다. 맥의 월드와이드 광고에 그녀의 얼굴이 등장했고 최근 스티븐 마이젤과 화보도 찍었다. MC로서 엘르 엣티비 채널의 를 진행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모델을 꿈꾼 건 아니에요. 패션지는 본 적도 없었고요. 대학교 때 연극을 하는데, 무대에 서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에요. 관객 모두가 무대 위의 날 바라보는. 모델이 딱이다 싶었죠.”
모든 스트레스와 좌절, 외국 생활의 외로움과 인종을 초월하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면서 모델을 계속 하는 이유를 물었다. 대답은 하나, 런웨이였다. ‘지금의 모델 이현이’를 정의해보라 했다. “고민하고 있는 모델? 아, 이렇게 써주세요. ‘아직 정의할 수 없다.’ 멋있게. 하하. 선배들이 각각 빨주노초파남보 중의 어떤 색깔을 떠오르게 한다면 전 그녀들이 가져가지 않은 나머지 색깔 중의 하나를 찾고 싶어요. ‘이거 하면 이현이가 최고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롤모델은 윤주 언니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빨주노초파남보만 색인가, 투명한 색도 색이고 무색도 색이지. 얼마 뒤 사무실로 사진이 도착했다. 아차. 내가 몇 시간 동안 촬영장에서 찾아다닌 ‘진짜 이현이’가 사진에 들어 있었다. 우월한 유전자를 경험과 시간이 다듬어 완성한 몸,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엣지와 ‘모델스러움’. 온몸에 엣지가 깃든 그 모습 그대로, 그날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현이를 만나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