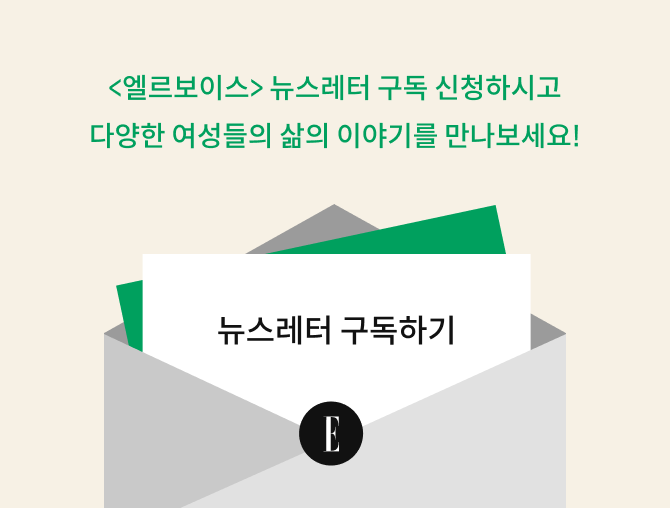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일하는 여성의 금주 도전기
2020.01.16

정작 음주를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개 친절한 얼굴로 “응원한다”고 해줬다. 간혹 “그러지 말고 그냥 마셔”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오히려 솟아오르는 반감에 고개를 가로젓기가 쉬웠다. 못 견디고 포기한 건 순전히 내 불안감 탓이다. 흐트러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맨 정신이니 대화가 미묘하게 엇박자를 냈다. “먼저 들어가, 우리끼리 딱 한 잔만 더 하고 갈게”라는 말을 초저녁부터 들었다. 사람들을 뒤로하고 밤 10시쯤 먼저 집으로 가는 것이, 첫 일주일 정도는 상쾌했지만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찝찝해졌다. 어렵게 잡은 약속인데 이렇게 맹숭맹숭 끝나서야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래서 3주 만에 접은 것이다. 다시 전처럼 열심히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내 불안감이 아주 근거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8명을 뽑아야 되는데 최종 올라온 1등부터 12등까지 죄다 여자야. 면접에서도 남자 놈들은 말도 못 하고 아주 형편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 현업 부서에서 절반 이상은 무조건 남자 달라고 난리인데. 면접관들에게 무조건 남자애들 점수 두 배로 막 주라고 했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애들이 뽑아놓으면 처음에는 일을 잘해. 그런데 하나같이 총기가 사라지는 시기가 있어. 결혼하고, 임신 전후가 되면 예외 없이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 야.” 한국인의 ‘사회생활’이란 것이 술 문화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신·육아 등으로 강제 금주 기간을 갖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 년 전 은행권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고의로 낮춰 떨어트린 행태가 대규모로 적발돼 기소된 적 있다. 임원들은 “왜 재수 없게 우리만 걸렸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자신도 모르게 채용 기회를 빼앗긴 여성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정부가 ‘폭음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실태와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라 한다. 성인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남성 기준 소주 7잔, 여성 기준 5잔 이상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마시는 비율)이 19.9%(2005년)에서 20.8%(2018년)로 소폭 증가하는 사이 성인 여성은 3.4%에서 8.4%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웃음이 나왔다. 늘어봐야 여전히 남성의 절반 이하이고, 그나마도 직장에서는 “전투력이 없어 못 쓰겠다”는 말을 듣고 있다. 여성의 폭음 원인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폭음 문화 자체를 바꿔나갈 방법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새해에도 금주를 다짐해 본다.
Writer 심수미 제48회 한국기자상 대상, 제14회 여기자상을 휩쓴 JTBC 기자. 30여 년간 인권 사각지대를 취재한 수 로이드 로버츠의 책 <여자 전쟁>을 번역하기도 한 그는 더 많은 여성 동료들이 함께 일하며 버텨내길 바란다.
Writer
심수미
제48회 한국기자상 대상과 제14회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JTBC 사회부 기자. 30여 년간 인권의 사각지대를 취재한 수 로이드 로버츠의 〈여자 전쟁〉을 번역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전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