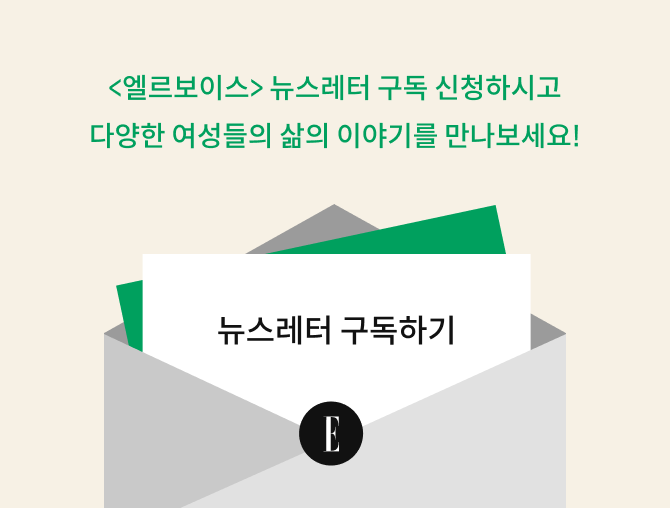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우리가 범죄를 이야기할 때
2020.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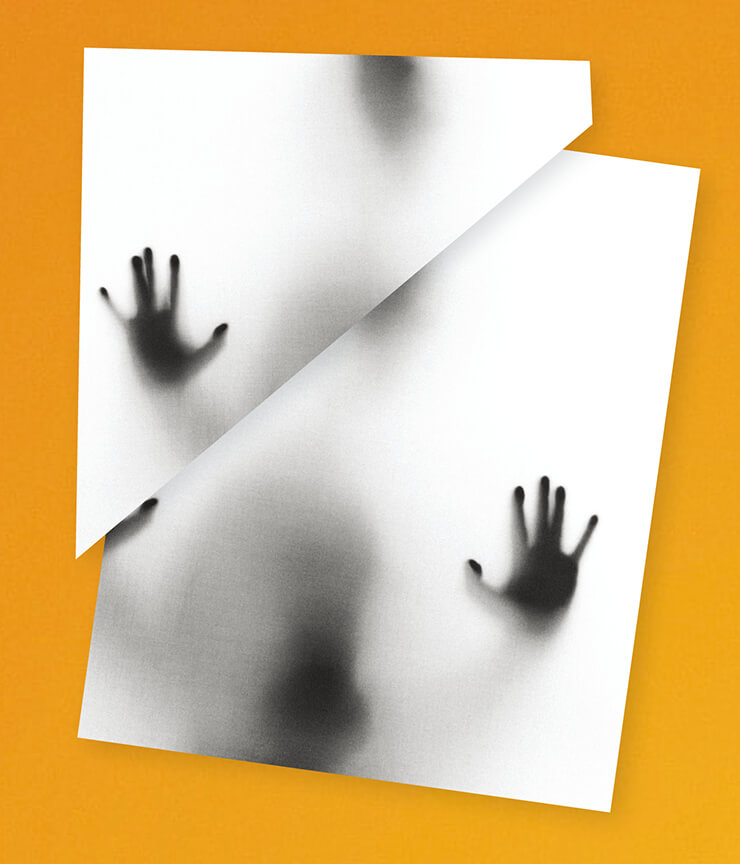
판사 출신이던 남성이 쓴 책을 읽은 적 있다. 버스 옆자리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됐던 사건을 회상하며 그는 ‘50대 총각’인 피고인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멋을 내고 법정에 출두했는지, 얼마나 어설프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흥미진진하게 묘사했다. 노모가 방청석에 앉아 눈물 짓던 장면에 이어, 그는 끝까지 잘못을 깨닫지 못한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글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분, 지금은 장가를 갔으려나.”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이 궁금했다. 생면부지의 나이 많은 남성에게 봉변을 당한 그 여성은 다시 버스를 탈 수 있었을까. 남성이 버스 옆자리에 앉을 때마다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성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들에겐 여성이 겪는 공포와 고통이 ‘남의 일’일 뿐이라서 설령 악의가 없더라도 쉽게 말하고 아무 때나 웃을 수 있으며, 자신은 그런 ‘나쁜 놈’과는 다르다고 믿기에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즈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수정·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이하 <범죄영화 프로파일>)을 만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친숙한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박사와 <씨네 21> 이다혜 기자가 진행하고, 제작진 전원이 여성인 이 프로그램은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분석한다. 하지만 방송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영화를 빌려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이를 방조하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이를테면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린 영화 <가스등 Gaslight>의 주인공 폴라가 결혼 후 집 안에 고립돼 강압적인 남편에게 맞춰가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상황을 ‘가정 폭력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는 식이다. 가스라이팅에서 가정 폭력, 가부장제의 본질과 한국 사회의 현실로 이어지는 대화의 흐름은 범죄를 관망하는 것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까지 나아간다. “폭력이 상존하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이수정 박사의 멘트가 인상적인 <적과의 동침> 편과 이어 들으면 더 좋은 <돌로레스 클레이본> 편까지 합친 ‘가정 폭력 3부작’은 온 국민의 의무교육 교재로 삼고 싶을 만큼 훌륭하다.
품위와 지성을 갖춘 두 여성이 분노하되 차분하게, 때로는 위트를 섞어 나누는 대화는 유의미한 동시에 정말 재미있다. 가정 폭력 문제와 더불어 이수정 박사의 분노가 최고에 다다를 때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를 이야기할 때다. 청소년 ‘가출팸’ 문제를 다룬 <꿈의 제인> 편을 비롯해 그는 틈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한다. ‘자발적으로’ 채팅 앱에 들어가 성인 남성을 따라갔으니 ‘성매매’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멜로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청소년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며 “굳이 전생의 연인이라는 설정을 넣은 게 이해되지 않아 소화불량이었다”는 이수정 박사의 거침없는 감상은 창작자의 윤리적 성찰이나 고민에 필요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범죄영화 프로파일>의 좋은 점은 그들이 웃을 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웃음에 담긴 분노와 자조, 슬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여성인 우리는 언제나 어떤 범죄를 ‘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범죄영화 프로파일>에서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는 어려운 결심 끝에 소송을 걸었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되자 자살 시도까지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박사님이 종종 같이 화를 내주실 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오디오 클립을 듣고 또 들을 정도로요.” 목이 멘 채 그의 고백을 읽던 이다혜 기자도, 멋쩍게 웃으려 애쓰던 이수정 박사도, 설거지하며 방송을 듣던 나도,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방송의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수정 박사의 말을 나는 종종 떠올린다. “우리는 연대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책 <괜찮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Writer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했다. 〈괜찮지 않습니다〉와 딩크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펴냈다.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
Category
Credit
- 글 최지은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