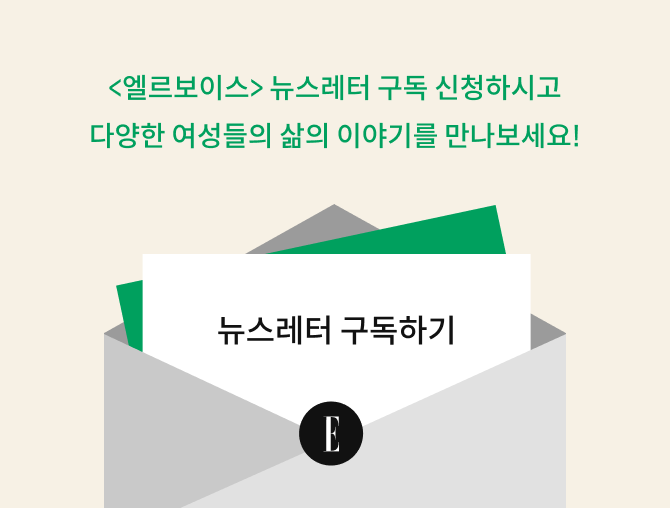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2019.12.26

할머니는 나를 키웠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의 잦은 병치레,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을 몇 번이나 지켜봤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인 침대에 몸을 욱여넣은 시간들은 할머니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떠올려봐도 지겹고 괴롭다. 그리고 딱 그만큼 나이 든다는 게 무섭다. 내게 ‘나이 듦’이란 타인을 괴롭히는 사무치도록 슬픈 것이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끔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딜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지금이야 재빠르게 뭐라도 잡았지만, 내 몸은 조금씩 느려질 테고 순발력도 사라지겠지. 지금은 잘 가는 매트리스 커버를 혼자서 갈다 허리를 다치겠지. 할머니의 노년을 지척에서 본 경험으로 비혼 길을 걷자니 일상에서 흔히 겪는 조그만 불편과 위험이 자꾸만 크게 다가온다. 무의식의 반영이었을까. 지난 몇 달간 산 책 중에서 유독 늙음과 죽음에 관련된 책이 많았다. 그러다 만난 게 와카타케 치사코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였다. 김민정 시인과 조남주 작가의 반짝이는 추천사보다 2017년 사상 최고령인 ‘63세’에 문예상을 받고 2018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 작가의 이력에 홀렸다. 책 소개에 ‘홀로 남겨진 늙은 여성이 고독과 외로움의 끝에서 눈부신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절절하면서도 통쾌하게 그려냈다’는 말이 있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주인공 모모코 씨의 독백으로 이뤄진다. 아내로 살며 고생했던 것, 어머니로 살며 희생했던 것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된 것. 평균적인 기혼 여성의 삶을 산 늙은 모모코 씨는 자아 충돌을 겪기도 하고, 어릴 때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기도, 혼자라는 사실에 몸부림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독백, 그러니까 들어줄 상대가 있는 대화가 아닌, 혼잣말이라는 게 가장 절절했다. 모모코 씨의 말을 강원도 사투리로 옮긴 정수윤 번역가는 역자 후기에 “이 책을 읽으며 계속 늙었다”고 썼다. 나도 그랬다.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콩을 뿌리는 모모코 씨의 모습을 보며 몸을 웅크린 채 함께 쪼그라들었다. 그의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이 주름처럼 겹겹이 쌓이는 것 같았다. “할멍이, 나 여 있아요. 할머니 손녀딸은 예서 이래 저물녘 하늘 보구 있아요. 내 이러 살아요. 이대루 갠찮나요”라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 마음을 널뛰게 했다.
‘엘더스피크(Elderspeak)’라는 단어가 있다. 노인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 하는 말투를 뜻한다. 왜 나이 든 사람에게 일부러 또박또박 느리고 크게 말하는 걸까. 세계적인 법철학자이자 여성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이런 현상이 “노인들은 일반적인 대화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통념에 기반한다”고 지적한다. 늙은 사람을 자신과 같은 집단이라 보지 않기에 차이를 만들고 선을 긋는 것이다. 모모코 씨는 사람들이 긋는 선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배제에 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를 먹었으면 응당 이렇게 처신해야지’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인간을 늙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나도 이런 실수를 곧잘 저질렀다. 경험도 해보지 못한 늙음을 멋대로 힘들고, 슬픈 문화라 규정해 버린 것이다. 노화한 육체는 당연히 멋대로 느려지겠지만,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는 건 작은 진실에 기반한 과한 상상일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어른에게 늙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한 적 있다. 그분이 말했다. “어차피 삶은 계속 불안해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국면이 불안이라면 그냥 지금을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모모코 씨도 말했다. “외부의 압박에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산다면 나는 의외로 가는 데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1954년생으로 현재 일흔을 바라보는 와카타케 치사코가 소설 작법을 배우기 시작한 건 50대 중반이었다. 와카타케 치사코는, 40대 주부로 등단한 고 박완서 작가는 나이 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알았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원하는 ‘늙음’을 위해 현재를 부단히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래, 모모코 씨도 나의 생은 이제부터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하물며 그 나이도 못 가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돌아보면 이보다 더 희망적인 말은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글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는 출판 편집자 조은혜. 좋은 사람은 못 돼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모토로 살아간다. 책과 여성의 삶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글을 쓴다.
Writer
조은혜
여성 생활 미디어 <핀치>에서 ‘애서발견’을 연재 중인 출판 편집자. 좋은 사람은 못 되어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Category
Credit
- 사진 Unsplash(Cristian Newman)
- 글 조은혜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