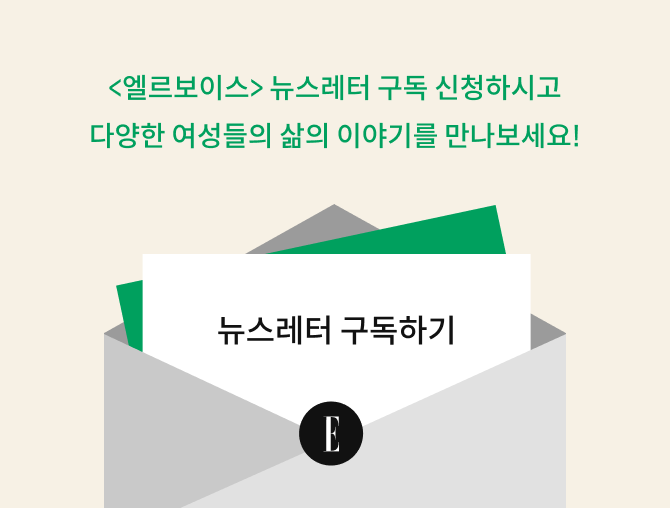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섹스가 '전복적'이라는 착각
2019.12.20

얼마 전 박나래의 스탠드업 코미디 <농염주의보>가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재능 있는 여성 코미디언의 도전과 성취에 보내는 박수와 별개로 말이다. 질문은 이것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섹스는 과연 전복적인가?’ ‘여자에게 섹스하라는 이야기가 새롭나?’ 여자친구끼리 모이는 자리엔 이미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황당한 ‘망한 섹스 썰’이 넘쳐난다. <섹스 앤 더 시티>가 고전이 된 지는 오래다.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이번 연말이 지나면 클럽에서, 틴더에서 만난 국경을 뛰어넘는 원 나잇 스토리가 또 수북하게 쌓일 것이다. 요즘 시대에 ‘여자도 섹스할 자유가 있다’는 말은 ‘여자는 꾸밀 자유가 있다’는 말처럼 감흥이 없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가 저항이고 섹스가 해방이었지만 지금은? “미역도 섹스를 한대….” 몇 년 전 케이블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속 대사다. 뒤에 생략된 말은 ‘섹스 안 하는 나는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다’일 테다. 연애와 결혼을 안 하면 어딘가 문제 있는 취급을 받는 것처럼 이젠 섹스를 안 해도 ‘비정상’ 라벨이 은근슬쩍 붙는다.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미역도 하고… 그럼 나도 해야 하는데!” 한국인을 빨리,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남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주면 된다. 그러면 특히나 부지런한 한국 여자들은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심지어 과감한 체위까지도!)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성애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TV를 켜면, 유튜브를 열면, 번화가를 걸으면 온 세상이 섹스하기를 권한다. 크로스 핏을 하러 가도, 독서 토론을 하러 가서도 만나는 거의 모든 이성을 잠재적 연애 상대, 섹스 상대로 가늠해 보는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진다. 나 역시 성애적 관계에 몰두한 시간이 길었다. 인간에게 그것만 한 엔터테인먼트가 없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돌아볼수록 의심이 든다. 정말 그랬나? 정말 섹스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나? 누구 하나라도 ‘우머나이저’급 쾌감을 준 적이 있었나? 여자 몸에 삽입 섹스가 안전하긴 한가? 종종 여자의 몫으로 남는 임신 부담은 어떻고? 내가 느껴온 짜릿함은 육체적 감각보다 남성을 애태우고 남성에게 욕망당하는 내 모습에 흥분한 것에 가까웠다. 어디선가 본 표정과 몸짓을 흉내 내면서. ‘쿨 걸’이라면 응당 섹스를 좋아하고 즐겨야 하니까.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거리의 수많은 커플을 볼 때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전도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묻고 싶다. “여성분들, 옆에 있는 남자와의 섹스가 정말 좋나요? 오르가슴을 느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주로 번식기에만 교미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해진 구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섹스를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섹스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며 권장한다. 하지만 여성은 자극과 번식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 섹스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가 원해서, 졸라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굳이 섹스에 응할 필요는 없다.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자괴감이나 자책감을 느낄 필요는 더더욱 없다. 결국 삽입 중심적인 섹스 문화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겐 먼저 상대를 성애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람으로, 동료 시민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얼마 전 림 킴이 ‘I am Unfuckable Creatu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을 때 탄성이 절로 나왔다. 여성을 섹스로 소비하는 세상에 한 방 먹이는 것. 지금 시대엔 이거야말로 전복적이지 않은가?
Writer 김진아
김진아는 광고,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다. 책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를 썼다. <뉴욕 타임스>에 서울의 페미니즘 공간으로 소개된 ‘울프소셜클럽’을 운영 중이다.
Writer
김진아
김진아는 광고,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다. 책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를 썼다. <뉴욕 타임스>에 서울의 페미니즘 공간으로 소개된 ‘울프소셜클럽’을 운영 중이다.
Category
Credit
- 글 김진아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전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