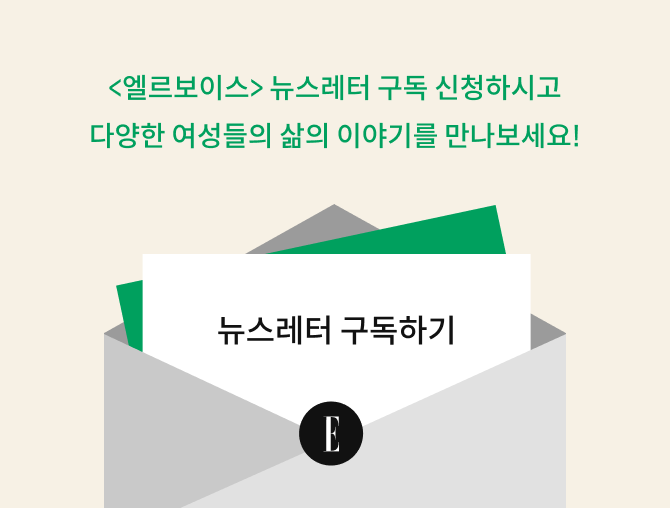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SBS 이은재 피디가 생각하는 '비혼'
2019.10.03

비혼의 아이콘이 돼버린 어느 비혼자의 외침
애초에 비혼을 ‘결심’하는 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혼 상태를 택한 데는 ‘결심’이란 단어보다 이런 말과 더 어울린다. ‘부지불식간에’ ‘시나브로’ ‘나도 모르게’.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퇴근하면 밥을 차려야 했고, 육아에 시달렸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져 일찍 퇴직했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린 건강과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혼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은 ‘한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그림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접적으로 ‘체득’한 상태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친구가, 그 어떤 미디어나 텍스트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쩌면 비혼과 저출산을 두고 쏟아지는 온갖 분석은 그 다음의 문제다. 비혼은 선택의 영역이다. 결혼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선택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선택의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하기 싫어서, 번거로운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또는 이성애적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기존 제도를 향한 비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하고 싶어서 등. 한국은 아직 결혼 문화 그 자체에 익숙하다. 20~30대 젊은이의 상당수 또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정 연령대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비혼(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자리 잡은 것 또한 최근 일이다) 상태인 이들을 가리켜 ‘결혼하지 못했다’는 실패의 뉘앙스에 가깝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비혼하겠다는 조카나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요?”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내게 던진 질문이다. 대답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다. ‘오늘 아침에 왜 고등어구이를 먹었니?’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혼이 아침 식사처럼 당연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비혼식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인터뷰하고, 비혼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반복하며 하나하나 설명하는 일은 2019년에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 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하는 태도가 ‘낡은 것’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이은재 SBS PD. 유튜브 콘텐츠 <문명특급> MC 혹은 ‘연반인 재재’로 좀 더 친근하다. 가볍고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세상에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자 한다.
Writer
재재
SBS PD. 유튜브 콘텐츠인 〈문명특급〉 MC 혹은 ‘연반인 재재’로 좀 더 친근하다. 가볍고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세상에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싶다.
Category
Credit
- 글 이은재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