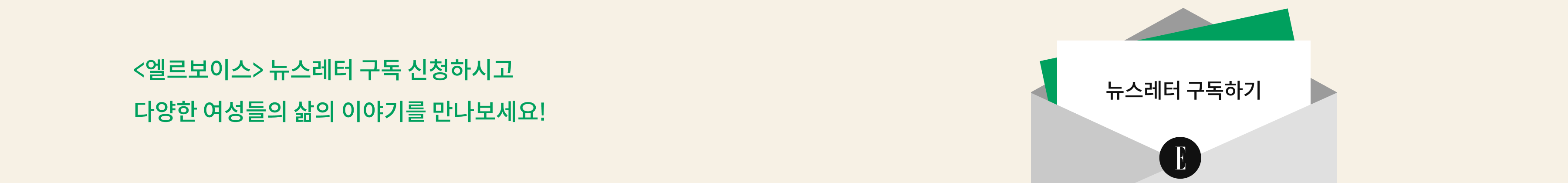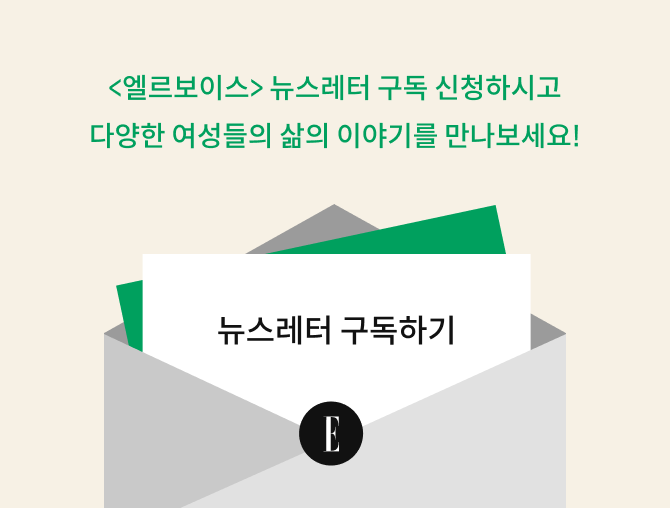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하나도 없는 엄마
2019.09.12

Photo by Mael BALLAND on Unsplash
우리 엄마는 부산에 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TV를 본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 아빠가 입고 갈 옷을 챙겨줬을 거다. 집 안 곳곳의 먼지를 털고 걸레로 방을 닦았을 것이고, 세탁기 버튼을 누른 뒤 귀찮다며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을 거다.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며 빨래를 넌 빈방에 선풍기를 돌렸을 테지. 엄마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답답했고, 짜증났고, 미웠다. 청소 하루 안 해도 괜찮다고 해도 청소기를 들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아빠의 밥그릇을 치우는 엄마. 집에만 가면 속이 터졌다. 늘 되새겼다. 엄마처럼 되면 안 돼. 엄마처럼 좁은 세계에 갇히면 안 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처럼 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엄마를 대하는 마음조차 차가워졌다. 회사니까, 쉬어야 되니까, 더우니까, 바쁘니까, 커피 마셔야 하니까. 별별 이유를 다 끌어모아 내가 닿은 곳은 ‘이따가’였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속상했던 때가 있었다. 방학이 끝날 즈음 서울에 가기 싫다고 울기도 했다. 엄마는 언제나 낭랑한 사투리로 내 전화를 기쁘게 받고, 내 안부를 묻고, 돋보기를 끼고 내가 만든 책을 읽어주는데, 나는 왜 엄마를 자꾸 ‘이따가’로 여길까. 밥 먹으란 말에도 이따가, 어디를 가자는 말에도 이따가…. 며칠 전은 엄마의 생일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빠도, 동생도 뒤늦게 엄마를 챙겼다. 그들에게도 엄마는 ‘이따가’였으니까. 생일만은 무시할 수 없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또 혼자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로 “안녀어어어어엉”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지난 생일을 기억해 봤다. 함께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관내분실’을 처음 읽은 날,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엄마의 우주에 틈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가 김치찌개를 좋아했던가?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지? 주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지? 여름이랑 겨울 중에 뭘 더 좋아하지? 엄마가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지? 오랫동안 떨어져 산 탓을 하기에도, 엄마의 표면조차 읽을 수 없었다. 모두에게 잊힌 엄마 생일에 김초엽의 소설집을 다시 펼쳤다. 지민처럼 ‘세계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를 상상했다. 내 세계에서 작은 파편으로 존재하는 엄마가, 내 삶에서는 조연에도 이름을 못 올리는 엄마가, 주인공이자 화자로 존재했던 시간을 그렸다. 눈부실 만큼 반짝거리는 엄마. 오로지 자신의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엄마.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천천하게 삶을 유영하는 엄마. 엄마가 아니었던 엄마. ‘누구보다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엄마를 찾아 기록하고, 볼 수 없는 엄마의 과거를 상상하다 보면 엄마가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의 삶을 상상으로 채울 수 없을 때는 내 하루에서 나를 잘라낸 뒤 엄마를 붙여 넣는다. 나도 결국 엄마의 얼굴을 나눠 가졌으니까. 엄마의 하루는 여전히 맘 아프고, 나는 여전히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앞으로도 연락은 뜸할 것이고 집에 가는 횟수는 더 줄어들 거다.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민이 엄마에게 했던 말을 나도 엄마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자주 잊히는 수많은 엄마를 생각하며, 내가 언젠가 전하고 싶은 이 구절을 옮긴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 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조은혜 여성 생활 미디어 <핀치>에서 ‘애서발견’을 연재 중인 출판 편집자. 좋은 사람은 못 되어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 'ELLE 보이스' 기사는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Writer
조은혜
여성 생활 미디어 <핀치>에서 ‘애서발견’을 연재 중인 출판 편집자. 좋은 사람은 못 되어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Category
Credit
- 글 조은혜
- 사진 Mael BALLAND on Unsplash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