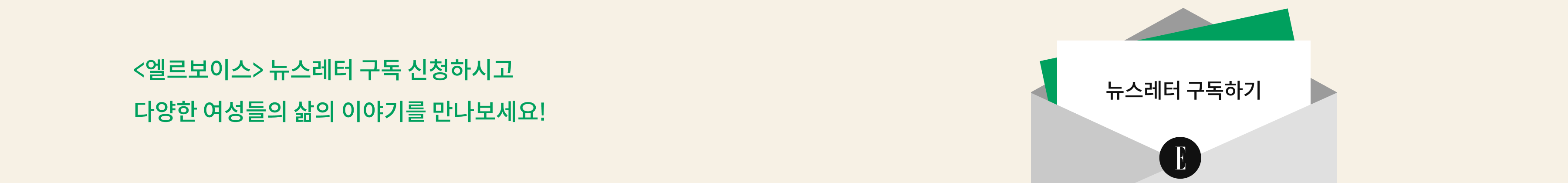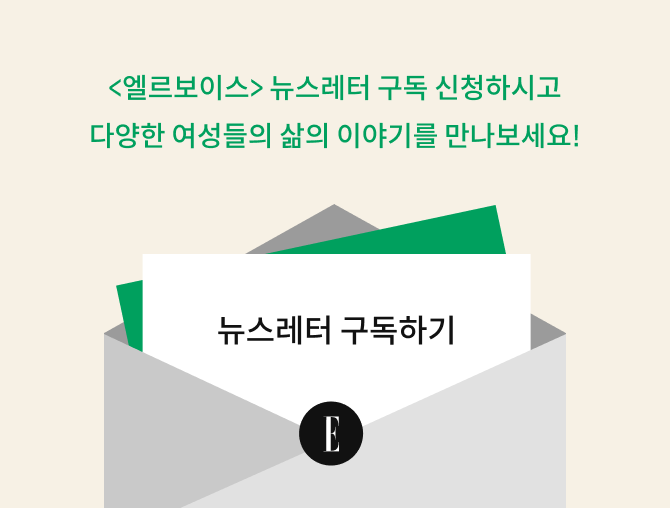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고통의 언어없이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21.11.16

최근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내가 가진 상처나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것.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다른 창작자들의 작품을 보며 은근슬쩍 부러워하기도 한다. 쓰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유기된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시글들. ‘안락사 직전’ ‘오늘 아니면 죽습니다’ 같은 문구 없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걸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전시된 가혹한 현실을 보며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진다.
동네 주변의 논밭길을 거닐다가 텅 빈 공장 앞에서 강아지 다섯 마리를 만났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강아지들은 반 평짜리 녹슨 철창 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직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집, 아스팔트 바닥엔 텅 빈 밥그릇과 물통만 있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게 뻔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 사료와 물을 가져와 채워주자 그릇은 순식간에 동났다. 곧 추석이었다. ‘연휴가 끝나면 견주가 오겠지. 그때까지 사료랑 물만 대충 챙겨주자.’ 생각하며 돌아섰지만, 며칠 동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다. 나는 애인과 네 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한 마리를 빼고는 전부 내가 사는 동네, 파주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은 네 마리가 최대치고(사실 이것도 버겁다!) 나와 애인은 그걸 알기에 서로 같은 말을 했다.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청에 신고하자.”
사료와 물을 채우자 아이들이 낑낑대며 울었다. 뒤돌아본 우리는 마음이 흔들렸다. 철창에 매달린 아이들 뒤로 보이는 네모난 집, 판판한 지붕 위는 배설물로 가득했다. 바닥이 있는데도 기어이 지붕 위로 올라가 용변을 보는 아이들. 밥그릇과 물통 옆은 깨끗했다. 애인은 말했다. “똥오줌 속에서 뒹굴고 싶지 않은 건 본능인가 봐.” 결국 아이들을 구조한 후 입양처를 알아보기로 했다.
다섯 마리를 욕조에 담그고 씻긴 뒤 밥을 주었다. 각자 밥그릇이 생겼는데도 서로의 것을 뺏기 바빴다. 채워주기 무섭게 물을 마시는 탓에 계속해서 물 쉬를 쌌다. 조그마한 우리 집 마당이 세상 전부라도 되는 양 뛰어다녔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보호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나 조급해졌다. 추석 연휴에 버려진 반려견만 2000여 마리. 보호소 어디에도 자리가 없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기간 동안 수입된 품종견이 1만 마리가 넘는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는 멍해졌다. 그동안 강아지를 구조한 뒤 내가 입양했을 뿐 임시 보호와 입양 과정을 거친 적이 없던 나는 이 세계를 몰랐다. SNS에 열심히 입양공고 게시물을 올렸지만, 업로드 후 1분만 지나도 해시태그 속 내 게시글은 저 밑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매우, 상상 그 이상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은 차고 넘쳤다.
동물보호단체 블로그에 사연을 신청하고 유기 동물 정보가 올라오는 애플리케이션 포인핸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자 괴로웠다. 오늘 구조된 동물과 입양률, 안락사율을 통계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었다. ‘보호처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에는 빨간색 SOS 표시와 함께 ‘안락사 위기’ ‘제발 살려주세요’ 등 나를 힘들게 했던 제목과 함께 엄청난 개체 수가 올라와 있었다. 그때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 좋은 반려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로또나 다름없겠구나. 아니, 입양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현실을 마주할수록 묘하게 차분해졌다. 체념했다고 해야 하나. 기다리고,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안락사되겠지. 그 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먹이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야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마음의 준비는 절로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주말, 기적이 일어났다. 지인 셋이 아이들을 입양한 것이다. 정신없이 생명의 은인들을 마주하고 또 아이들을 보내자 기분이 이상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입양되지 않는 아이는 옆집 개 ‘산타’ 어머니가 데려가겠다고 했다. 이게 뭐지. 얼떨떨한 마음은 지속됐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위대하게 느껴지며 온몸에 피가 돌았다. ‘아, 생명을 살렸다’ 같은….
불행과 고통을 전시하는 건 언뜻 가혹한 방법 같아 보인다. 하지만 당장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아득해진다. 그리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타자의 고통을 실감케 할 방법을 아직 나는 모른다. 아직 반려인을 찾지 못한 두 마리가 있다. 수많은 동물을 외면한 채 눈앞의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다. 일단 너네부터 살릴게. 그리고 내가 더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게. 오늘은 포인핸드에서 ‘개 농장에서의 끔찍한 죽음보다 안락사가 나으니 다행일까요? 이 아이에게 행복한 삶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라는 글을 봤다. 앱을 닫고, 앞에 있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우선은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백세희 10년 넘게 겪은 경도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만큼 동물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ELLE Voice’는 매달 여성이 바라본 세상을 여성의 목소리로 전하고자 합니다. 뮤지션 김사월 , 최지은 작가 등 각자의 명확한 시선을 가진 여성들의 글이 게재될 12월호도 기대해 주세요.
Writer
백세희
10년 넘게 겪은 경도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만큼 동물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민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