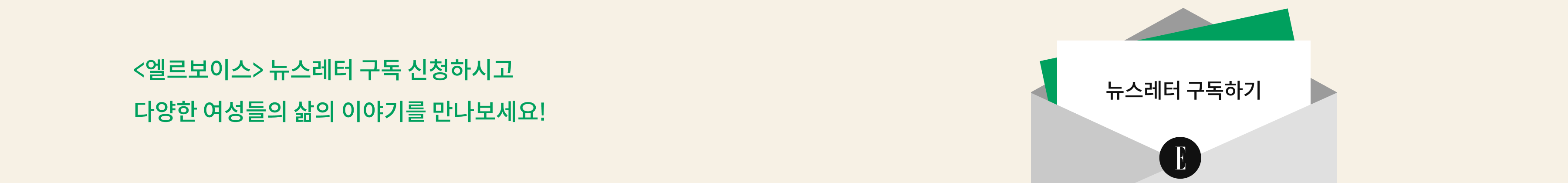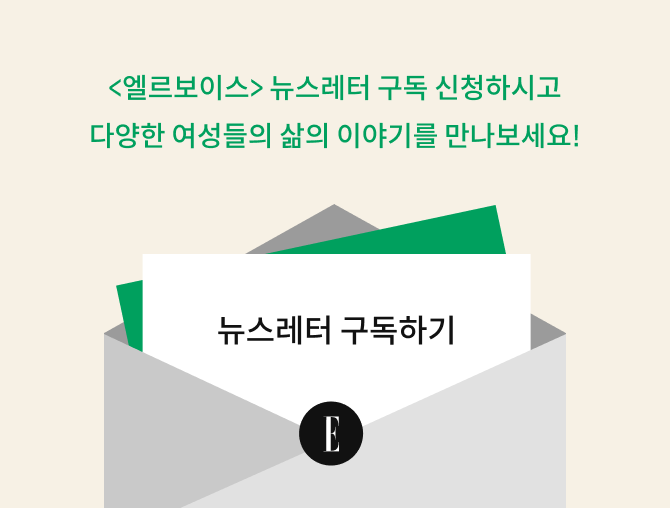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전원살이의 기쁨과 슬픔
2021.03.22

하루 두 번씩 산책하며 많은 개를 만났다. 줄에 묶여 있지 않았지만 마당 안에만 사는 듯한 시베리언 허스키와 골든 레트리버, 마을 입구에 있는 한 공장 앞에 묶여 사는 또 다른 레트리버 두 마리, 묶여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듯 잔뜩 엉킨 털의 개들. 모두 경계심이 강했고,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다. 그 개들이 불행하다는 건 눈으로는 물론 짖는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듯한 그 소리는 때로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쩔 땐 절규였으며, 때로는 지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산책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걸 2주 만에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빌라나 아파트에도 산책 한 번 못 한 채 갇혀 있는 개들이 많지만 적어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훤히 뚫린 마당 사이로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대로 지나쳐야 한다. 사모예드, 골든 레트리버, 시베리언 허스키, 보더콜리 등 마치 인테리어의 완성인 것 마냥 넓은 마당 한구석에 묶여 있는 개들을 구할 수도, 참견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건너편 집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보더콜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꼬물대는 아이는 너무나 귀여웠지만 곧 정황을 알게 됐다. 원래 선물 받은 보더콜리 두 마리를 마당에 묶어서 키웠던 견주가 둘이 새끼를 낳자 나머지 아이들을 친척에게 보내고 한 마리만 남겼다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은 보더콜리 두 마리가 산책도 없이 묶여만 지내니 짖는 소리가 엄청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고 했다. 고민 끝에 견주를 설득해 하루 한 번 산책을 맡기로 했다. 접종도 모두 마쳤다. 그 아이(보더콜리)는 정말 활발하고 착했으며, 결정적으로 똑똑했다. 호기심도 왕성하고 넘치는 에너지가 정말이지 보더콜리다웠다. 자라나는 아이와 동네도 돌고 훈련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치된 다른 개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와 산책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견주의 불안감은 커졌던 것 같다. 아이가 목줄만 풀면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오곤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견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제 오지 말아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마 아이는 전에 살던 개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목줄과 밥그릇, 장난감 따위를 곁에 두고 또 뛰쳐나갈 날만 기다리겠지. 사실 그 애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닌데. 안아주는 사람과 산책하고, 푹신한 소파와 침대, 쾌적한 공간인데. 나는 그걸 안다. 목줄이 풀리는 순간 부리나케 우리 집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산책 후에도 절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잘 곳과 먹을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짧은 줄에 묶인 채로 짖는 개들을 지나칠 때면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집도 있고, 밥도, 물도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준비돼 있다면 동물 학대로 신고할 수도 없다. 하지만 10여 년의 삶이 예정된 생명에게 평생 필요한 것이 단 그것뿐이라고는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 기자가 시골 개의 삶을 경험하고 쓴 ‘1m 목줄에 묶여… 시골 개의 하루를 보냈다’ 기사를 보았다. 강릉의 한 가게 옆에 묶여 사는 ‘멍순이’와 함께 한겨울 6시간을 반경 1m에 묶여 지내본 기자는 이 체험이 언젠가 끝날 걸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 털어놓는다. 개들의 눈빛과 행동을 하나하나 읽는 데 인간의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1m짜리 목줄보다 2m짜리 목줄이, 묶여서도 이동 가능한 도르래 줄이나 1만 원도 하지 않는다는 10m짜리 와이어 줄 내에서 사는 삶이 훨씬 낫다는 것은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성화 사업이다. 줄에 묶인 채로도 어찌어찌 몇 번의 출산을 하는 개들, 그 사이 태어난 새끼들은 또 어딘가로 데려가 비슷한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이에 경기도나 제주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성화를 권하고 있으나 견주를 설득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개 시장과 무허가 개 농장이 차츰 줄어들고, 존중해야 할 생명의 폭을 넓혀가자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니 그것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될까? 겨우 알았던 산책의 즐거움을 잃은 채 다시 좁은 마당에서 ‘끝’이 어딘지 모른 채 살아갈 보더콜리에게 그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백세희 10년 넘게 겪은 경도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만큼 동물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Writer
백세희
10년 넘게 겪은 경도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만큼 동물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사진 UNSPLASH
- 디자인 임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