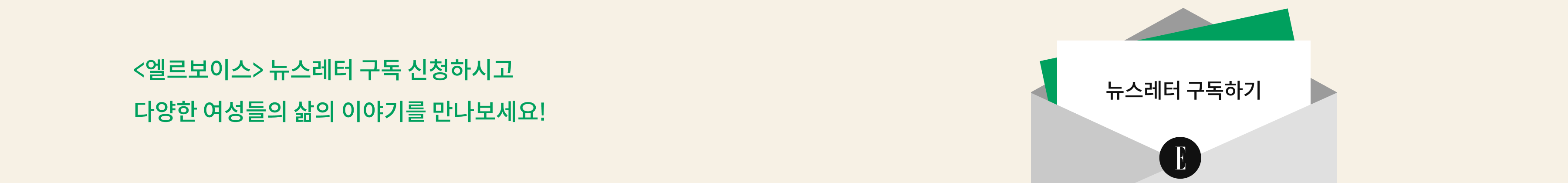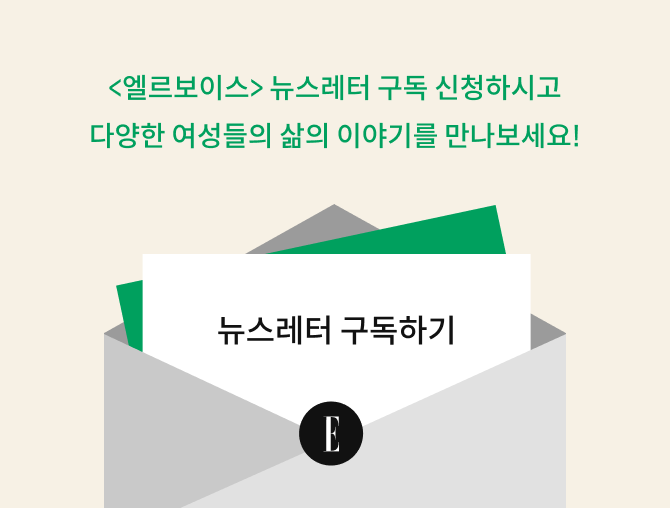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손 내미는 법을 아는 용기
2020.09.20

손 내미는 법을 아는 용기
“선우야, 잠깐 통화 가능하니?” 명절이 아닐 때 오는 이모의 카톡은 뭔가 엄마에 대해 고자질할 건수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예감보다 더 나빴다. 2주 동안 입원해야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고도 엄마는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하고 온 이모가 슬며시 일러바치는 동생이라서 다행히 나는 수술 당일 부산에 내려가볼 수 있었다. 마취도 덜 깬 손으로 묵주를 더듬으면서 한 아녜스 씨는 말했다. “만다꼬 왔노, 바쁘다면서. 괜찮으니까 내일 바로 올라가라.” 나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고집 세고 무뚝뚝하고 오만하고, 하여간 나와 똑 닮은 모습이었다. 나도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한 다음, 1년 뒤에야 책을 통해 알게 한 적 있다.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나? 엄마에 대한 배신감,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이 들었다. 급기야 어서 집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불고기와 미역국을 꺼내 먹으라는 대목에서는 소리를 빽 질렀다. “엄마, 환자 주제에 지금 다른 사람 챙기고 있나? 이래라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좀 고분고분 아픈 데나 집중하라고!”
입원과 회복 기간에는 동거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친구와 함께 살기 전까지 15년의 자취 기간 동안 나는 응급실에도 혼자 가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 애썼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우선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일인데, 잡지사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언제나 바빴다. 친구에게 같이 이케아에 가줄 수 있을지 물어보고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당장 차를 몰고 다녀와서 낑낑대며 조립하는 편이, 그러고 다음날 앓아눕는 편이 더 간단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뭔가 도와달라고 하려면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게 먼저다(가구 조립을 부탁하려면 최소한 집에 불러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집이 더럽다거나).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그만큼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는 대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잊어갔다. 그 상태는 독립인 동시에 고립이기도 했다. 엄마도 어쩌면 자신의 아프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아유, 딸이 있어서 참 좋겠네. 우리 아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와보지도 않는다 아이가.” 수술 다음날 거동이 힘든 엄마 곁을 지키는데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저도 지금 돈 버느라 바쁜 거 안 보이세요?’라고 따지려다 슬기로운 병원생활을 위해 꾹 참았다. 글 쓰는 프리랜서의 문제점은 노트북을 펴 들고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는 꽤 여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인터뷰 연재 론칭을 앞두고 속이 타들어가는 때였는데, 병실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보호자들이 쉴 의자도 하나 없었다. 휠체어에 앉아 원고를 수정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 나 역시 정형외과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았다.
나의 마감도, 엄마의 고통도 다행히 영원하지는 않았다. 다음날부터 둘 다 조금씩 여유가 생겨 제일 작은 캠핑 의자를 갖다 놓고 병상 곁에서 업무를 보거나 놀았다. 간병인이 따로 있기에 내가 할 일은 많지 않았다. OTT 서비스에서 엄마가 놓친 드라마를 찾아 틀어주고, 드라마 속 ‘썸’ 타는 연상연하 커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들었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프로젝트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이야기, 최근에 만들었던 음식 실패담, 늘 사소한 사고를 치는 친구 남편 험담 같은 걸 떠들었다. 나는 병실에서 철저히 ‘잉여’였다. 내 주된 임무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 병실 밖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똑같은 면적의 좁은 방에도 창문이 있고 없고는 다르다. 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엄마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덜하진 않겠지만, 신선한 공기나 새로운 풍경을 조금은 더했을 거다. 자기 안의 아픔이나 불안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그런 것이다.
1주일 뒤 다시 병원에 가는 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지 마라’ ‘됐다 마’ 등의 부정어로 일관하던 엄마가 모처럼 빵을 사다 달라고 했다. 사랑이란 기쁘게 이용당하는 마음 아닐까? 내 돈 3만 원을 쓰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소화가 잘될 만한 부드러운 빵으로 종류를 다양하게 섞어 사 들고 가자 옆 병상에 새로 수술받은 아주머니 식구가 여럿 와 있으니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환자 주제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걸 챙기고 있는 아녜스 씨였다. 엄마다운, 또 내가 닮은 모습이었다.
이제 나는 아프고 힘들 때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을 곧잘 한다. 혼자 해결하는 편이 간단할지라도 번거롭게 옆에 있어달라고 말할 줄 안다. 상대방이 뭔가 준다고 하면 고맙게 받는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나 역시 기쁘게 이용당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강한 사람도 약할 때가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약함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모색하고, 친절에 기대어 회복하고, 다른 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잘 돌려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것. 내가 알게 된 진짜 강함이란 고립이 아닌 연결의 힘이다.”
writer_ 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이자 운동 애호가. 오랜 시간 잡지 에디터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을 살려 여성의 일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Writer
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이자 운동 애호가. 오랜 시간 잡지 에디터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사진 unsplash
- 디자인 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