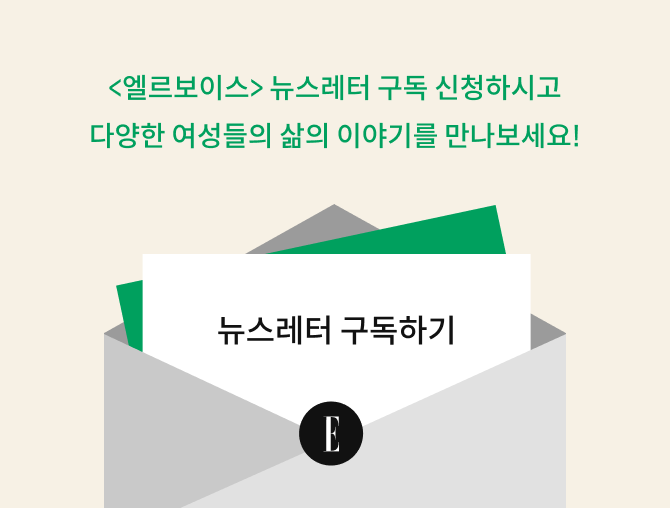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우엉의 친구들은 누구일까
2020.05.14

내가 몇몇 여성 단체에 후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 이후다. 내가 일해온 대중문화 영역에서 여성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면서 더는 사회적 맥락을 제거한 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없어졌고, 대중문화와 사회는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오랫동안 미디어 속의 성차별을 비판해 온 여성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고발 운동 당시 취재를 위해 맨땅에 헤딩하듯 찾아간 반(反)성폭력 여성운동 단체에도 회원 가입했다.
‘후원인 명단’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아마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눈에 띈 이후였던 것 같다. 남성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내왔고 여성 단체 행사에 기꺼이 참여했던 그가 명단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이 그의 사후였다는 점이 뭐라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니 왠지 눈물이 났다. 그리고 지난해 명단에서 발견한 그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나다순으로 적힌 수많은 이름이 끝나면 단체나 익명, 별명으로 후원한 이들이 등장한다. 노동조합, 학원, 은행, 카페는 물론 서로 형편이 뻔한 다른 여성 단체의 이름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늘 신기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여성-여성학 교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캠페인 메시지, 여기저기서 고군분투 중인 페미니즘 동아리와 모임의 이름을 발견할 때는 가슴이 벅찼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다양한 닉네임이다. 캐롤 댄버스(<캡틴 마블>의 주인공)처럼 익숙한 이름부터 카쿄인 노리아키(<죠죠의 기묘한 모험> 캐릭터), 케일 헤니투스(<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의 주인공) 등 검색해 봐야 정체를 알 수 있는 이름도 있다. ‘낙태죄 사망’ ‘김지은 응원’이라는 다섯 자에 담긴 무게, ‘경축! 기저귀 뗀 날’이라는 메시지에서 떠오르는 속 시원한 미소도 반갑다.
마마무의 팬들이 모든 멤버의 생일마다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여성시대 마블달글’처럼 앞의 네 글자는 커뮤니티 이름이라는 건 알겠는데 뒤의 네 글자는 알쏭달쏭할 때도 있다. 그중에서도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우엉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인데, 우엉은 누구이며(진짜 우엉인가?), 우엉의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 여성 단체에 후원하게 됐는지 나는 정말이지 너무 궁금하다.
어느 반성폭력 활동가를 인터뷰하면서 활동가란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한 적 있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돈과 사람, 조직이다. 딱히 놀라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성 단체들은 돈이 별로 없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는지 드러난 지난 5년 동안 업무량은 폭증했고, 인력은 부족하다.
나는 ‘그나마’ 규모가 큰 여성 단체의 회원 총회에 참석했다가 연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다. 아니, 요만한 돈으로 그 많은 일을 한다고? 로또에 당첨되면 이 정도는 한 방에 기부할 텐데! 하지만 좋은 꿈을 꾼 김에 연금복권 5000원어치 사서 2000원 당첨된 것으로 올해 행운을 다 쓴 나는 간신히 한 달에 1만 원을 내는 개미 회원으로 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곳에 매달 5000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결정하기까지 몇 번이나 손을 떨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싸우고 있지 않은 이 순간에도 누군가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문제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남을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감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싶어지는 날, 나는 ‘우엉의 친구들’을 떠올린다. 더 많은 여성, 여성주의자가 그렇게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WRITER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책 <괜찮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Writer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했다. 〈괜찮지 않습니다〉와 딩크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펴냈다.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온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