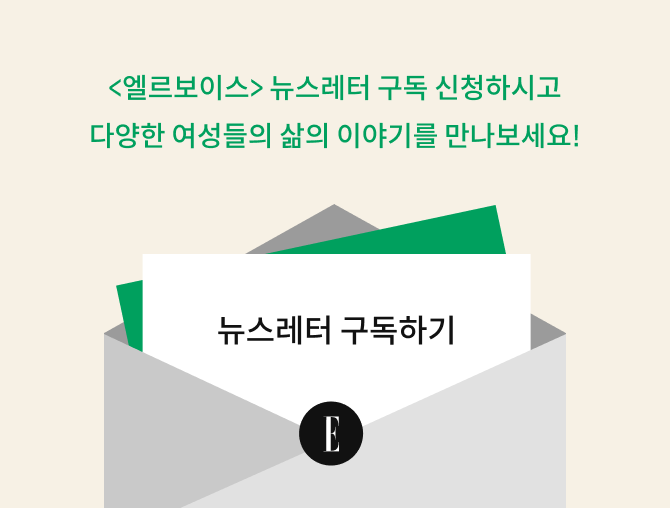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아이와 화해하기
2020.01.30

문득 얼마 전 들었던 은유 작가의 강연이 떠오른다. “언어 자본을 갖지 못한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퍼붓는 게 얼마나 부모 특권을 빙자한 폭력인지”에 대한 얘기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김지혜 교수가 말했던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나였구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도덕성을 자부해도 차별은 무의식중에, 도처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만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내게 아무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한다. 결혼할 수 있는 이성애자가 결혼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를 특권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듯이. 언론계를 거쳐 학계로 온 나는 한 번도 직업 선택이나 승진이 성별 때문에 좌초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두 번의 육아휴직 후 인사고과에서 최고 불이익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진작 공부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 딸 부잣집 막내였던 내가 예상치 않게 남자아이만 내리 둘을 낳고 난 후부터, 그래서 기어코 셋째 딸을 낳은 다음부터 난 내 인생에서 세 남자와 차례로 전면전을 벌여온 듯하다. 최저 고과를 받은 후 대놓고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의 상사(첫째 남자)를 향해, 나와 아이란 생명을 함께 만들었으나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선량한 남편(둘째 남자)을 향해, 알량하게 지켜온 내 자존심을 처음으로 대폭 상하게 만드는 아들(셋째 남자)을 향해. 다른 것 같지만 이 셋은 모두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아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 장난기 심한 남학생에게 당하는 것처럼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요즘 다들 딸을 선호하는 거야.” 늘 ‘선량한’ 차별을 입버릇처럼 담아왔다. 문제는 남성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무의식중에 아들을 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성으로서 수련해 온 투사적 기질이 아직 내가 받은 교육적 특권과 비교하면 약자인 어린 아들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차별은 ‘선량하다는(나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 명목하에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김지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불평등에 관한 대화가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의 싸움이 되어서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공통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 또한 나를 골리려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성별이 다른 이 정체성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차별을 함께 드러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아들 덕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당신이 알아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아이와 함께 온 카페에서 ‘맘충’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김지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 아들을 알아가야겠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친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Writer 이원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했고 10년간 기자로 일했다. <니체>를 번역하고, <블랙 미러로 철학하기>를 썼다. 철학이 세상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코드라 믿는다.
Writer
이원진
〈니체〉를 번역하고, 〈블랙 미러로 철학하기〉를 썼다.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철학이 세상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코드라고 믿는 워킹맘.
Category
Credit
- 글 이원진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