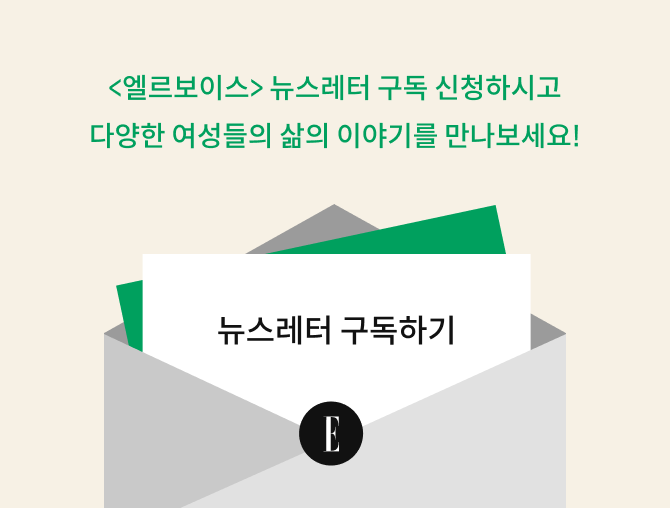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부디 더 넓은 세계로
2019.11.21

부디 더 넓은 세계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 이 구절을 좋아한다.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고생스런 여행을 떠나려 할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는 문장이다. 골드코스트의 바다는 충분히 새로운 장소이고 큰 광경이었다. 해안선이 거의 60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해변에 서 있으면 시야는 바다로 가득 찬다. 지금 마주하는 상대는 조무래기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양’인 것이다. 머무르는 동안 서핑 수업을 받을 기회도 있었다. 보드 위에 균형을 잡고 일어서나 싶다가도 금세 잘못 뒤집힌 호박전처럼 고꾸라지는 내 실력은 양양이나 송정에서와 변함없지만, 바다에서 내 지분만은 달랐다. 목욕탕처럼 복작대는 서핑 구역, 누군가와 부딪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넓은 바다를 차지하고 파도를 타 본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거침없이 바다로 들어가던 내 또래 여자도 기억에 남는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바다와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던 모습. 매일 일상의 조각 모음으로 삶이 된다면, 그런 매일로 이뤄지는 삶은 아주 단단하고 멋질 것 같았다. 단독자로서 바다에 나서 본 짜릿한 감각, 그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겨우 열흘 남짓이지만 돌아온 서울에서는 많은 것이 불편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소리 내서 하품하고 가래침을 뱉는 사람을 많이 본다. 자신이 어떤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고 상쾌한 출근길을 망가뜨리는 이들은 대개 나이 든 남자들이다. 그런데 왜 ‘택시를 타면 첫 손님이라 재수 없다’는 소리를 여자들만 듣는 걸까? 목청이 높은 데다 욕설을 섞지 않고서는 문장을 완성할 줄 모르는 젊은 남자들 때문에 식당에서 고통스러웠던 적도 많다. 그런데 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까 깨진다’는 얘기만 있을까? 중학생 때 선생님은 “말만 한 계집애들이 뛰어다닌다”며 여학생들만 혼냈다. 남자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덩치가 크다고, 뛰어다닌다고, 브래지어를 안 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욕을 먹는다. 이게 우리 사회가 여성을 기 죽이고 길들이는 방식이다.
“사회적으로 남자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폭이 넓죠. 여자에게 주어진 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아니라 작은 운동장이기도 해요.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외모나 말투, 행동까지 어떤 기준에 들어야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른 면으로 비호감이어선 안 된다는 식이에요. 저 멀리까지 달려야 하는데, 여자에게는 트랙 자체가 비좁게 설계돼 있어요.” 얼마 전 한 신문사와 커리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존재일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장소와 거대한 풍경 속에 자신을 놓아보기. 그곳에서 존재의 다양함을 발견하고 사회에서 요구받은 좁은 표준에서 벗어나기. 너는 너무 크다, 뾰족하다, 울퉁불퉁하다는 타박에 웅크리거나 위축되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지 못하는 이 나라가 너무 좁다는 걸 느껴보기. 내 후배 세대의 여성에게 여행이 이런 경험이면 좋겠다. 마음에 품고 에너지를 얻을 자신만의 바다, 자신만의 대륙을 수집하길 바란다. 성형외과 광고가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풍경이 세상의 당연한 전부가 아니니까 말이다. <여행의 기술>에서 그 구절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다. “큰 여자들은 큰 환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한다.”
Writer 황선우
작가, 운동애호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썼으며, 여성의 일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Writer
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자이자 운동 애호가. 오랜 시간 잡지 에디터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Category
Credit
- 글 황선우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