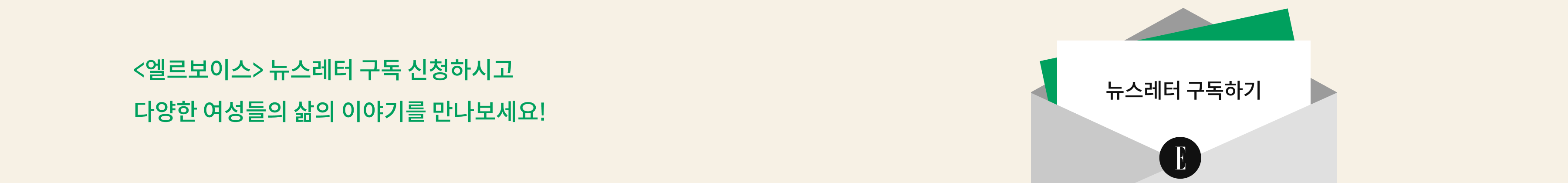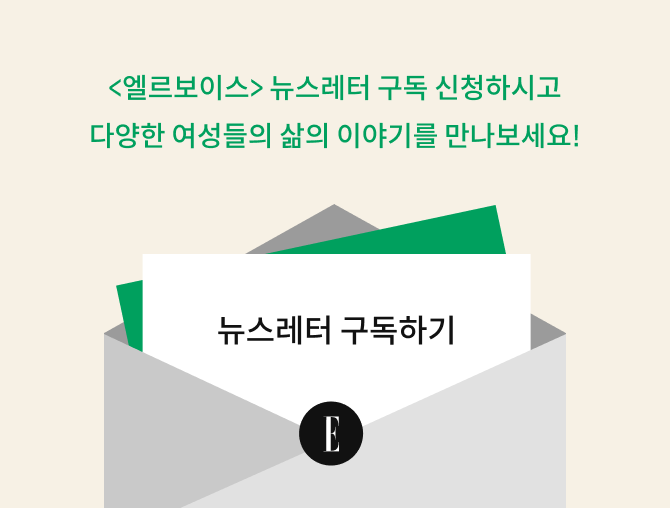새벽 1시 17분

ⓒunsplash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깜빡이는 커서 앞, 빈 종이 앞에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과 같다. 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세상을 뒤따라가면서, 그 걸음을 놓쳤다는 사실이 곧 내 능력의 결핍인 것처럼 헤맨다. 할 말 없으면 그냥 하지 마.
스스로에게 그런 괴팍한 마음이 들다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 또 아니어서 노트북 앞에 앉는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은 정녕 할 말이 없기 때문일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말의 동의어도 아닐 텐데. 알면서도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차라리 그게 솔직하다. 내가 뱉은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진실이다. 여태껏 이만큼 살고, 이것저것 해왔으면서도 그걸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한심하다. 그런데 모르겠는 걸 어쩌라고? 모든 게 여전히 어렵다. 솔직해지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고 솔직한 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새벽 1시 17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나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쓰는 이 종이에서도 말을 고르고 고른다.
어쩌면 이 생각도 어딘가에 활용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이용하면서 사는 기분이 든다. 어떤 배우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애인과 싸우면서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나는 메커니즘을 몸으로 기억하려고 했다”던가? 싸우는 와중에 그럴 정신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몸서리쳐진다. 나의 무언가를 갉아먹는 기분이다. 살기 위해 나를 갉아먹는 건지, 갉아먹기 때문에 살아지는 건지, 갉아먹는 것이 산다는 건지, 갉아먹는다는 감각이 드는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인지. 이런 말장난 같은 생각은 늘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결국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싶다. ‘다들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라는 평범한 깨달음으로 지금 생각이란 걸 쓰고 싶은 건지, 써야만 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unsplash
높게 뻗은 창가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아 바깥을 보고 있으면, 알고 보면 세상 참 별것 없는데도 소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오거리에 살아서 그런가. 인도에 놓인 신호등과 차량용 신호등이 각자의 규칙으로 번갈아 가면서 깜빡인다. 요즘의 나는 앞을 잘 보지 않아서 바닥에도 신호가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틀릴 리 없는 정보는 내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는 그걸 믿어버리면 그만이어서 편리하다. 신호등의 쓸모는 그럴 때 생기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갖춘, 멈추지 않으며 감정을 살필 필요도 없는 것. 물론 작동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뽑혀버리고 말 테지만, 내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절대 버벅거리지도 틀리지도 않는다. 쉴 새도 없다. 그것들은 동시에 켜졌다가 꺼졌다가 바뀌었다가 깜빡이다가 또 바뀌었다가를 반복한다. 이 시간에도 신호등은 빛을 낸다. 이상하게도 낮의 빛은 사람들의 뜀박질과 차량의 엔진 소리와 어우러져 소리가 없는데도 시끌벅적하다. 빨간 불이니 멈추라고, 파란 불이니 건너라고, 나 깜빡이는 동안에 마저 건너라고…. 노란 불은 아주 찰나여서 당신은 이미 카메라에 찍혔을지도 모른다. 아슬아슬한 경계의 순간을, 종종 그런 시끄러움을 내려다본다.
문득 다시 고개를 돌려 집 안을 둘러보면, 바깥의 소란과는 또 다른 소란이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과 고양이 화장실 앞 모래사막, 때때로 찾아오는 비염에 코를 풀고 쌓아둔 휴지 더미와 며칠째 정리하지 못한 옷더미의 소란스러움. 이 소란은 세상의 무언가보다 나와 훨씬 가깝고, 그렇기에 나를 더 곤란하게 한다. 해가 바뀌고 해가 중천까지 치솟아 또다시 사람들 틈으로 숨다 보면 잠시 잊히겠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치워야 하는 거다. 뒤섞여서 쌓이다가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 보기도 싫지만 결국 해내야 하는 것들. 지겹게도 사라지지 않고 들러붙는, 살다 보면 필연으로 남는 잔해들. 치워야겠지.
몸을 일으켜 설거지를 시작한다. 밥그릇에 덕지덕지 붙은 밥풀이 시원한 물줄기에 씻겨 내려간다. 물과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에 막연한 고민은 뒤로 숨어든다. 물에 불은 밥풀은 잘 떨어진다. 이 단순한 사실에 잠시 안도한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서 굳은 손끝이 금방 편안해진다. 그 온도가 마음에 들어서 가슴 안에서 얹힌 듯 걸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든다. 작은 거품들이 그릇의 끄트머리를 타고 흐르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나는 그 사라지는 거품을 잠시 바라본다. 뭔가를 흘려보내는 데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조금은 멀끔해진 마음으로 마른 그릇을 골라내 제자리에 놓는다.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쓰는 거지 뭐. 다 했고, 오늘도 잘 살았다.
아무도 오가지 않는 거리를 내려다본다. 여전히 신호등은 빛을 내고 있다. 고요하다. 그제야 모든 소란은 살아 있는 존재가 내는 소리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 당신도 나도 잠들지 못한 채 깨어 있나 보다.
Writer
손수현
엘르보이스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에디터입니다. 다양한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Category
Credit
- 에디터 전혜진
- 글 손수현
- 사진 unsplash
- 아트 디자이너 민홍주
- 디지털 디자이너 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