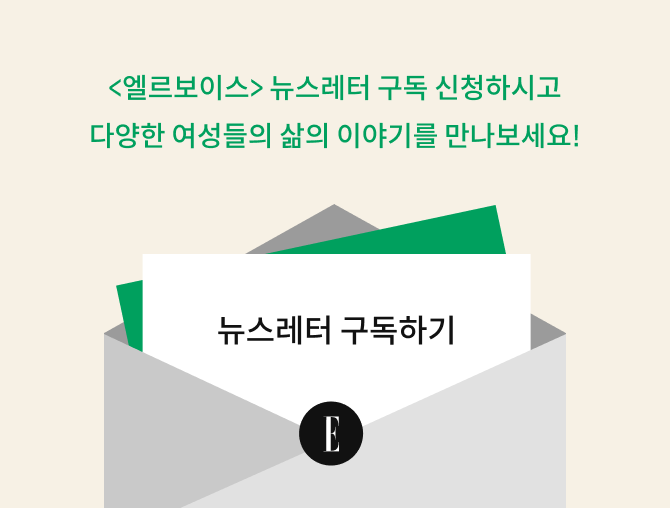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소중한 이유
2022.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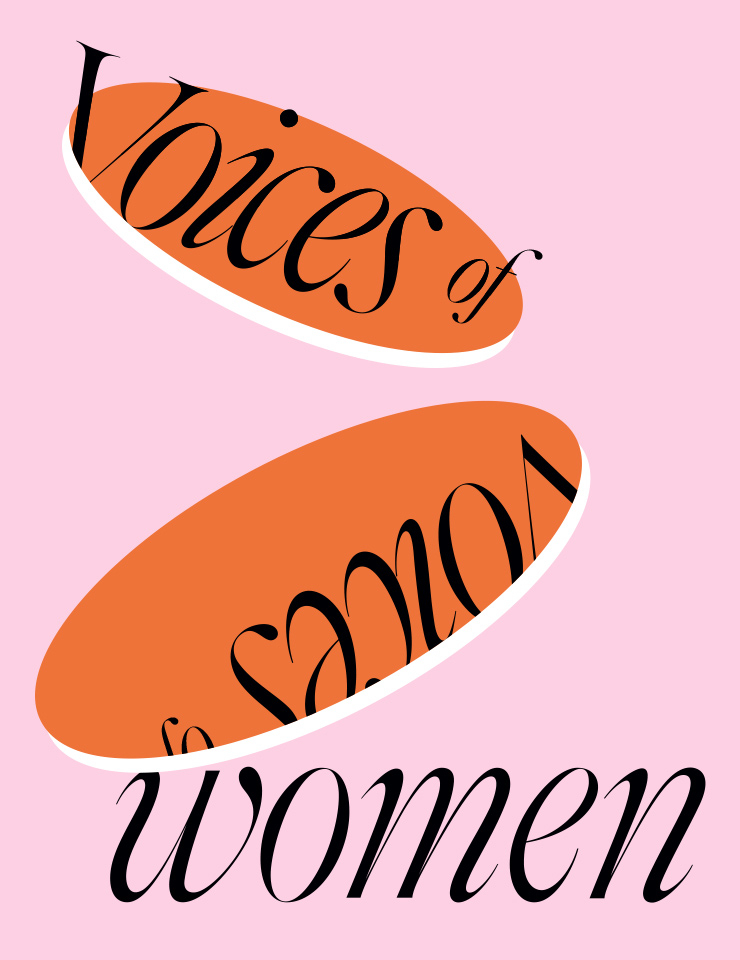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며 자극을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몸이 순한 맛을 찾는다. 순하고 선한 맛에 보는, 잔잔하게 웃고 기분 좋게 한 편을 끝낼 수 있는 미디어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드라마 <라켓소년단>이다. 야구 에이스였던 주인공 윤해강이 시골 마을 학교, 그것도 멤버라고는 고작 세 명밖에 없는 배드민턴부에 들어가 친구들과 꿈을 찾는 여정을 순하게 그려낸 이야기다. 정해진 것도 없이 오게 된 시골,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윤해강을 보고 있으면 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작가생활을 시작하며 자주 듣는 질문 하나가 있다. 이제 ‘예’라는 첫 글자만 나와도 뒤에 따라올 문장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작가님은 예술 고등학교 문예창작과를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땠나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열일곱 살 때 부모님한테 말도 없이 진로를 찾아 예술 고등학교에 편입했다는 내 일화가 꽤 인상적인지 각종 인터뷰와 북 토크에서 과거의 결단과 결과를 궁금해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술 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가서 글을 더 잘 쓰게 되었다느니,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졌다느니 같은 대답보다(물론 이런 결실도 당연히 있으나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약간··· 미친 친구들을 만나요”라고 답한다. 그럼 질문을 건넨 기자나 혹은 청중은 웃음을 터트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딱 필요한 시기에 딱 맞는 동료를 만났다는 뜻이다.
열일곱 살에 진로를 선택해 문예창작과에 온 친구들은 남다른 선택을 했다는 어떤 고취감과 문학을 제패하겠다는 포부 따위가 절정에 이른 상태이고, 그것을 받쳐줄 체력도 있다. 예술 고등학교 문예창작과의 실질적 혜택은 백일장을 원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나흘 내내 전국의 각종 백일장을 다녔고, 개중에는 지역 백일장이 가장 많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절한 관광버스에서 여섯 시간 내내 문학에 관해 쉬지 않고 떠들었다. 시학이 뭔지, 비극과 예술의 상관관계가 뭔지,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돌이켜보면 듣는 사람이 비웃을 수도 있을 법한 주제를 우리는 아무 부끄럼 없이, 정답과도 상관없이 펼쳤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생각하건대 지금의 나는 절대 그때의 나처럼 열정적으로 생각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새 나는 정답이 중요해졌고, 겁이 좀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절, 겁 없이 떠들 수 있었던 기억 덕분에 나는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고, 겁이 좀 많아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정보든 빨아들이고 싶어지는 시기가 오는 법. 그때 원 없이 빨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전부 토해 낼 일이 생긴다 한들 생각과 시선은 쉽게 굳지 않는다. 한껏 부풀었던 지식의 크기를 맛본 이상 어떤 지식을 겁 없이 탐닉했던 설렘이 나를 또 다른 설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며 내가 가장 많이 익힌 건 친구가 상받을 때 박수 칠 줄 아는 법이며, 이번 실패가 다음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이를테면 소설이나 소설 그리고 소설!)를 지치지 않고 온종일 떠드는 법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시절,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친구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시절에 해야 할 소임을 다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휘발된다고 믿었으나 사실 그 말들이 쌓여 내 안의 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힘들 때마다 문학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라 외치던 그 패기 가득한 말들을 꺼내며 확인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패기에 같이 목소리 높여줄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나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문제에 골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료라고 한다.
2020년,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 해,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때 만났던 모두가 동료로 남았다.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시시때때로 연락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도 각자 제 고민처럼 머리를 맞대고, 대뜸 좋은 소식을 던지면 제 일처럼 기뻐하는 사이가 됐다.
나는 ‘시절 연인’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떨 땐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인연을 만드는 것만큼 큰 행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어느 한 시절 적절하게 찾아온 인연을 두 팔로 반기며 그들에게서 내 다음을 살아갈 양분을 얻는다.
천선란 1993년생 소설가. 2019년 첫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를 펴낸 후 <천 개의 파랑> <어떤 물질의 사랑>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를 썼다.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꾼다.
엘르 뉴스레터 '엘르보이스' 구독하기💌
Writer
천선란
1993년생 소설가. 2019년 첫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를 펴낸 후 〈천 개의 파랑〉〈어떤 물질의 사랑〉〈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를 썼다.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꾼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