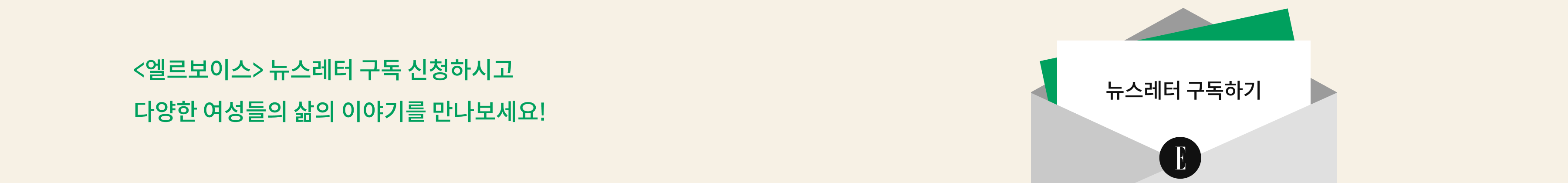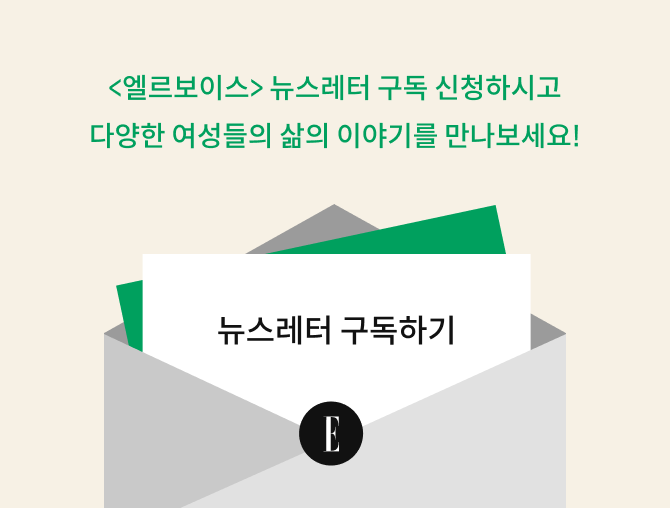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백래시의 시대, 페미니즘 출판사로서 살아남는 법
202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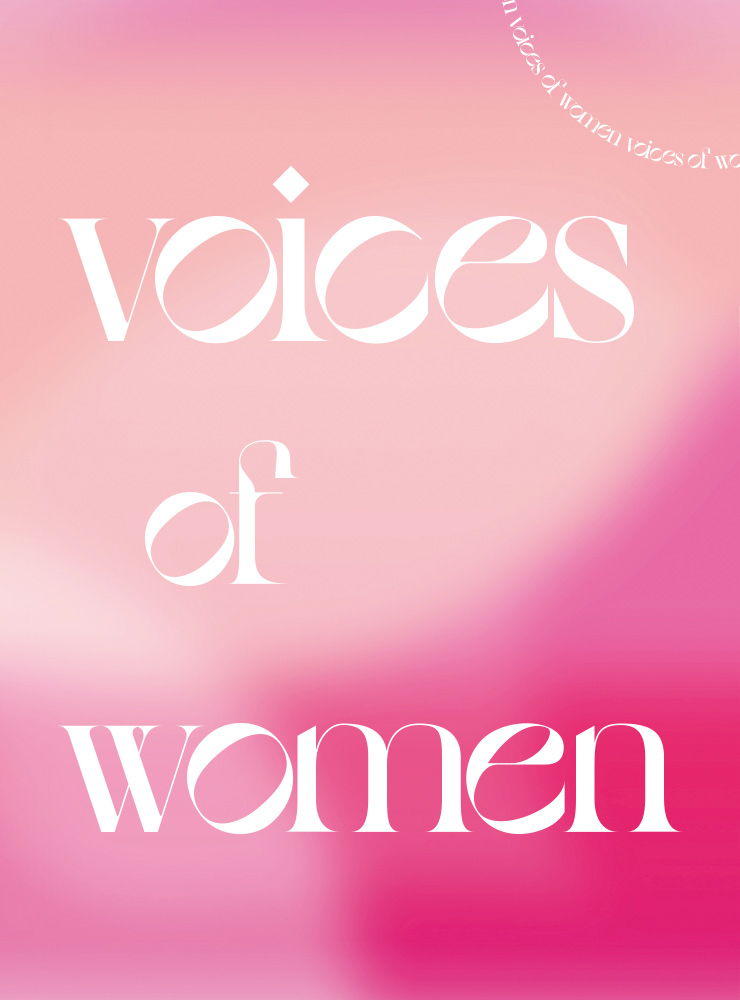
2022년이다. 올해도 재미있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고 싶다. 2016년 출간한 봄알람의 첫 책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하 <입트페>) 편집 후기에 나는 “페미니즘은 몸에 좋습니다! 섭취하고, 단단해집시다”라고 썼다. 주기적 섭취를 멈추지 않으려면 재미는 중요하다. 좀 시들해지면 밤낮없이 보던 넷플릭스도 미련 없이 끊는 세상에 꾸준히 페미니즘 챙겨 먹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쉽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많은 여성이 수년간 페미니즘 안에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단단해졌다. 논란이나 충돌도 많았지만 오히려 서로 부딪히며 여럿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이 변화는 ‘진짜’라고, 서로 다른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앎을 통해 불가역적 변화를 영원히 일으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득권을 좀 과소평가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개개인의 생각만으로 버텨내기에 세상의 성차별 이미지와 언어는 더욱 빠르게 진화한다. 남자들이 범죄와 비행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남혐 논란’ 날조와 페미니스트 입막음 공격이 애석하게도 효과를 발휘했다. 이 ‘백래시’는 페미니즘 역사에서 반복돼 온 현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집게손가락이나 오조오억 같은 ‘창조 남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음을 산 한편에서는 ‘성별 갈등’을 조장한 ‘페미니즘의 문제’인 양 온갖 언론이 확성기를 대고 떠들어줌으로써 페미니스트를 침묵시켰다. 몇 년 전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겠다. 아닌 건 아니다’를 함께 외쳤던 여자들이 요즘은 ‘또 페미다 남혐이다 몰아갈 게 뻔하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가 된 것이다. 여성들은 점점 맞서기보다 적응해 버린다. 그리고 점점 화내기보다 침울해진다. 백래시의 메커니즘이다.
지난해 새롭게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나 교실 안에서 ‘페미 괴롭힘’을 당하는 더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입트페>를 찾는 듯했다. ‘성차별 대화 실전 매뉴얼’을 목표로 탄생한 이 책의 출고량이 지난해 다시 소폭 오르는 것을 보며 반가운 한편으로(더 많이 읽혀야 하는 책인 건 분명하니까!) 서늘한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혹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까 ? 이렇게 또 한 번 침묵하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일까?
원점일 리 없다. 페미니즘 출판을 해온 6년간 동시대 페미니스트들은 생각 이상으로 촘촘히 함께 변화해 왔다. 그러나 역병으로 사적 관계가 크게 단절된 채 연일 기사화되는 남초 커뮤니티발 뉴스를 접하고 학교나 직장에 가면 ‘굳이 페미 티’ 내지 않고 조용조용 지내는 나날이 여자들에게 더 가혹했으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소위 ‘여성 서사’ 콘텐츠가 차례로 화제가 되고, 페미니스트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혼자가 된 것 같았다. 지난해 “가족이랑 회사 사람 빼고 못 만난 지 반년 넘었다”는 친구의 근황이 문득 두렵게 다가왔다. 가족과 회사야말로 여성을 끝내 여성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표적 시스템이다. 각자에게 든든한 관계일 수는 있을지언정 날카로운 변화가 자생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뿔뿔이 떨어진 여자들이 다시 목소리 큰 자들의 말에 둘러싸인 채 지내다 어느 순간 거기에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았다.
대개 일상의 피로는 약자의 몫이다. 세상의 많은 말이 왜 모욕이고 위협인지를 모르는 이들에 비해 늘 한 마디 더 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물며 페미니스트를 향한 근거 없는 낙인이 강화될수록 ‘너무 페미처럼 보이지 않도록’ 언어와 태도를 조정하며 매일을 건사한다. 실로 피곤한 일이기에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입을 다물어서 삼키는 건 보통의 한숨이 아니라 어렵게 쌓은 자기권리에 대한 감각이다. 이렇게 거듭 입을 다무는 일이 재미있을 리 없다.
지난해 처음으로 MBTI 검사에서 앞자리 E(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가 됐다. 가까운 이들은 이 소식을 목성이 흩어져 맥주가 됐다는 꿈 얘기 정도로 여길 만큼 나는 I(혼자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의 주요 소양을 다 갖췄지만 굳이 뜻을 찾자면 혼자 힘을 얻기에는 너무 침울한 정국인 탓인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들은 더 만나야 한다. 사회가 침묵을 강요한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여성혐오로 표벌이를 하며 ‘여성의 권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낸다.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권리를 위해 떠들던 일이 재미있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차별이냐면…’ 하고 천년만년 똑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일은 피로하지만, 내가 겪는 차별의 진실을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 지껄이며 더 많은 맹점을 발굴하는 일,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일은 회복이다. 실제로 한 친구는 편히 떠드는 만남이 줄어들고 회사에서 입 다물고 지내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 “점점 스스로 구려지는 느낌”이라 괴롭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더는 구려지고 싶지 않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만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페미니즘 출판업자로서는 책으로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테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기득권의 사유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일상의 무기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펴낼 것이다. 독자들께 묻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싶은가.
이두루 출판사 ‘봄알람’ 대표. 베스트셀러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와 <김지은입니다> 등을 펴냈다. 현실 이슈를 다룬 텍스트와 논의가 여성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힘을 믿는다.
엘르 뉴스레터 '엘르보이스' 구독하기💌
Writer
이두루
출판사 ‘봄알람’ 대표. 베스트셀러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와 〈김지은입니다〉 등을 펴냈다. 현실 이슈를 다룬 텍스트와 논의가 여성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힘을 믿는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