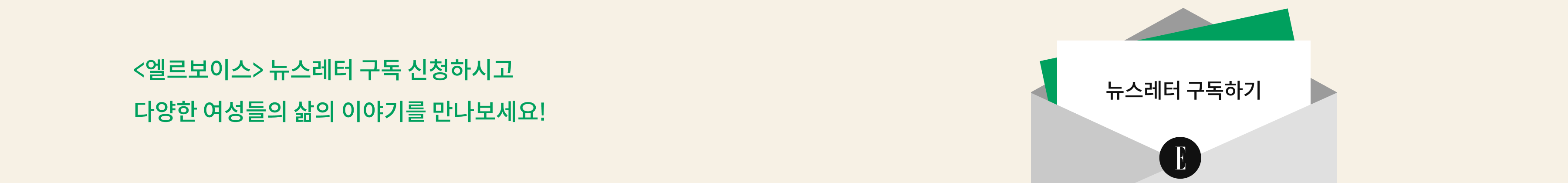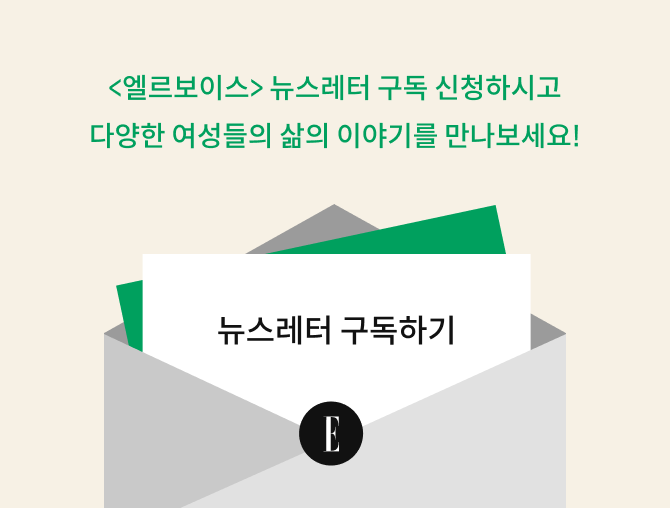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여자 숏컷, 대체 왜들 난리일까
2021.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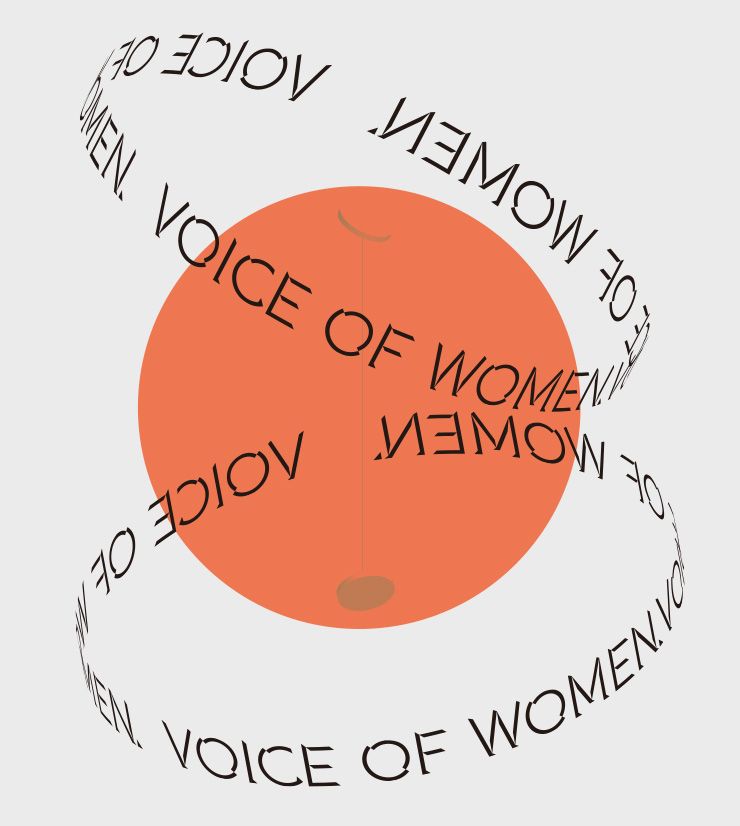
「
숏컷과 노 메이크업의 정체성
」재작년에 다시 숏컷을을 했다. 소위 ‘여자에게 어울리는 숏컷’을 거쳐 지금은 어느 미용실에 가도 “아예 남자처럼 짧게요?” “네” “이 정도요?” “아뇨, 더요”와 같은 문답을 몇 번 거쳐 머리를 자르고 있다. 이미 짧은 머리를 다시 자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짧게 자르냐” “이 정도가 예쁘다” “저 믿어보세요. 이래야 다시 기르시기 편해요”라고 말하는 헤어디자이너를 계속해서 만났다.
혹시 짧은 머리가 내게 지독히도 안 어울리기는 걸까? 유아기 이래 처음 숏컷을 시도한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인데, 충동적으로 잘랐다가 크게 후회하며 다시 머리를 길렀다. 하지만 재차 숏컷을 결심했을 때는 별 고민이 없었다. 한참 머리를 길러 겨우 좋아하는 ‘높이 묶는 똥머리’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사이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 아마 전에는 더 잘 어울리는 머리, 예뻐 보이는 머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머리 모양은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누가 보기에’ 어울리고 예뻐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익숙해진 지금 내게 긴 머리는 이를테면 장식 손톱처럼 느껴진다. 손톱이 있는데 분장용 긴 손톱을 붙일 필요는 없다.
화장을 그만둔 건 서너 해 전이다. 그전까지는 피부 화장뿐 아니라 최소 투 톤 아이섀도에 아이라인까지 매일 그렸다. 눈을 칠하지 않은 모습의 나는 외출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일 뿐이었다. ‘나가야 되니까 화장해라.’ 머릿속의 이 명령에는 어떤 반론도 존재하지 않아서 전날 술자리의 여파로 몸을 겨우 일으키고도 피부를 하얗고 고르게 칠하고 바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한 다음 출근했다. 지금은 앞의 문장을 쓰려는데 아이섀도와 아이라이너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잠시 멈출 정도로 전생처럼 멀게 느껴지는 과거다. 그때의 내게는 그게 상식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 메이크업에 숏컷, 편한 옷을 입었으되 남자가 아닌 인간은 미지의 생명체인가? 몇 년 사이 신분증 검사를 정말 많이 받게 되었다. 처음 몇 번은 직원분이 조심성이 많은가 생각했고, 그 뒤에는 마스크 때문인가 했으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알았다. 사람들은 ‘성인 여성’이 지금의 나와 같은 모습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화장과 긴 머리를 중단하고 나서 체감하는 것이 많았다. 탈코르셋 운동에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일단 하지 말아보자’ 하고 화장을 끊었을 때보다 지금 ‘코르셋’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느낀다. 딱히 자유로워졌다거나 해방됐다는 극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 다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만 확연하다. 왜 머리카락을 길게 만들어 굳이 감고 말리고 빗고 묶는가, 무엇 때문에 온갖 공산품을 구비해 쌓아두고 얼굴의 생김새를 바꾸는가가 오히려 설명이 필요하게 됐다.
화장을 그만두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했다. 슬쩍 ‘눈썹이랑 립만 하자. 그래야 맘이 편해’ 그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나를 계속 추동한 문장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심리학자 러네이 엥겔른의 책 제목인데, 이 책에는 ‘스스로 운명을 책임진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 삭발한 스물두 살 여자가 등장한다. 길거리 성희롱에 지치고 또 지친 끝에 세간에 여성으로 대상화되지 않으려 ‘민머리’라는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자의 경험이 이어지는 이 책을 e북 듣기 모드로 재생해 귓속에 넣으면서 한동안 출퇴근했다. 그렇게 수년간 그리고 지금도 나는 거울 앞에서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씻고 외출복을 골라 입지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른 채 출근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꼭 거울 앞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화장대 거울 옆의 콘센트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만큼이나 마땅히 있어야 했다. 당시는 별스럽지도 않았던 생각이 지금은 무척 기이하게 느껴진다. 머리를 말리는 데 거울은 필요치 않다. 사실 헤어드라이어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거울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가야 하고 별 수 없이 신경이 쓰이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순간들, 내 모습이 낡고 초라해 보여 어떻게든 다급히 매만지고 싶은 순간들. 대학생 때 나는 옷을 ‘생각 없이’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가 조합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근처 옷 가게에서 잽싸게 ‘만회할 만한’ 옷을 구입해 갈아입는 사람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는 ‘꾸안꾸’지”라는 친구들 말이 기뻤던 것이 기억난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즉 딱히 멋 부린 것 같지 않은데 얼마간 세련됐다는 아주 좋은 소리라 여겨졌고, 좀 과장하자면 늘 그렇게 보이길 바라며 긴 세월 옷을 골라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랬던 인간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는 없다. 잘 받는 색깔, 체형을 커버해 주는 디자인, 절대 입지 말아야 할(주로 뚱뚱해 보인다는 이유로) 옷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학습하면서 자란 여자가 단숨에 모든 것에 초탈하기란 쉽지 않다. 민낯에 숏컷을 고수한 뒤로 옷을 매치하기 곤란했던 적도 당연히 많다. ‘꾸밈노동에서 벗어났더니 완벽한 평화를 발견했다’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벗어나지도 못했을뿐더러 ‘꾸안꾸병’은 쉽사리 완치되지 않으리라 본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실천뿐이라고 믿는다. 젊은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조각조각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준비가 돼 있는 세상에서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다. 가슴을 조이는 와이어 브라에 타이트한 재킷, 안에 입은 속옷 라인까지 신경 써야 하는 펜슬 스커트, 컬이 완벽한 긴 머리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 스타일을 대표했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지 않은가? ‘인형처럼 예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가끔 내 모습이 낯설고, 예전에 좋아하던 옷들이 눈에 밟혀도 나는 이전이 아닌 다음으로 가고 싶다. 어떤 억지에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이미 다른 시대로 가고 있는 더 많은 여자들과 함께.
이두루 출판사 ‘봄알람’ 대표. 베스트셀러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와 <김지은입니다> 등을 펴냈다. 현실 이슈를 다룬 텍스트와 논의가 여성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힘을 믿는다.
Writer
이두루
출판사 ‘봄알람’ 대표. 베스트셀러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와 〈김지은입니다〉 등을 펴냈다. 현실 이슈를 다룬 텍스트와 논의가 여성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힘을 믿는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디자인 한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