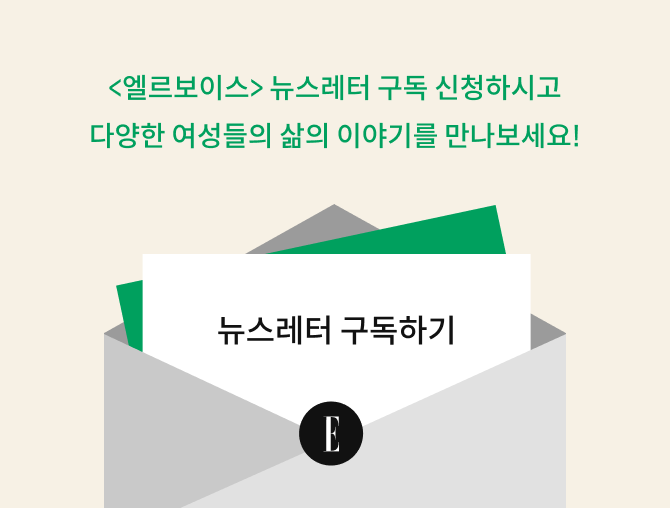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사유리, 벽을 부수는 사람
2021.01.04

살면서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여성을 종종 만났다. 결혼과 출산을 막연히 낭만화했던 10대 시절부터 친구 다수가 초등학생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 여자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 이상 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 나로선 잘 알 수 없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의 부담과 남편이라는 존재에 따라붙는 번잡스러운 문제를 굳이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 욕망을 실행에 옮긴 사람을 본 것은 사유리 씨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궁 기능이 떨어져 임신이 어려워졌음을 알고 충격받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서둘러 상대를 찾아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라는 사유리 씨의 말을 들으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맞서야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다. 세상은 여성이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는 삶을 끔찍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만, 사유리 씨는 사랑 없는 결혼이야말로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싱글 맘으로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낸 것이다.
물론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구르는 바퀴를 붙들고 늘어지며 ‘내 생각=국민 정서=절대 진리’인 양 우기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여성이 자발적 선택으로 남자 없이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런 가능성을 반기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다. “아이 동의 없이 엄마 혼자 결정해서 낳으면 안 되죠.” 세상에 태아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출산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아빠 없이 태어날 아이가 행복할까요?” 당신 같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크리스천으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입장도 들어봅시다!
뻔한 태클들을 뒤로하고 사유리 씨가 남긴 것은 ‘다음’으로 가기 위한 질문들이다. 그는 “낙태가 여자의 권리라면 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 현재, 낙태죄 처벌 조항이 남아 있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낳을 권리’ 또한 가부장제 구조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법률적 혼인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만 체외수정 시술을 해주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서다. 다만 사유리 씨의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다고 발표할 때쯤, 최하나 감독의 영화 <애비규환>이 개봉했다. 가르치던 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진 대학생 토일(정수정)이 오래전 엄마와 이혼한 친부를 찾아다니며 벌이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만큼이나 경쾌한 톤으로 정상가족 신화와 모성 신화를 걷어차고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펼쳐놓은 영화를 보며 사유리 씨를 향해 “감히 여자 혼자 애비도 없이 애를 키우겠다니”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톡’ 하고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두꺼워 보였지만 실은 별것 아니었던 그 벽에.
최지은_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괜찮지 않습니다>와 딩크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썼다.
Writer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했다. 〈괜찮지 않습니다〉와 딩크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펴냈다.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사진 UNSPLASH
- 기사등록 온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