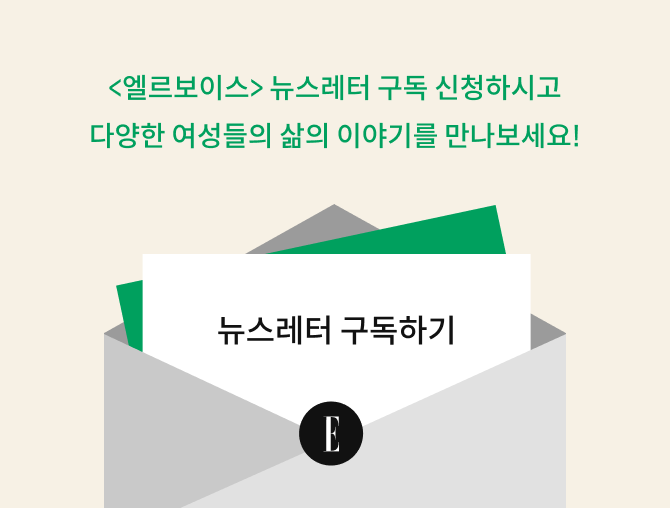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여성에게 실질적 파워를!
2020.03.05

임파워링에서 파워로
하지만 “요즘 여자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한다”는 이들은 여전히 여자를 진짜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신들의 안위와 밥줄을 위협할 만한 ‘힘’이 여성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의 65%만 받고, 동일고용·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는다. 사법부는 어떤가? 기술 발달과 함께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관련 법 없음을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현재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자는, 최소한의 저지선 확보를 위한 법안조차 국회 내에서 몇 년째 계류 중이다. 사회는 여성에게 ‘임파워링(Empowering: 권한 부여)’은 허락해도 ‘파워(Power: 권력)’는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 여성운동의 선구적 인물인 베티 프리단은 1963년 작 <여성성의 신화>에서 여성이 겪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의 핵심에 힘과 권력의 부재가 있다고 봤다. 여기서 힘은 여성이 공적 자아를 추구하고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힘이 생긴 듯한 기분을 소비할 순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될 확률은 1만 명당 9명에 불과하다. <미스트롯>의 우승 상금은 3000만 원인데 <미스터트롯>의 우승 상금이 1억 원일 때, 이런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질 때, 송가인이라는 존재가 주는 ‘임파워링’과 별개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라 공기업은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린다고 한다. 어쩌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처럼 사기업 여성 임원 40% 할당제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2000년부터 ‘남녀 동수제’를 실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하원의원 여성 비율이 40%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여성 정치 대표성이 가장 낮은 한국은 여성 후보를 남성 후보와 동수로 추천하는 ‘남녀 동수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구조적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파워링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다. 그러니 여성에게 더 많은 파워를!
Writer 김진아
광고와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책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를 썼다. <뉴욕 타임스>에 서울의 페미니즘 공간으로 소개된 ‘울프소셜클럽’을 운영 중이다.
Writer
김진아
김진아는 광고, 공간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다. 책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를 썼다. <뉴욕 타임스>에 서울의 페미니즘 공간으로 소개된 ‘울프소셜클럽’을 운영 중이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사진 unsplash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