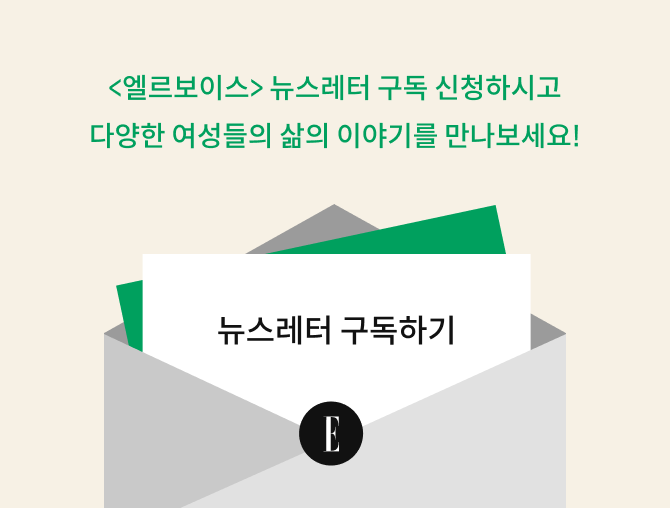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엘르보이스] 나의 망한 실험 이야기
2019.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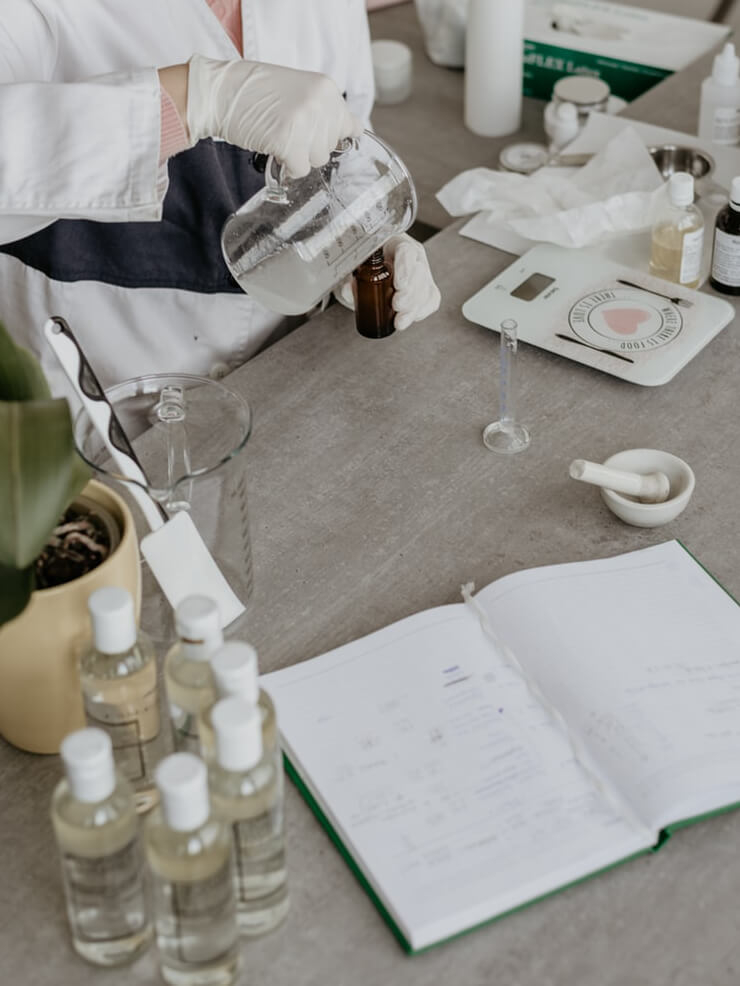
그러나 실험실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건 실패의 현실이었다. 이공계 대학원에는 밤샘에 주말 출근까지 하며 무려 반년을(!) 매달렸던 실험이 결국 ‘안 되는 것’이었다는 실패담이 복도마다 떠돈다. 반년이 뭐람? 1년, 길게는 몇 년씩 진행한 연구가 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아무도 이게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그저 온갖 추측을 동원할 뿐이다. 이 와중에 정말 슬픈 건 이런 종류의 실패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는 거다. 분명 어떤 연구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오류가 나를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의 실패라는 건 위대한 자연의 진리 앞에서 고뇌하는 과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작은 플라스틱 튜브 속의 세계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을 매일 한심하게 여기는 일에 더 가깝다.
물론 변명은 준비돼 있다. 잘되기만 하는 연구라면 이미 세상 어딘가의 누군가가 논문을 내지 않았겠느냐, 과학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앞선 과학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 탓에 내게 남은 것은 전부 망할 것이 예견되는 실험뿐이라는 둥. 같은 조건으로는 실패하고, 조건을 바꿔서도 실패하고, 잘되다가도 실패하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싶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냐, 다들 그런 거야”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연구실의 언니들은 말했다. “실험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실패에 매번 실망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내재화하지는 말라는 것. 망하면서도 바닥까지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게 정말 보통 ‘멘탈’로 가능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학문에 정말 그런 속성이 있는 모양이다. 해파리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을 분리한 한 과학자는 19년 동안 85만 마리의 해파리를 잡았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측한 중력파를 검출한 연구진은 간섭계를 40년간 고치고 또 고친 끝에야 중력파를 포착했다. 그들은 과학의 대가인 동시에 실패의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완벽한 그래프를 보면, 나는 그 뒤에 놓였을 실패의 경험들을 상상한다. 저 깨끗한 그래프를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지를. 사실 그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내도 끝은 아니다. 실패의 함정은 가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순간에 도사리고 있다. 발표한 직후 실험의 오류를 지적당할 수도 있다. 놀라운 발견으로 여겨지는 연구일수록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부터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반론에서 살아남은 가설 또한 그 자체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한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하고, 인류의 공동 지식을 이끄는 진실이 과학을 지배한다. 실패는 정말로, 과학의 핵심이라는 것.
이제 나는 SF를 쓰고, SF에는 주로 뭐든 척척 해내는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대단하게 실패한다. 실험이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세상을 구할 놀라운 발견이었다거나, 아니면 인류를 멸망하게 할 재앙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나 소설은 현실이 아니고, 망한 실험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내 삶은 망한 실험에 더 가깝다는 걸 안다. 오늘의 좌절을 마주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일은 무슨 실험을 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 실험실을 떠나 글을 쓰는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는 말자고. 실험실 밖은 실패에 훨씬 더 엄격한 곳이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기다려줄 만큼 느긋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 내 실패를 이해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해야 할 판이다. 그래도 그날을 쟁취해 내기 전까지, 연구실에서 망한 실험들을 기억하며 나만큼은 내 실패를 용서해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망했지만 별수 없다고. 지금은 그래프 뒷면에 있는 거라고.
Writer 김초엽
93년생 소설가. 포항공과대학교 생화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나아갈 수 없다면>을 펴냈다. 따뜻하고 보편적인 서사의 SF를 쓴다.
Writer
김초엽
포항공과대학교 생화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93년생 소설가.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나아갈 수 없다면〉과 첫 장편 〈지구 끝의 온실〉을 펴냈다. SF 소설,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쓴다.
Category
Credit
- 글 김초엽
- 에디터 이마루
- 사진 unsplash(@amplitudemagazin)
- 디자인 오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