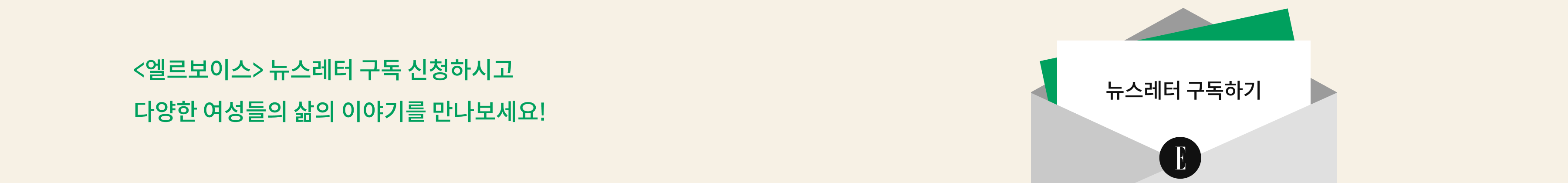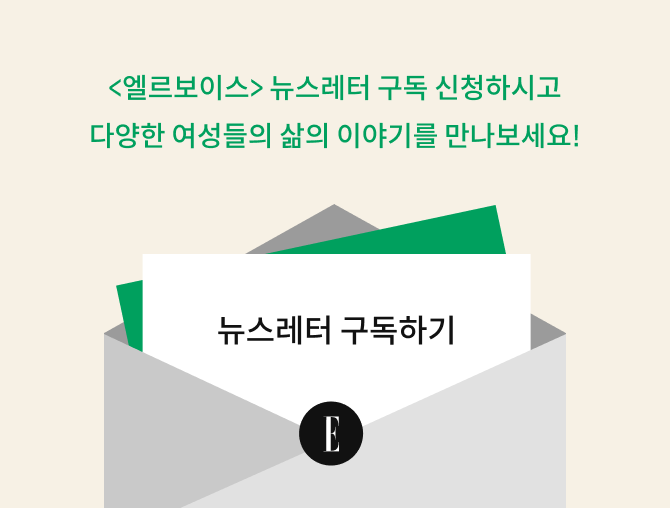여행과 뜨개

©unsplash
이게 무슨 말인가. 자칭 ‘여행 유튜버’라며 세계를 떠돌고 영상을 올린 게 최근 일인데. 심지어 그중 몇 개의 나라로 여행 에세이까지 집필한 판국에 이런 기분을 새삼 느끼는 게 이상했다. 이런 말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 새해를 맞아 잠시 일본에 다녀오는 계획을 세우는데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여행을 위한 여행’처럼 굳이 이유를 만드는 것 같았다. 떠날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다 출발 나흘 전에 비행기표를 샀다. 그 덕분에 비수기에 5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사가행 비행기를 네 배 넘는 가격에 끊어야 했다. 결국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정해진 것이라고는 후쿠오카에서 특급열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가는 ‘다케오’라는 소도시에 묵는 것뿐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다케오는 후쿠오카 여행에서 당일치기로 잠시 들렀다 가는 근교 도시로 언급될 뿐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여행이 설레지 않을까? 이제 낯선 곳으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된 걸까?
그때 떠올린 것이 새 취미인 뜨개였다. 일본 실과 뜨개 도안이 유명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작은 소도시에서 실과 바늘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낸다니, 꽤 낭만적이지 않은가? 지도 앱을 열어 ‘뜨개’를 검색했다. 머물기로 한 작은 마을 다케오에는 마땅하게 머무를 곳이 없어 후쿠오카에 가야 했다. 그때 생각했다. 좋아, 다른 사람들이 후쿠오카에서 잠시 머무르다 이곳에 들릴 때 우리는 다케오에서 그 큰 도시에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하자. 화려하고 북적이는 관광지를 뒤로하고 다시 이 작은 마을로 돌아오자. 다케오에 도착해 짐을 풀고, 다음날 곧바로 큰 도시로 향했다. 커다랗고 높은 빌딩 한편에 있는 잡화점에 들어가 손으로 만든 가방과 모자, 조끼를 구경했다. 실수로 카드를 놓고 온 탓에 남은 현금으로 실을 구입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하지 못하는 일본산 실을 몇 볼 구매했다. 또 다른 유명한 뜨개 전문점에 들어가 코바늘과 커다랗고 폭신한 실 한 볼을 샀다.

©unsplash
다음날은 마을 도서관에 갔다. 다케오의 도서관은 별마당 도서관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마당 도서관의 복잡함과 위용을 생각하며 화려한 관광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다. 도서관 안에는 근처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어린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책은 내용과 목적에 따라 잘 정리돼 있었고, 책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열람실도 있었다. 바로 내가 찾던 곳이었다. 사진 찍고 그 자리를 뜨는 화려함이 아니라,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조용히 모여 앉아 할 일에 집중하는 곳. 도서관 안에 있는 카페 구석에 자리 잡고 어제 샀던 커다란 실 한 볼을 꺼내 무릎에 놓았다. 동그란 모양을 만들기 시작해 점점 커다랗게 넓어지도록 실을 엮었다. 비니를 뜰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러 몇 번 실패했지만, 점점 커다란 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실을 엮었다. 어느 여행보다 충만한 느낌이었다. 집을 떠나와서 쫓기지 않고, 무언가에 몰입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이후에도 여러 곳을 떠돌 때마다 점점 커져가는 편물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3000년을 살았다는 나무를 보러 가서도, 느지막이 숙소에 들어가 사케와 감자 과자를 먹을 때도 뜨개질을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잠들지 않고 열심히 코를 늘려갔다. 실과 함께 기억들이 얽히는 것 같았다. 모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스시를 입에 넣던 작은 이자카야나, 직접 무전기로 지하철 방송을 하던 역무원의 목소리나, 벽면에 꽉 들어찬 책 속에 파묻혀 즐겼던 커피 같은 것이 모자에 들어가 있는 상상을 했다. 손이 느린 탓에 여행 중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떠서 일주일 뒤 작은 비니 하나를 완성했다. 폭신폭신하고 따뜻해 보이는 모자였다. 여행의 기억이 무엇보다 꽉꽉 들어찬,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념품이었다.
Writer
김지우
‘구르님’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다.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담은 ‘굴러라 구르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등을 펴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전혜진
- 아트 디자이너 김민정
- 디지털 디자이너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