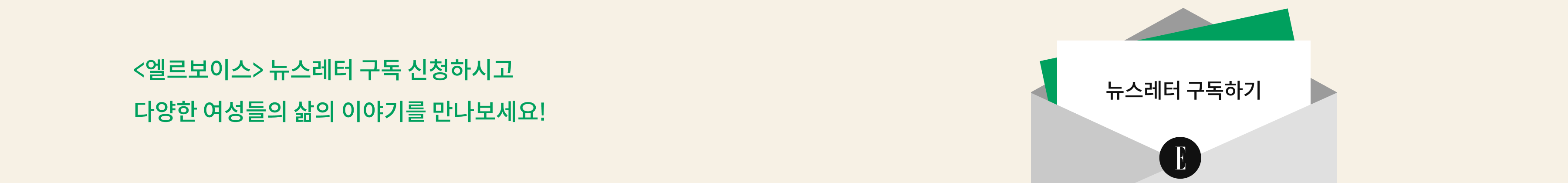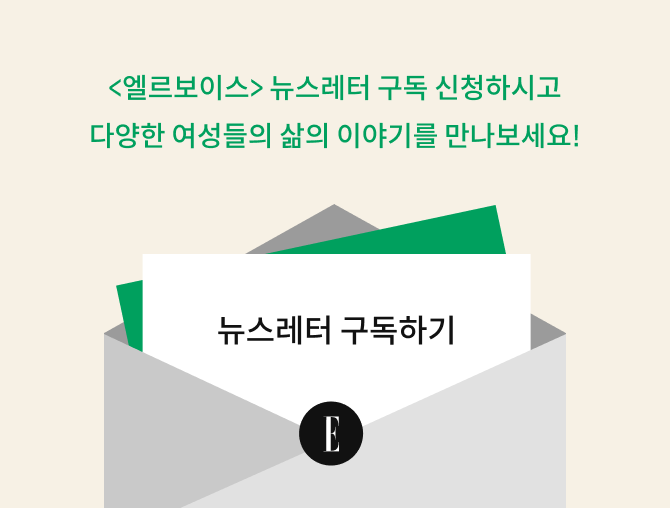고양이가 난 자리

©unsplash
고양이는 좋은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영역 동물이라 자신의 영역 안에서 최상의 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새의 날갯짓을 관찰하기 좋은 창가일 수도 있고, 햇살이 적당히 내리쬐는 작은 방 소파이기도 하며, 때론 반려인의 온기가 묻어 있는 이불 속일 수도 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녀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녀석을 찾아내곤 했다. 가끔 예상치 못한 물체나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최적의 루틴이 깨진 것에 당황하며 다음 ‘자리’를 찾아 떠난다.
그러던 그가 그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났다. 노령의 고양이였기에 막연하게 이별에 대해 생각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갑게도 현실은 그 자리가 계속 부재 중이라는 것이었다. 녀석의 ‘자리’를 부정하기 위해 그가 사랑했던 자리들을 되짚어가며 머리를 대고 누웠다. 최적의 아늑함과 함께 어디서든 반려인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녀석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자리에 서본다.
부재는 비로소 존재를 꽉 채웠다. 고양이가 집 안에서 최적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인간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 역으로 빼앗기기도 했다.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꽤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어느 때는 내가 좇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아득해지기도 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존재하지 않는 불편한 자리에 서 있기도 했다. 제로섬 게임 같은 자리 다툼에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내몰리니 날 선 자아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안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렇게 지쳐 들어오면 녀석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쓰러진 이를 말없이 응시했다.
녀석에게 자리는 나와 달리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리였다. 내가 고군분투하며 지켜온 자리가 나를 고립시켰다면, 녀석의 자리는 누군가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했다. 누군가의 ‘옆’ 자리. 내게 자리 잡기는 홀로 고정 좌표를 찾다 보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조각배 같았다. 그사이 녀석은 허우적대는 배 근처의 한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멀거나 가깝거나, 마음 닿을 수 있는 이들 역시 함께 헤매며 자신의 자리를 표시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서로를 보며 방향을 가늠한다. 내 자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별로 형상을 이룰 수 없는 별자리처럼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리는 절대적 좌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 자리는 때론 움직이기도 하고, 때론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곤 한다.

©unsplash
부재로 홈이 파인 자리는 양(+)으로만 향하는 축적된 삶과는 대비된다. 동질성을 띤 경험과 사유가 쌓일수록 배지에 찍혀 나온 이미지는 탁해져만 간다. 반대로 동질의 균형을 파괴해 비어나간 부분, 잉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녀석의 부재는 공기를 낯설게 만들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서 흐릿했던 ‘나’가 또렷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선명함은 다시 새로운 자리 이동을 불러일으킨다.
사라진 이가 남긴 형상으로 서 있는 나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능동적’인 자리 선정을 시도해 본다. 이것 역시 내가 고양이에게 빚을 진 부분이다. 녀석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사건과 사유들을 고유한 리듬의 ‘자리 옮김’을 통해 무한 교차하며 엮어냈다. 그렇게 나에게 서사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줬다. 흰 도화지 앞에서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헤매던 나는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글을 쓴다. 외적 가치 없이는 ‘자리’하기 어려운 세상에 효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리를 찾고 존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세상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일 아닌가.
여전히 고양이의 흔적은 부재를 통해 현존을 드러내지만, 그가 없는 공기는 집을 낯설게 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이사 끝에 정착한 집이다. 집은 고양이가 한겨울의 눈밭을 밟고, 햇살 아래 몸을 누이고, 새의 날갯짓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매김은 녀석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기쁨이었다. 나는 녀석이 없는 집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녀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 곧 나의 자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나는 또 다른 자리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집을 떠날지도,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자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나는 알고 있다. 녀석이 남긴 이 하얀 여백이, 파여 나간 이 형상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그것이 녀석이 남기고 간 자리 새김이자 나의 자리다.
Writer
윤끼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특별상을 수상한 <유기견, 유기묘, 유기인의 동거일지> 저자. 그는 스스로 ‘유기인’이라 칭한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전혜진
- 글 윤끼
-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