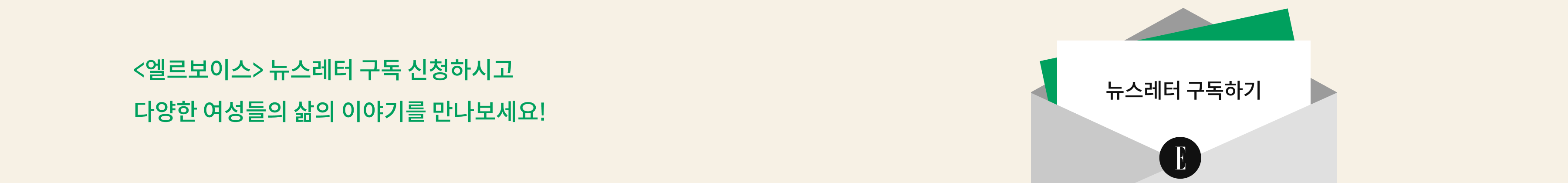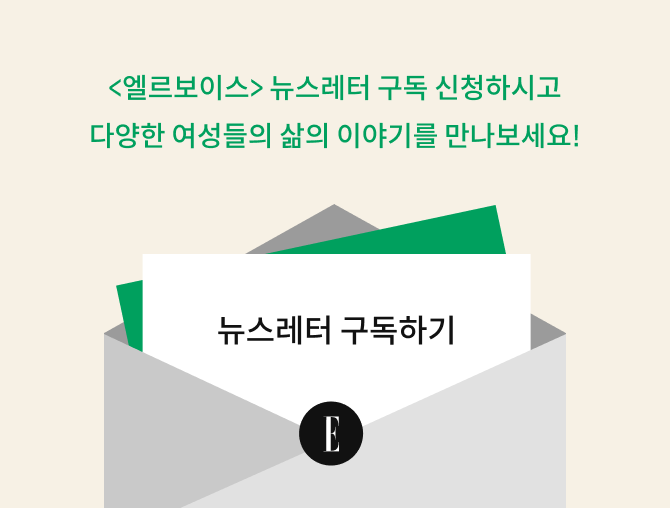얻기스트로 사는 법
2025.02.04

©unsplash
요즘 내가 외출할 때 입는 점퍼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며 친구가 준 것이다. 양털처럼 북슬북슬한 안감과 검은색 겉감, 목을 덮어주는 칼라가 달려 퍽 따뜻하다. 그동안 겨울용 겉옷은 롱 패딩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코트뿐이었는데, 이 점퍼는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집 앞에 훌쩍 나갈 때 입기 좋다. 통이 넓어 내복과 같이 입을 수 있는 면바지 두 벌도 친구에게 얻었다. 나보다 키가 작은 친구가 줄였던 아랫단을 다시 냈더니 눌린 자국이 선명하지만, 몇 번 세탁하면 없어질 거라는 수선집 아주머니 말씀을 믿고 일단 입어서 지우는 중이다. 초겨울엔 조문 갈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친구가 버리려던 걸 얻어 입은 검정 블라우스 덕을 톡톡히 봤다. 친구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한 옷감의 광택이 나에겐 나름 멋져 보였다.
패션에 별다른 취향이나 기준이 없다는 건 ‘얻기스트’로서 내가 가진 자질일 것이다.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이상 옷 물려 입기는 운명 같았고, 의복비만큼은 극단적으로 아꼈던 엄마로 인해 나는 착실한 패션 테러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옷을 얻어 입는 행위에는 절약의 기쁨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더해졌다. 옷에 관한 내 안목은 믿을 수 없어도, 나보단 패션에 관심 많은 친구의 안목에 기대면 당당해질 수 있다. 지난 2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서서히 눈치챈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상의를 입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넓은 캠퍼스에서 오직 나만 언니에게 얻은 치렁치렁한 검정 바람막이를 죽음의 사신처럼 걸치고 다니던 어느 가을날, 친구가 단톡방에 산뜻한 회색과 하늘색 크롭트 후디드 점퍼 사진을 올리며 혹시 입을 사람 있냐고 물었다. 나는 재빠르게 손들었다. 사실 나 말고 아무도 들지 않았다. 며칠 뒤,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새 옷을 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누구도 관심 없었겠지만, 혼자 열 살은 어려진 기분으로 신나게 입었다.

©unsplash
나 역시 새 옷을 좋아한다. 나이 먹을수록 새 옷을 입어야 사람이 추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신경 쓰이고, 모처럼 새 옷을 사 입은 날엔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을 만큼 기분이 들뜬다. 다만 매일 등교나 출근할 필요가 없고, 패션이라는 세계를 미궁처럼 두려워하며, 결정적으로 돈이 별로 없어서 약간 금욕적이고 본의 아니게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버린 옷들이 지구 저편에서 거대한 언덕을 이루고 풀 대신 썩은 옷을 뜯는 소들과 독성 물질로 표백된 옷 더미 위에서 노는 아기의 사진을 떠올리면 옷을 사는 즐거움보다 얻어 입고, 아껴 입고, 나눠 입는 재미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어진다.
내게는 사회 초년 시절에 구입한 비둘기색 재킷이 있다. 백화점 행사 매대에서 50% 세일해서 구입한 재킷을 애지중지 입었다. 시간이 흘러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았지만, 재킷은 새로 사려면 큰돈이 드는 데다 뭘 사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17년이 흘렀다. 이제는 그냥 유행은 반복된다는 말을 믿고 내 재킷이 트렌드가 될 순간만 기다리며 매년 나만 아는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물론 그날이 오더라도 가슴 포켓에 달린 행커치프나 뒤판의 장식 끈이 구닥다리처럼 보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얻기스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법이다. 지구상에 나로 인해 만들어질 폐기물 산은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을 테니까.
Writer
최지은
10년 넘게 대중문화 웹 매거진에서 일했다. 〈괜찮지 않습니다〉와 딩크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펴냈다. 늘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글 최지은
- 아트 디자이너 김민정
- 디지털 디자이너 오주영